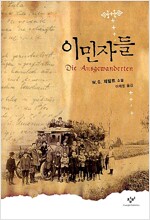


제발트를 읽고 그에 대한 리뷰를 쓰는 건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게 왜 어리석은 일인지는 제발트를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지도. 대부분의 외국작품 뒤에는 '옮긴이의 말'이나 '해설'이 실려 있는데 제발트의 책에 실린 '옮긴이의 말'처럼 무미건조해보이는 경우도 보기 드문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제발트의 문장 때문이다. 그의 문장과 맞서서 무력해지지 않을 문장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트에 대해 몇 마디 끄적대려 하고 있다. (이제 굳이 '끼적거리다'고 하지 않아도 되구나!) 뭐든 말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친구에게 내뱉은 말 때문이기도 하다.
제발트는, 김훈을 설명할 때면 연관 검색어처럼 단박에 떠오르는 '연필로 꾹꾹'이라는 진부한 수식이 진정 어울리는 작가다. 그의 글을 읽고 있으면, 화려한 수사나 시적인 미문이나 선언적인 문장 들이 없어도 산문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아마도 그의 묘사 때문이리라. 묘사가 어디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천대시 되는 요즘 시대에 제발트의 글을 읽고 있으면 서사보다 훨씬 자극적인 묘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내 취향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특히 작은 단위의 유형명사/구체명사들이 오밀조밀 나열되어 있는 문장들에서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한다.
사실 제발트의 문장은 의미의 밀도가 높다. 하여 한 문장 한 문장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읽어나가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힘든 만큼 집중 했을 때 찾아오는 쾌감도 크다. 더불어 비극과 파국과 몰락을 바라보는 작가의 덤덤한 눈길이 더해진다. 슬픔 감정이 제거된 비극은 외려 아름답다. 그는 독자들에게 일회적인 눈물보다는 오래 지속될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그럼으로써 그가 보여주는 비극은, 파국은, 몰락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발트의 책에는 그가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해준 이야기가 나온다. 혹은 그가 떠올린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 들도 등장한다. 그것만 봤을 땐 일반적인 에세이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마치 윤활유처럼, 허구나 창작이라기보다는 기억의 의도적 왜곡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삽입된다. 그로 인해 이 작품이 과연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아리송할 때가 많다. 그러나 제발트를 읽으며 장르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다. 그의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이기 때문이다. 소설이라는 장르와 에세이라는 장르 사이에 존재하는 제발트라는 문학장르. 사실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은 기존의 문학장르가 온전히 포섭할 수 없는 자기만의 특성을 띠어왔다.
그의 책을 읽고 나서 단순히 좋다 나쁘다 혹은 재밌다 별로다를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보다는 다 읽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마도, 제발트를 다 읽은 독자라면, 이미 그를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의 책을 끝까지 읽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테니.
마지막으로 번역에 대해서. 무엇이 더 좋은 번역이고 무엇이 더 올바른 번역인지 판가름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그러나 문장의 리듬에 대해서라면, 산문을 읽는 맛이라는 측면에서라면, 이재영의 번역이 나와 더 잘 맞았다.
현재까지는 [이민자들]이 가장 좋았다. 무지 탓에 놓친 부분이 많을 것이다. 다시 읽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