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목눈이의 사랑
이순원 지음 / 해냄 / 2019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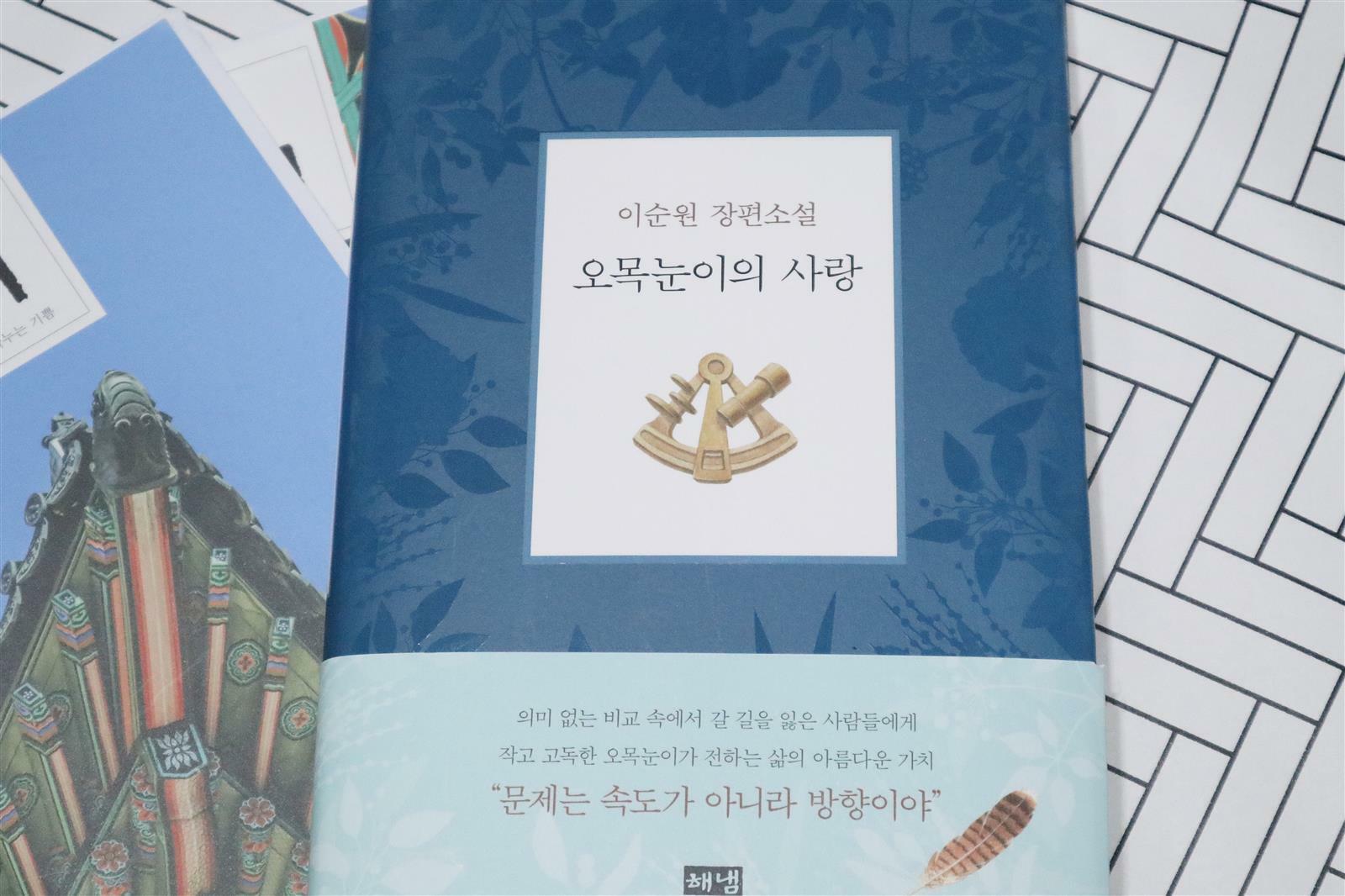
<오목눈이의 사랑>은 동화같은 혹은 다큐같은 이야기로 자연의 법칙에 사람의 삶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이순원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로
귀여운 생김새와 다르게 작고 고독한 오목눈이가 전해주는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생소한
오목눈이는 의외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속에 담긴 이름으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리
찢어진다" 할 때 말하는 뱁새의 제대로 된 이름이
"붉은머리오목눈이"라고 한다.
그래. 그것이 우리 이름이다. 몸은 참새보다 작고, 눈은 오목하다. 꼭 다물었을 때의 부리는 작은 삿갓조개를 붙여 놓은 것처럼 뭉툭하다. 그
중에서도 내 이름은 육분이. 그렇게 말하면 다들 되묻는다. 육분이? 무슨 새 이름이 그러냐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맞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육분이. 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름이 주는 기쁨과 서운함, 사랑스러움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처음 얻은 게 바로 그것이니까.
뱃 속에 생명이 생기면
태명을 지어주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듯 육분이 역시 엄마, 아빠의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알을 까고 태어났다. 3년 전 봄 다른
붉은머리오목눈이보다 꽁지가 짧아 콩단이라 불리는 어머니와 집 짓는 기술이 가장 뛰어난 아버지가 가지 많은 앵두나무에 둥지를 지었다. 산이나 들보다 새끼를 키우기에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책의 시작은 육분이가
탄생하기 전 안전한 곳을 찾아 울타리를 만드는 새들의 삶부터 시작된다. <오목눈이의 사랑>이 다큐인듯 동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에 있다. 스토리
자체는 새가 살아가는 자연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사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안녕? 작아서 더 아름다운 별들아. 너희가
내게 이름을 주었구나.
육분이는 다른 형제들
중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오목눈이로 엄마 콩단이가 알껍데기를 차곡차곡 씹어 삼킨 다음 하늘을 바라 보았더니 막 별이 돋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날따라 서녙 하늘의 사자자리와 뱀자리 사이에 서는 잘 보이지 않던 아주 작고 희미한 육분의자리만
오롯하게 눈에 들어왔고, 서쪽 하늘 전체를 지배하듯 자리 잡고 있는 사자자리와 뱀자리는 무엇에 가린
듯 어느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살다 보니 처음 보는 하늘에 육분의만 보이는 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나 오목눈이는 육분이가 되었다.
비록 형제들이 육분의라고
부르지 않고 육분이라 불러 하늘로 올랐다 땅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지만 육분의에게 자신의 이름은 붉은머리오목눈이로 태어나 비록 몸집은
작아도 저 육분의처럼 세상 곳곳을 잘 살피고 자기가 앉은 자리도 잘 살피라는 뜻으로 붙여주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귀여운 억울함이다. 좀 더 그럴싸한 이유가 있는 이름이었는데 육분"의"라고 불러주는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육분이"라 불러 이름의 뜻을 떨어지듯 만들었을까, 태어나 가장 처음 느낀 억울함이 이름이라니 귀엽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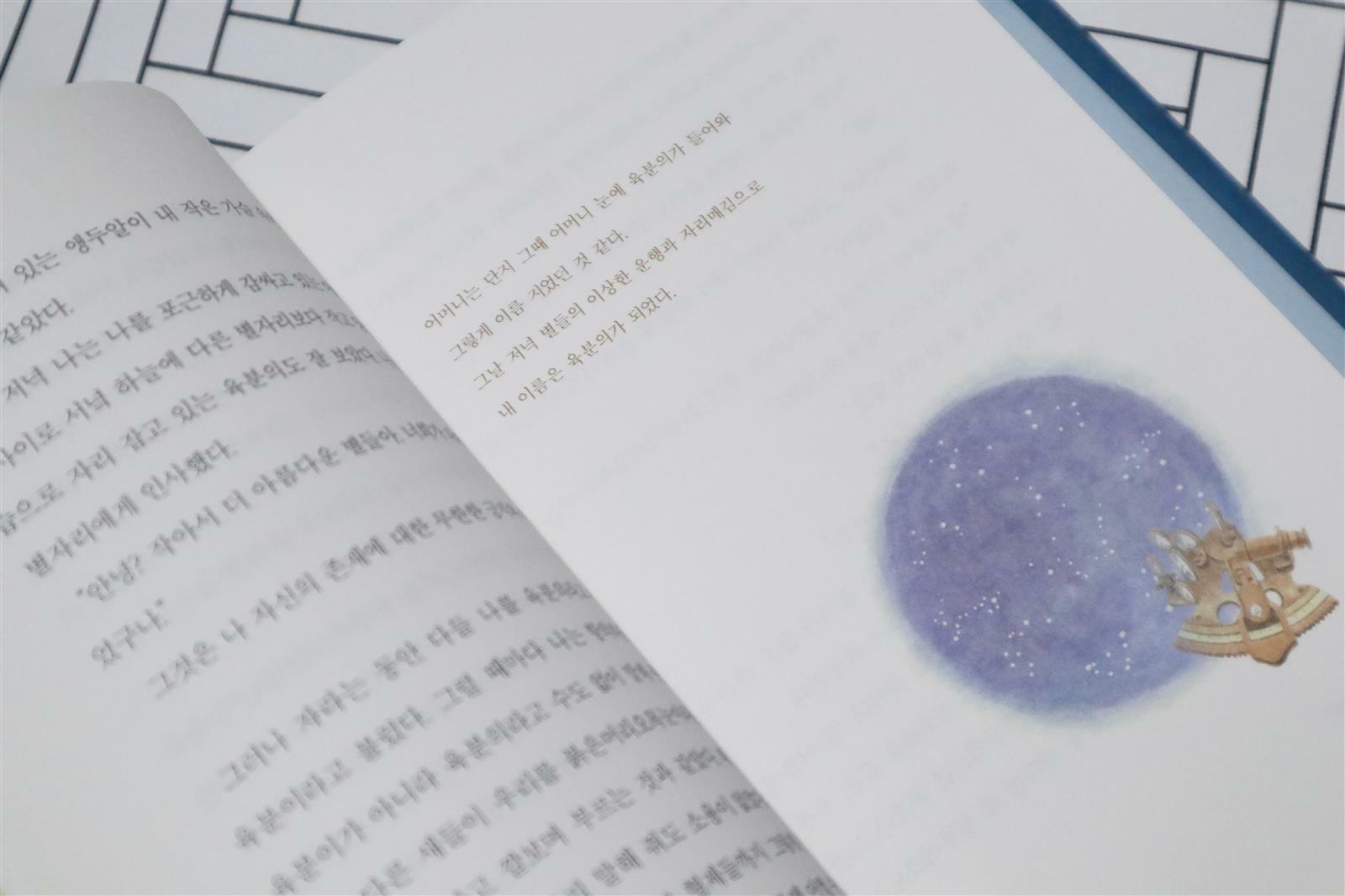
그런데 세상은 엄마, 아빠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전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고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 부었다.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벼락 치듯 들렸던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다친 오목눈이는
없었지만 급한 사정은 배가 고픈 것이었다. 논에서 참새는 벼즙 털이를 하지만 오목눈이는 곡식에 입을
대지 않는다. 오목눈이는 논둑과 밭둑의 풀씨면 충분했다. 그런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양이가 공격하는 자식을 구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고, 어머니는 세 자식을 혼자 먹여 살리느냐 쉴 새 없이 사냥하면서도 정작 홀로 땅에 떨어진 씨앗 몇 알로 허기를
다스리다 지쳐 죽었다.
짝짓기를 해야하는 계절이
돌아왔어도 홀로 자식을 키우던 어머니는 이 세상 가장 수척한 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조차 온다 간다 말 한머디 없이 숲을 떠났다.
그 사이 육분이도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육분의 라는 땅의 이름도 알게 되었다. 별자리 말고 처음 보는 기구인데도 육분의 이름의
영감처럼 익숙하게 쓰임새를 아는 모습이 작은 새인데 왜이리 똑똑하게만 느껴지던지, 별자리처럼 땅의 육분의
라는 것도 해와 달과 별의 높으를 측정하는데 쓰는 기구였다. 석궁을 닮은 바깥 테두리의 폭이 좁아 보이는
것은 이름 그대로전체 원의 6분의 1각도 만큼 모양을 가지고
있어 육분의 였던 것이다. 어머니는 별 생각 없이 지은 이름이었지만 육분이는 어머니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풍부한 상상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가진 천문대의 별지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떠났고 육분이는 어느새 엄마가 되었다.
처음 한 번 속을 때는 속는 우리보다 우리를 속이는 뻐꾸기가 나쁘다.
똑같은 푸른색이어도 우리 알보다 뻐꾸기 알이 훨씬 크다. 알의 크기가 다른데도 우리 붉은머리오목눈이가
속는다. 그래, 누구나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한 번은...... 순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일로 두 번 속을 때는 사정이 다르다. 속이는 쪽보다
속는 쪽이 더 나쁘다. 순진해서가 아니라 바보 같고 멍청해서 다시 속는다. 멍청해서 같은 일을 다시 당하고, 상대에게 다음에 자기를 또 속이라고
부추긴다.
맞다. 한 번 속는건 실수 일지 몰라도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그
건 알고도 속아준다고 할 정도로 바보 같은 짓인데 왜 육분이는 알면서도 뻐꾸기의 알을 키우고 자신의 알보다 뻐꾸기의 알을 키웠을까? 다른 오목눈이가 둥지안의 뻐꾸기 알을 쪼아 부셔버리듯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더 큰 알을 품으려고 욕심을 냈을까
그 답은 철학하는 오목눈이를
만나 조금씩 알아나가게 된다. 그런데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인간이 수없이 번식을 하고 살아남는 것과 오목눈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같아 보인다면 내 눈과 머리가 이상한 것일까,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지만
지구에서 가장 많은 생명체를 꼽으라 하면 인간이 아닐까 싶을정로도 많은데 철학하는 오목눈이의 말이 왜 이리도 사람을 본 것과 같은 기분인지
생명이 긴 앵무새나 오목눈이를
잡아먹는 긴 새매는 언제 멸종할지 모를 위기에 닥쳤다. 가장 강해 잡아먹는 새도 없는데 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면 오목눈이는 이 넓은 땅 어디에서도 살지 않는 곳이 없고, 수명이 짧아도, 누군가에게도 잡아 먹혀도 줄지 않는 샘과 같은 목숨이라는
것이다. 참 어려운데 설명이 안되는데 머리 속 한 편으로는 철학하는 오목눈이의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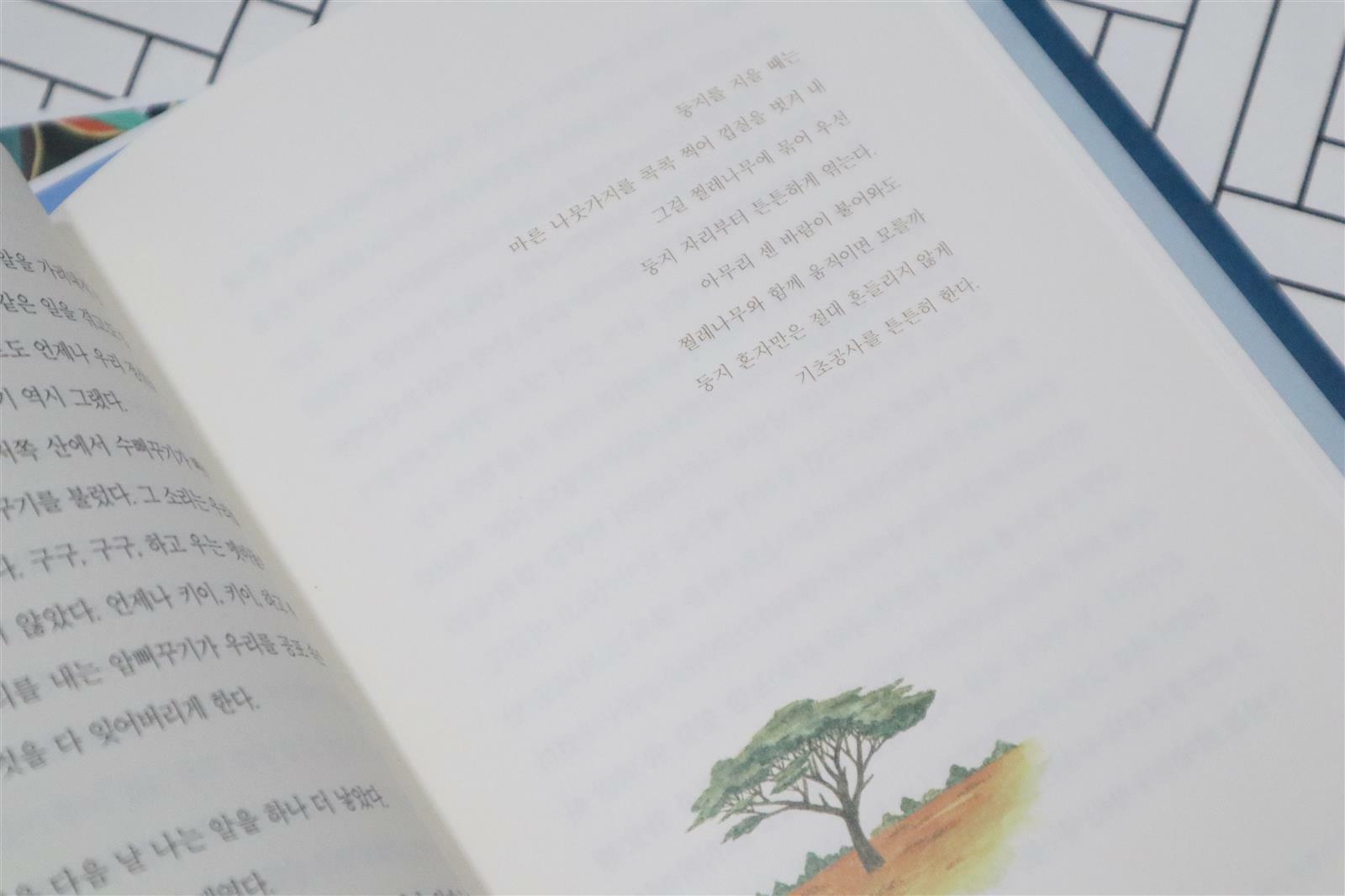
산다는 것은 어느 새에게나 중요하지. 잡아먹는 새가 반드시
이기고 잡아먹히는 새가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라네. 수명이 길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 그러나 실제로 보게. 50년 넘게 사는 앵무새가 50년 동안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또 저마다 50년 동안 새끼를 낳는다면 이 세상은 온통 그 앵무새의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앵무새도 새매처럼 귀하다고 하거든. 그게 무얼 말할까?
아마 이 세상에 모든 새가 다 멸종한다 해도 두 종류의 새는 살아남을 게야. 그건 바로 참새와 우리 오목눈이지.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저마다의 수명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우리 오목눈이 전체, 참새 전체의 종족을 이어 가는 데 더
많이 신경을 써 온거지. 누구에게 늘 쫓기고 잡아먹히더라도 더 빠르게 날려고 애쓰지 않고, 몸집을 키우지도 않고, 몇 개의 씨앗만 털면 하루를 거뜬히 버틸
수 있게 이렇게 작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오목눈이 한 마리 한 마리의 목숨은 길지 않아도
전체 오목눈이의 목숨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강처럼 이어 온 거지.
그리고 육분이는 또 다른
남편을 만나 알을 낳는다. 분명 그 중 가장 큰 알이 오목눈이의 알이 아님을 알 것 같음에도 남편도
육분이도 그 어떤 아이보다 더 큰 사랑을 주었고, 주었다. 누룩뱀으로부터
새끼를 지키려 했고, 덩치 큰 새끼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날고 또 날아 사냥을 해왔다. 하지만 그 새끼는 어느 날 부부가 알 수 없는 울음소리를 내더니 사라졌다. 그럼에도
둘은 원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냥 해온 것을 먹지 않고 가버린 것을 아쉬워했을 뿐...
육분이는 그리고 철학하는
오목눈이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품어 키운 뻐꾸기를 찾아 아프리카로 떠난다. 평균수명을 살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앞두고 철학눈이의 조언처럼 인면조를 만나고 서쪽을 향해 날아 날아갔다. 머릿 속의 육분의로
천천히 천천히 100일을 날아 깃털이 윤기를 잃고 붉은기를 잃어감에도....
육분이가 가장 사랑하는 새끼 앵두를 만났느냐고...? 육분이는 여행을 통해 철학하는 오목눈이의
생각을 대신 보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또 다시 오목눈이 육분의가 되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다.
동화 같은 소설이라 다행이었다. 육분이가 아프리카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새여서 좋았다. 오목눈이라는
정해진 삶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육분의는 그렇게 또 다시 뻐꾸기의 알을 키우기 위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
개인적으로 <오목눈이의 사랑>은 동화처럼
아름다웠고, 소설처럼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육분의만의 모성애에
삶을 살아가는 철학적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육분이가 새끼의 알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길
상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