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의 아름다운 이웃 - 박완서 짧은 소설
박완서 지음 / 작가정신 / 2019년 1월
평점 :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 속 사람 사는 모습을 배우고 경험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언젠가는 분과 같은 글을 쓸 수 있는 여성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 박완서
작가님이 떠나셨고,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박완서 작가님과
한, 두명의 작가를 제외하고는 여성작가가 흔치 않아 인상적이기도 했지만 어린시절 엄마가 읽던 책을 훔쳐보면서
막연하게 이 분은 남자분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터라 더 기억에 남을 수 밖에 없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 이야기에 사람 사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건 남자이니까 가능하다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그 뒤로 여성작가님이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엄마의 놀림을 받기도 했던 소소한 추억도 있지만... :)
이번 작가정신에서 출간한
두 권의 신작은 8살의 초등학생이 28살이 되어서 박완서
작가님을 그리워 할 수 있는 기회라 출간 전부터 더욱 애타게 기다리고 반갑게 맞이했다. <나의
아름다운 이웃>은 생전 남기셨던 짧은 글들을 모아 만든 책으로 내가 좋아하는 <도시의 흉년>, <휘청거리는 오후>, <살아 있는 날의 시작>과 같은 연재소설을 집필하는
사이사이 기록한 삶의 이야기로
끝맺음이 있는 장편소설과는
다르게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재미가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매력을 뽐내고는 한다. 특히나 내 이웃이
경험한 것 같은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는 것 같은 문체가 매력적인 작가님의 글 속,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며 삶을 살아가는 소소한 행복한 면과 또 반대로 녹록치 않은 우리네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게 얼마나 행복한 즐거움인가
열 권 정도되는 책을
모아놓고, 도서관에서 꽤 많은 책을 찾아 읽어보았다 생각했는데 아직 내가 읽어보지 못한 글들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다.
<나의 아름다운 이웃>은 이미 70년대에 쓴 글들로
81년 '이민 가는 맷돌'이라는 콩트집으로 출간
된 다음 작가정신을 통해 지금의 제목으로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나의 아름 다운 이웃을 비롯해 약 46편의 (시리즈 포함)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창호지에 바늘구멍 내고
바깥세상 엿보는 재미라 비유한 '콩트' 속에서 고치지 않은 70년대의 이야기가 2019년을 비추는 듯하다면 이상한 걸까? 초등학생 때 읽었다해도 꽤 오래 전 썼을 작품들을 읽으면서도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박완서
작가님만의 작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다. 시간이 지나도 오래되지 않은 듯 화려하지 않으면서 세련
된
입는 옷의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지고, 사는 환경이 변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비슷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작가님의 글 속에 변하지 않을 무언가를 담아 놓았기 때문일까

<나의 아름다운 이웃>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속이 아름답지는 않지만 같이 살아가야하는 정겨운 사람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때 그 사람' 속 상철은 자기잘난맛에 사는 사람이다. 군대도 다녀오고 일류대학에
다니며 전통있는 기업가의 아들로 미래도 보장되었다. 장남도 아니라 시댁살이 해야할 필요도 없고, 강변에 58평짜리 아파트도 사놓은 셀프진단으로 완벽한 남자. 자화자찬이 심하다는게 별로이긴 했지만 생김도 나쁘지 않고 능력도 있으니 고만고만한 여자를 찾아 장가를 가겠구나
싶었던 그에게 하나 오류는 자기가 너무 잘나서 잘난 여자를 봐도 잘난지 예쁜지를 모르는 것이라는거?
막연하게 조건 말고 영혼에서부터
불타오르는 사랑을 기대하던 그에게 찾아온 인연은 재밌게도 대학 때 친구를 대신해 만났던 대리 미팅의 여주인공이었다.
평소처럼 고급스러운 곳을
간 것도 아니고 포장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거기를 한없이 쏘아다녔던 그 날 함께했던 여자, 운명처럼 그
여자를 다시 만남으로 그는 황홀함과 영혼 깊은 곳에서 불이 당겨진 것을 느끼며 이야기는 끝이난다.
짧은 소설 중에서도 '그때 그 사람'을 소개한건 70년대의
이야기인데 흡사 요즘 우리가 읽는 로맨스소설의 재벌남이 사랑에 빠지는 조건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다. 평소
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나 좋다는 사람은 감흥없고 나 관심없다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고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사랑에 빠지는 조건은 시크함이 필수인가 괜히 궁금해지고 웃음이 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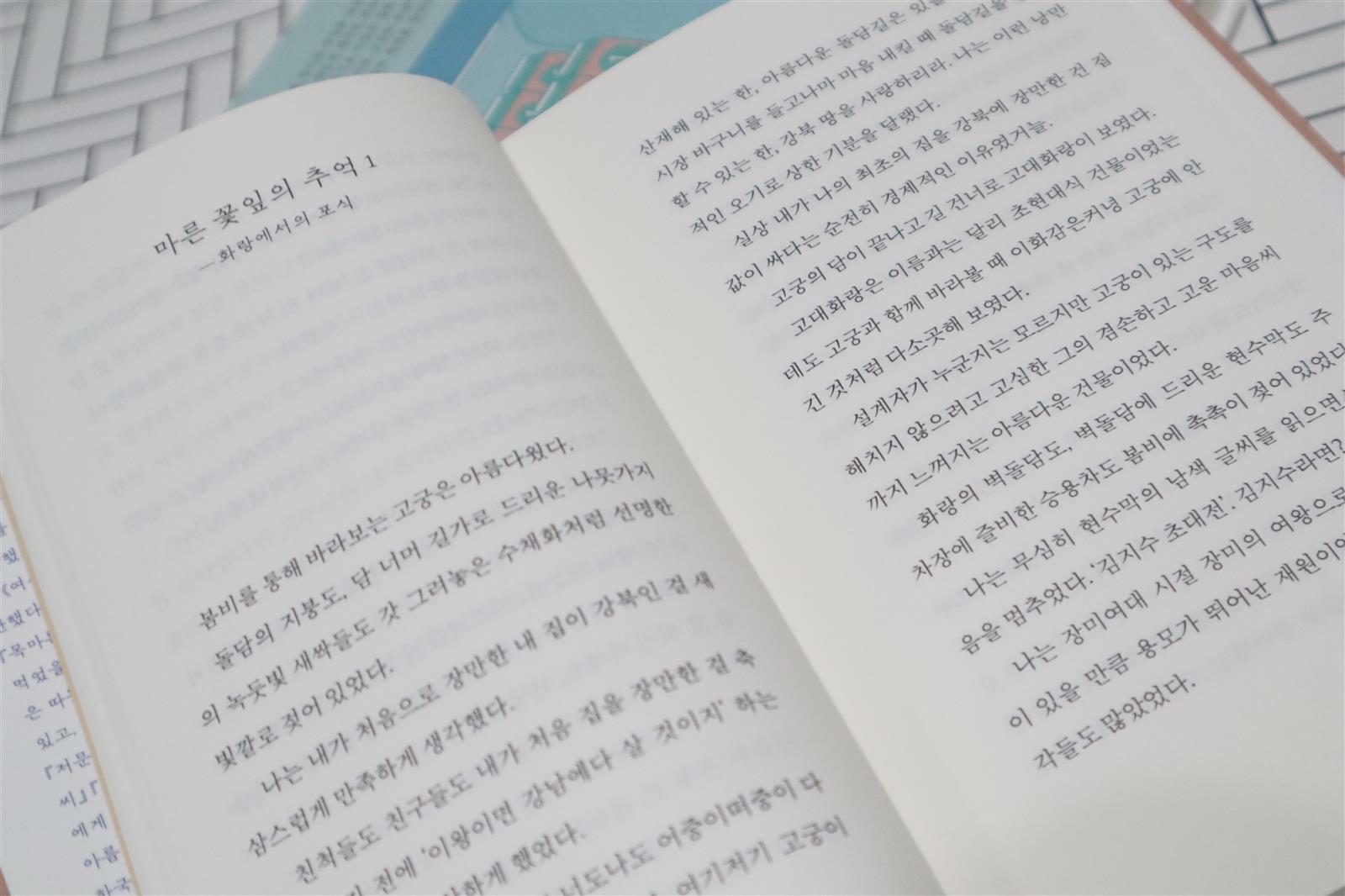
여대생 시절에 여왕으로
뽑힐정도로 예뻤던 '나'의
'마른 꽃잎의 추억 1~4'도 재밌는 사람이야기
인기많던 여대생이 자신을
좋아해주던 남자 중 한명과 결혼해 풍파없이 살아오며 강북에 집도 장만한 어느 날 집 근처 고궁을 걷다 고궁에 안긴 것처럼 다소곳해 보이는 고대화랑을
보게 되었다. 그 곳에 적힌 낯익은 화가의 초대전을 떠올리며 자신의 추종자였던 그를 기억하게 됐고, 그녀는 감미롭되 부도덕하지 않은 낭만을 꿈꾸게 된다.
물론 대학을 다니며 그와
함께 다녔지만 결혼을 하지는 않았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화가의 아내를 선택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시간이 흘러 그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의 초대전만 보고 낭만을 꿈꾸거나 스스로 그의 아내가 될 수도 있었다며 감동과 질투심을 가지며 화랑에 들어가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다. 그런데 그곳은 현실이었다.
어여쁜 여대생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는 가난한 대학생 화가가 아닌 귀부인의 찬사를 받는 유명 화가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림도 볼 틈 없이 화랑에 차려진 음식을 푸짐하게 먹으며 냅킨에 가방에 야금야금 음식을 챙기는 누군가의 아내.
적당히 배고픈 날 다시
가보리라고, 시작의 낭만과 다르게 그를 만나고 싶은 흥미는 이미 없다고 말하며 뒤돌아서지만 그녀의 가방
속 달콤한 음식처럼 그녀에게는 아직 자존심과 미련 한가닥이 가슴에 꾸물거리고 있다. 아직 시들지 않은
꽃잎 같은 그녀가 마른 꽃잎이 되기에는 감정이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 이야기는 좀 더 흥미롭게 2~4편에
이어진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자 샘솟는 낭만과 한 편으로 지울 수 없는 열등감,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그린 어느날의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야 달콤하지 않을까...?
1970년대는 긴장과 억압의 시대였다고 한다. 나도 잘 모르지만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 조금이나마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 했는지 무엇에 억압받아야
했는지 삶이 왜 고달팠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것은 지금과 다른 이야기이지만 같은 모습이라
더 공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 하나만은 확실하다. 내가 20년이
흘러서도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그 안에 내가 있고 내 이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오랜만에
책장에 정리해 두었던 작가님의 책들을 한 번씩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저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