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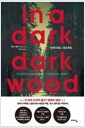
-
인 어 다크, 다크 우드
루스 웨어 지음, 유혜인 옮김 / 예담 / 2016년 6월
평점 :

절판

존 코널리는 『죽이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출간된 소설 치고 『블랙 에코』는 놀랄 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분명 미스터리 소설 장르에서 가장 뛰어난 데뷔작 중 하나다.” 그의 소설을 읽어본 분이라면, 쉽게 공감할 듯합니다. 이 책에서 데뷔작의 허점을 찾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소위 ‘한 가닥 한다’는 작가의 데뷔작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개 작가들은 처음 쓰기 시작할 땐 설익어 있었고, 시간을 보약삼아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첫 작품의 강렬함 때문인지, 마이클 코넬리와 그의 캐릭터 해리 보슈는 제게 1순위 캐릭터입니다.
좀처럼 ‘훌륭한 데뷔작’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그 목록에 오늘부로 루스 웨어의 『인 어 다크, 다크 우드』(이하 『다크 우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은 ‘훌륭한 데뷔작’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꾸준히 추리물(또는 범죄물 또는 스릴러)을 읽다 보니 완전한 몰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비슷비슷한 자극이 반복되는 듯했고, 쓰는 사람도 아닌데 왠지 모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쉽게 타협(?)하기 시작했죠.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았지’, ‘나쁘지 않았네’ 하고 말이죠. 『다크 우드』를 읽으면서 그 매너리즘을 잠시, 멀찍이 떨쳐놓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이 소설의 매력 포인트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가령 경찰이 주인공인 소설이라면 ‘궁금증’ 이외에 우리가 공감할 여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총격에 위협받는 경찰에, 평생 총의 실물 한 번 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선 끝내주는 묘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실패하면 독자는 쉽사리 지루함을 느끼죠.
반면 『다크 우드』의 주인공 리오노라 쇼(이하 노라)의 상황은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상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모든 대목이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고, 첫 번째 결정, 즉 싱글파티에 참가하기로 했던 대목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싱글파티’에 초대한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장도 보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 결정 이후부터는 모든 이야기가 일사천리입니다. ‘숲 속’에 외따로 떨어져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괴팍한 플로라는 인물의 존재. 이 불길한 공간 속에서 노라를 스치는 감정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후부터는 스포일러에 주의해 주세요)
또 하나, 노라가 용의자임을 고지 받는 순간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범죄소설을 많이 읽어서인지, 밤길을 걸으며 종종 ‘만약 이 시간 내 알리바이를 대라고 하면 나는 꼼짝 없이 잡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노라의 위기를 읽는 동안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제가 다 막막해지더군요. 모든 증거가 꼼짝없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순간, 나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일단 제 시선을 완벽하게 돌려놓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절정이 일어났을 때 범인은 함께 별장에 머무르던 인물일 수밖에 없고, 작가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머리 좋은 독자들은 쉽사리 결말을 예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라의 기억상실, 플로의 존재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라의 기억상실 덕분에 자연스럽게 미스터리가 형성되고, 제정신이 아닌 듯한 데다 언제든 폭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 플로 덕분에 작가는 범인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내죠. 물론 플로의 괴상함이 지나쳐서 ‘적어도 얘는 범인이 아니겠다’는 짐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이건 뭐, 고전적인 방법이죠), 적어도 이 인물을 통해 팽팽한 긴장을 형성하는 데에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물론 모든 게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구멍은 바로 노라가 병원을 탈출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치 일부러 노라를 놓아준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라보다 더 심하게 다친 클레어까지 아무런 설명 없이 플로의 별장에 나타났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야기를 전진시키고 싶었던 작가의 무리수처럼 보이더군요. 싱글파티에 참가하기로 했던 노라와 더불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무튼 다시 데뷔작 이야기로 돌아가면, 데뷔작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이 데뷔작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범죄소설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반드시 권해야 할 책의 목록에 포함시킬 생각이에요. 아마 이 책을 읽는 누구든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리즈 위더스푼도 저와 같은 생각을…. (웃음)
마지막으로 저자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크 우드』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클레어를 그저 좋아했을 뿐,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던 플로의 결말은 조금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애먼 제임스보다 더 안쓰러웠네요. 아마도 제가 노라, 니나와 함께 플로를 함께 의심했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 진짜 범인은 원한을 가질 법했을 노라조차 의심하지 않았고, 저 또한 ‘적어도 그 사람이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론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