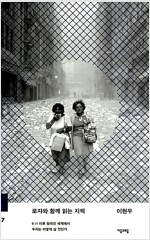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고 얼마 전에 읽은 이 책이 곧바로 떠올랐다. 특히 '이웃'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젝이 말한 이웃과의 공존이라는 상황이 영화에 나온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적으로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에서나 혹은 인터넷 고민 게시판에서 흔히 보이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 이런 저런 일로 새로운 친구나 이웃, 사람을 만나고 사귀게 되고, 처음에는 서로 공통되는 주제 - 영화나 책, 사고 방식 등을 공유하며 즐거운 교류를 꿈꾸게 된다. 하지만 하나 둘 어긋나는 게 생기고, 맞지 않은 행동이나 가치관, 이해할 수 없거나 때로는 불쾌한 습관을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해 고민하다가 게시판에 고민을 쓰게 된다. 그러면 마치 코메디 프로그램에서 방청객이 나 대신 웃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 대신 분노해 주고 어서 관계를 끊으라고 종용하고, 마치 그 선언을 기다린 것처럼 관계를 끊어내게 된다.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 왜 그때그때 서로 의견충돌을 보이지 않고 참다가 결국 관계를 끊어내는가 하는 것이다. 평판 때문일까? 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자유주의 사회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주체들'의 사귐인가 하고 생각하면 쓴웃음이 나올 때가 있다.
'이웃'을 좀더 큰 틀에서 보면 어떨까. 일본과 우리는 이웃이고, 또 일본은 중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이웃이지만 좀처럼 양보할 수 없는 갈등의 씨를 갖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이웃이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이웃이다. 미국과 이라크도 지리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자유주의 사회와 이슬람 근본주의 대표로서 이웃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웃은 그 단어가 가진 정서적 의미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친절하고 안전하며, 나보다 약하거나 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웃은 지젝의 표현대로라면 '실재의 침입'이다. 이웃은 나와 같지 않고, 나와는 다른 주이상스를 가졌고, 나에게 위험한 존재일수도 있다.(반대로 내가 이웃에게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 마치 바다 한 복판에 남겨진 파이와 호랑이처럼. 게다가 그 호랑이는 '리처드 파커'라는 꽤 그럴싸하고 신사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겪지 않으면 영화 초반에 나오는 소설가가 이름을 듣고 의아해했듯이 그가 그렇게 위험한 존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이웃과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바다 한 복판이라 파이도 리처드 파커도 배에서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만약 리처드 파커가 파이를 죽인다면, 그의 고기를 먹고 당분간은 살았겠지만 얼마 안 가 죽었을 것이다. 설령 바다를 헤엄쳐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해도 호랑이는 제 힘으로 배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없으니 말이다. 파이가 리처드 파커를 죽였다면? 그 역시 당분간은 호랑이 고기로 배를 채우며 생존했겠지만 그 뒤는 어떻게 될까? 파이가 그토록 오랫동안 표류하면서도 이성을 유지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짜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리처드 파커 덕분이었다. 호랑이를 조련하고 그 발톱을 피하느라 긴장을 놓을 수 없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혹은 우리나라와 북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떠나거나 떠나보낼 수 없다. 혹시 홀로코스트를 찬성한 사람들은 그런 환상을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러고 보면 파시즘은 어떤 거대한 착각들의 결합체가 아닐까.) 신자유주의 사회도 마찬가지다. 서구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자원을 먹고 당분간은 살아갈 것이지만, 그 뒤는 어떡할 것인가. 영화에서는 다행스럽게 날치떼가 날아들지만 우리는 불행스럽게도 우리 스스로가 지구 밖 행성을 개발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웃이 하버마스가 말한 것처럼 이성을 가지고 대화로써 최선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존재인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그는 호랑이인 것이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손을 내밀었다면 파이는 벌써 잡아먹혔을 것이다.
생존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졌으면서도 서로 경계하고, 먹이를 챙겨 주면서도 내가 먹힐까봐 도망쳐야 하는 그런 관계. 내가 무엇을 준다고 해도 비슷한 가치로 무엇을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어떠한 약속도 계약도 준비되지 않은, 나의 상징계의 좌표에 자리잡지 않는데도 옆에는 존재하는 그런 것. 건물을 떠나지 않으면서 일도 안 하는, 어쩌면 바틀비 같은 내 이웃.
그럼에도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더욱 어려운 것은 이 말이 무턱대고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싸워가면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산다는 게 이 영화가 주는 메세지가 아닐까 한다.
<여기서부터는 영화의 스포일러>
영화 후반에 나오는 인간 모양의 섬은 거대한 식인식물이었다. 낮에는 평화롭고 정착해서 살 만한 섬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밤에는 연못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을 녹인다. 낮엔 희망을, 밤엔 절망을 주는 섬. 미어캣들과 어울려 살다가 결국 잡아먹히는 섬. 이는 마치 종교든 어떤 사상이든,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놓고 거기에 빠지면 결국 잡아먹힌다는 은유 같다.
주인공 파이는 가족을 모두 잃었다. 나중에는 함께 생존한 리처드 파커와도 결국 헤어진다. 파이는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이유는 이별의 말을 못 전했기 때문이다. 아난디와도, 부모님과도, 호랑이와도 제대로 된 작별이라는 상징적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리처드 파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멕시코의 정글 속으로 사라진다.
'삶이란 결국 그런 거죠, 보내는 것, 가장 슬픈 건 작별인사조차 못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