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금 불편한 용서
스베냐 플라스푈러 지음, 장혜경 옮김 / 나무생각 / 2020년 9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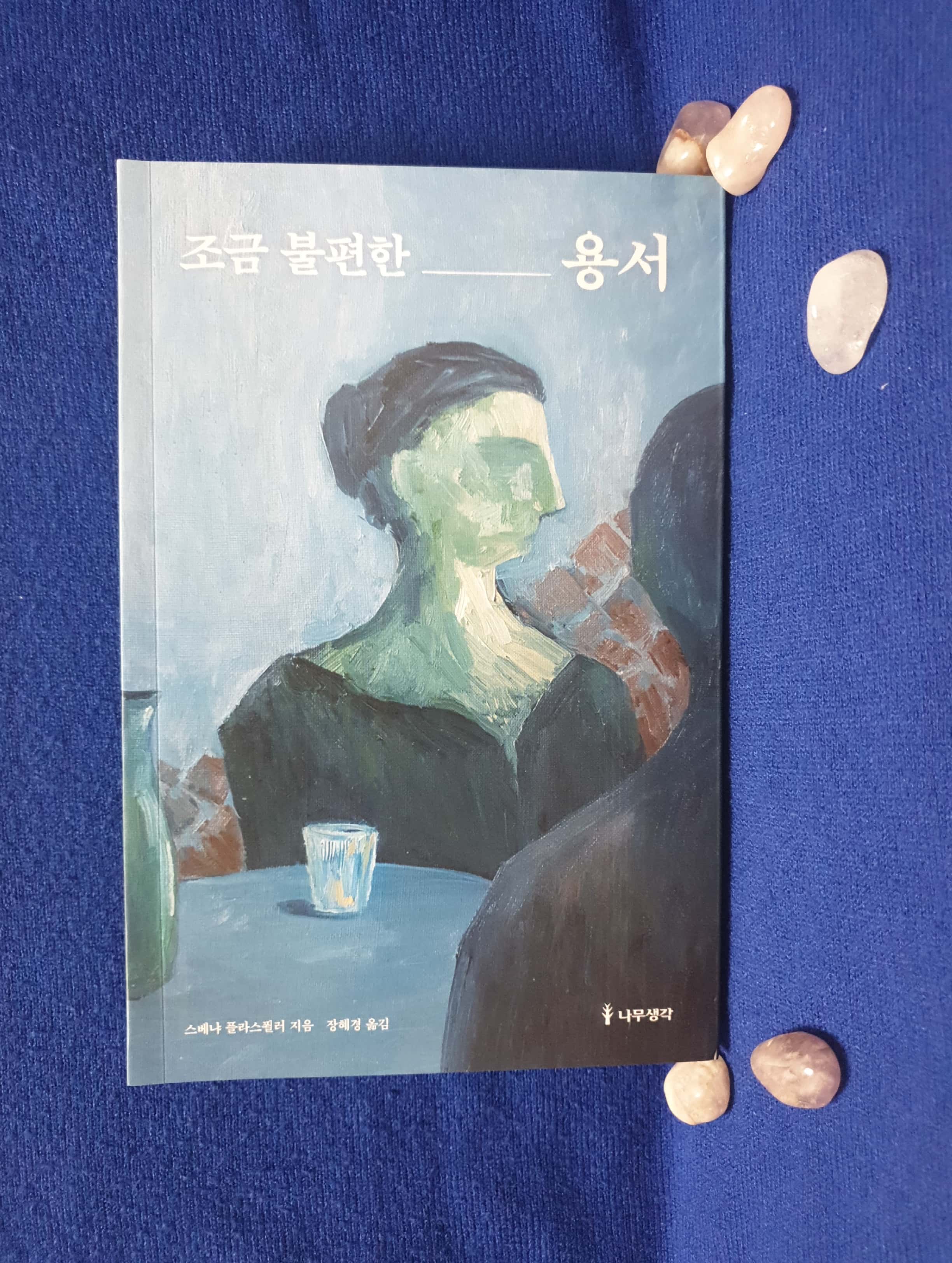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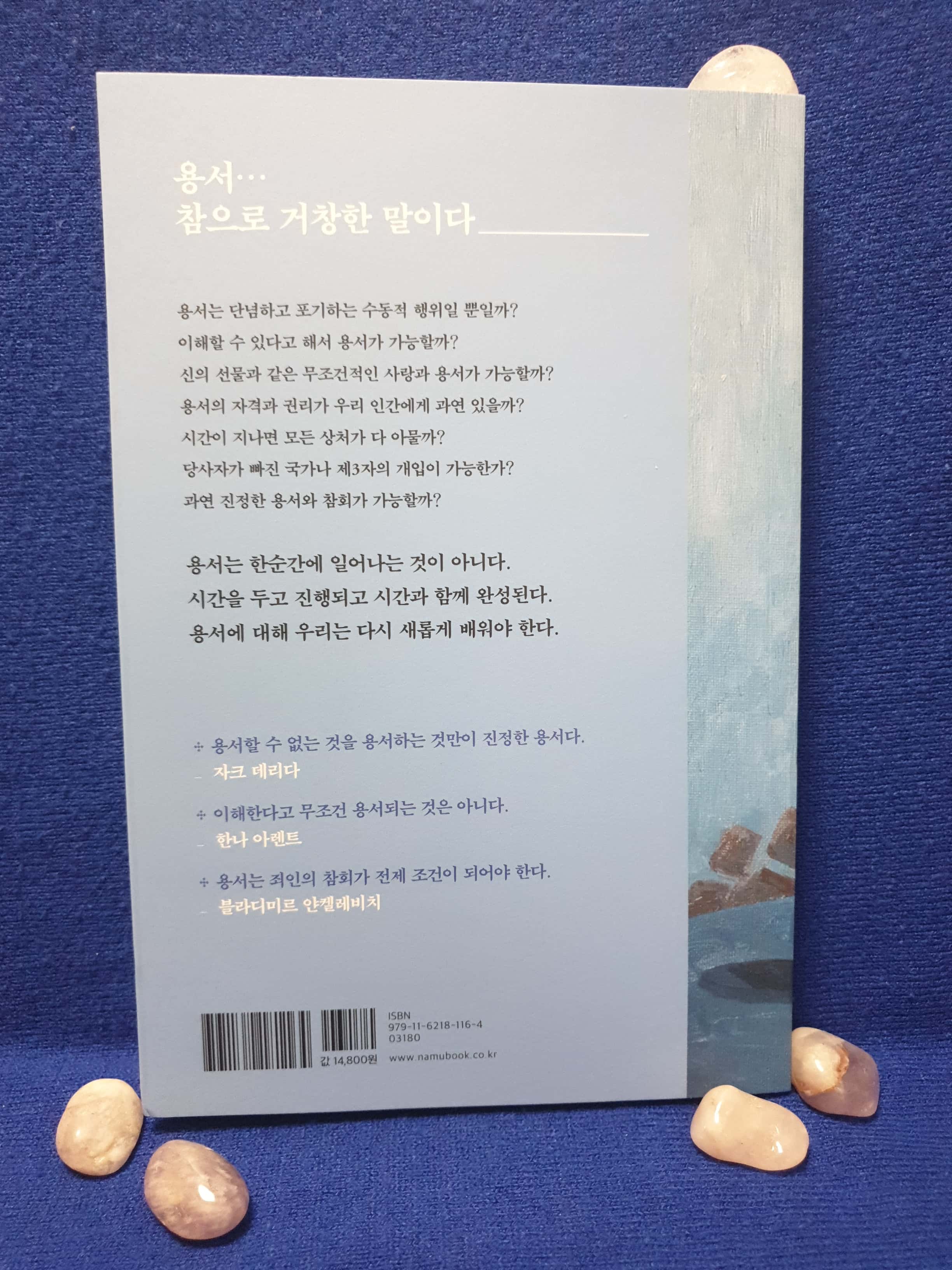
용서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린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를 남발한다.
한나 아렌트, 칸트, 니체, 자크 데리다, 블라디미르 얀켈레비치 등 다양한 철학자, 사상가, 작가들이 용서란 무엇인지? 어떻게 성립하는지? 본질과 의의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다룬다.
용서란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
분노하고 되갚아줄 마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익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사죄는 신의 능력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용서와 다르다.
용서는 행동에 대한 망각이지 행위자에 대한 이해이다.
처음에는 에세이 책인줄 알았는데 용서에 대해 다룬 책이었다.
용서와 이해, 용서와 사랑, 용서와 망각,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설명하다가 질문을 준다.
용서의 시작은 이해이다. 철학자의 말을 빌려와 용서에 대해 정의하다 실제 사례로서 인터뷰가 나오고 마지막에 작가님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용서~하다면 내가 어머니를 용서한 이유도 ~한 것일까?"와 같은 문장이 이론의 마지막에 뚝
던지듯이 나온다. 그리고는 작가님과 어머니 사이에 있던 일이 잔잔하게 서술된다.
당황스러운 구조였다.
이론적 설명을 통해 이해를 쌓고 사례를 통해 공감을 유도하고 의문을 던진다.
거기에 작가님 개인의 이야기가 에세이처럼 나온다면
서술 형식이 섞여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부자연스러움이 작가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지각만 해도 용서해주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뱉는 지금 시대에 대해
생각하고 논하라는 작가님의 의도가 아닐까?
특히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등 독일의 피 묻은 역사에 대한 의문이 그렇다.
홀로코스트를 겪은 세대는 떠나가고 있다.
정치인들은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용서를 구한다.
아이들은 역사의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데도 역사의 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용서는 어떤 의미일까?
단순한 에세이도 철학책도 아니다.
질문의 배경을 이해시키는데 사례까지 보여주고서는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용서란 무엇일까? 이러한 행동도 용서일까?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까?
작가님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용서는 불편한 존재임을 되새김질 시킨다.
독자인 우리가 해야할 일은 질문을 곱씹으며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용서는 불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