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질 때
박철우 지음 / 다연 / 2019년 12월
평점 : 


깊은 생각에는 대체재가 없다. 왜냐하면 생각은 바다를 많이 닮았으니까. 밀물과 썰물처럼 말이다. (p.29)

깊은 생각에는 대체재가 없다는 작가는 일상에서 혼자 있는 시간 속에 느낀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이 책을 통해 풀어냅니다. 작가의 일상 속에 담긴 조각 조각의 생각들이 모여 이 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작가의 조각 조각의 생각들이 심심한 콩나물 국처럼 별 의미 없이 다가왔었는데 책장을 넘기고 책을 덮을 때에는 작가의 생각 조각들이 진한 에스프레소처럼 향기를 내어 내 마음에 머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별거 아닌 작가의 일상 속의 생각 조각들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 친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 괜한 걱정 -
'혹시 몰라서' 넣고 다니는 것들이 가방의 무게를 더한다.
미성년의 티를 채 벗지 못하고 대학에 입학했던 3월, 렌즈가 끼고 싶었다. 맨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안경을 벗은 얼굴, 그 낯섦에 대한 동경이었다. 열 살 때부터 써온 안경이 주는 익숙함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욕망이었다. 그렇게 어른이 될 것 같았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이전과 달라지면 비로소 어른이 되는 줄 알았다.
...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챙겨야 할 게 많아지는 건지 모르겠다. 사람도, 사물도.
바지 주머니에 오천 원짜리 한 장 찔어 넣고, 놀러 다니던 시절이 그립다. 외출할 때 챙긴 거라고는 건강한 몸뚱이와 정신줄 반토막뿐이었으니, 하물며 그것조차도 반토막인지 몰랐던 시절을 이제 와 회상한다. 아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챙겨야 할 거보다 의식하는 게 많아지는 건지도 모르겠다. (p.3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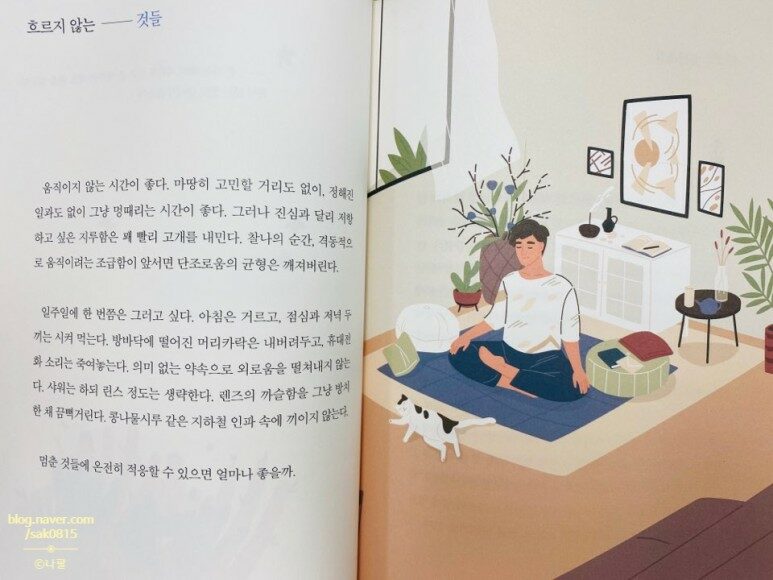
그냥 스쳐지나갈 수 있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라는 소금을 쳐서 성실히 글을 토해내는 작가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이 책에 엮은 글들은 차가운 철제 현관문 뒤편에서 작가가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계단을 밟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쓴 문장임을 작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 계란찜의 마지막 한 숟갈은 허허롭다 -
계란찜 한 숟갈은 꼭 아껴둔다. 밑반찬부터 다 먹고, 마지막 남은 밥숟갈에 몽글몽글한 계란찜을 얹어 먹으면 그 여운이 배로 짙어진다. 초코파이 속 마시멜로를 아껴먹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그 마음을 회상한다. 파이 부분만 걷어 먹고 마시멜로에 손대지 않으면, 마지막 한입 가득 쫀득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닿기만 하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허전함을 느낀다.
해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감에 사로잡힌 시절이 있었다. 뭐든지 뚝딱뚝딱 잘해내는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나만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다. 애달픈 날엔 그렇게 나를 방 안에 묶어두었다. 사는 게 꼭 계란찜 같아서, 빈 숟가락 핥는 일 없도록 최고의 날을 아껴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관조하고 나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되레 나이테는 깊어지는지도. (p. 84-85)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바라보는 반지하 집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신어보지도 못한 신발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작가는 철제 현관문의 차가움을 느끼며 삶의 이면들을 담담히 적어나갑니다.
- 해방 -
하나라도 꼭 되어야 한다면, 거부감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무채색 아이답게 어디에다 붙여놔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면 좋겠다. 동시에 변화무쌍한 사람이고 싶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한다.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생각하는 것도 좋아한다.
...
반면에 펜을 잡을 땐 뽀족한 심 끝에 고독을 투영하고 싶다. 보고, 듣고, 느낀 것 중에서 입으로 뱉으면 그 맛이 덜해지는 말들을, 종이에 적어 표현하고 싶다. 멋있어 보이려는 대신 솔직함을 한 숟갈 더 얹고 싶다. 저마다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한평생 감추고 갈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말로 하고, 글로 쓴다.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말이다. 입으로 뱉고 글로 쓰는 순간엔 초라한 자신을 마주하겠지만 저지르고 났을 때 쾌감은 근사하다.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우려했지만, 알았다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만든 생각 속에 갇히곤 한다. 그럴 때마다 글을 쓴다. 펜을 돌려 나를 가두고 있는 자물쇠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는 일종의 몸부림이다. 좋았든 나빴든, 오늘의 것들을 털어버리고 난 뒤에 죄책감 없이 펄럭일 수 있는 이불이 나는 좋다. (p.9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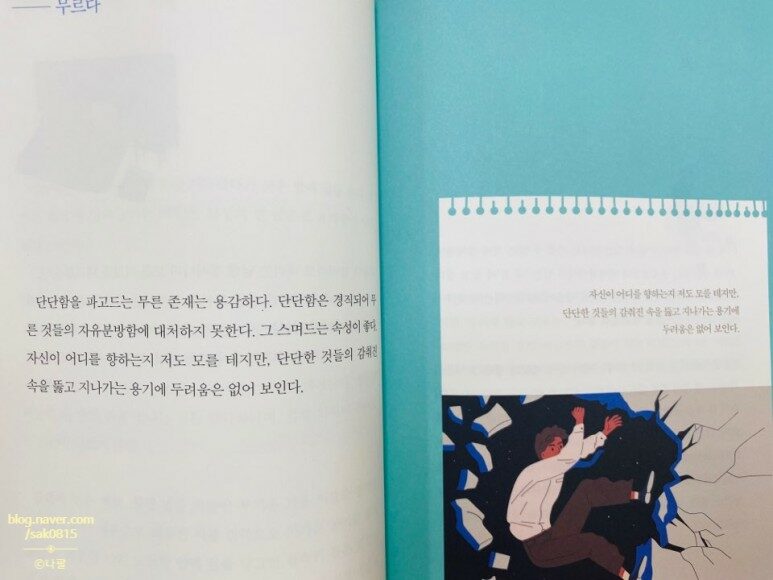
- 감정의 최소단위 -
복잡한 마음이 잘게 쪼개어지면 무엇이 될 것인가, 그 최소단위에 대해 고민해본다. 형태가 존재하는 것들은 잘게 쪼개어지면 입자, 더 잘게 쪼개어지면 분자, 깊숙이 들어가면 원자라 불리는 최소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쪼개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닌데, 여태 불리지 않은 마음이 단위에도 이름을 붙여주었으면 한다. 복잡한 마음이 드는 때, 어떤 감정들이 모여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말이다. (p.236-247)
현관문의 뒤편에서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글을 써내려가는 작가는 오늘의 삶을 위해, 그리고 내일의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글을 써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글이 같은 시대에 사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감정이 앞서는 날에 무거운 안경을 찾는다. 물리적으로 꽉 잡아주는 무엇인가를 몸에 지니면, 흔들리는 마음을 고정해주는 단단한 기분이 든다. (p.78)

https://blog.naver.com/sak0815/22176676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