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찾아서 - 바로크 음악의 걸작을 따라서 떠나는 여행
에릭 시블린 지음, 정지현 옮김, 장혜리 감수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평점 :

절판

나는 첼로의 중저음과 첼로 자체의 커다란 무게감을 좋아한다.
하지만 클래식 악기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건 피아노이고, 현악기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악기는 바이올린이다.
책에서도 첼리스트 카잘스의 등장 이전의 첼로는 그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협주곡도 아닌, 첼로가 독주하는 모음곡에 대한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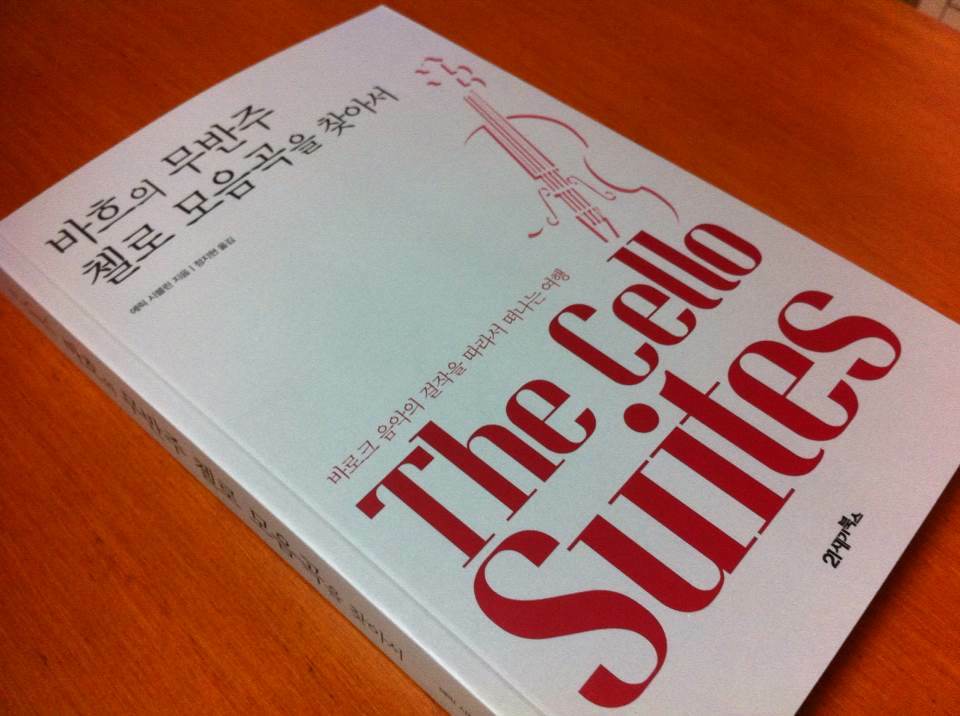
책의 소재인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다.
이 곡들은 바흐가 직접 적은 악보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빛보지 못했던 이 곡들이, 첼리스트 카잘스가 우연히 악기점에서 발견해서 빛을 보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약간의 미스터리와 영화같은 이야기를 가진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 누가 끌리지 않을까?
저자 에릭 시블린도 나와 비슷한 이유로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 관심을 가졌다.
이 책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의 1번부터 6번까지 총 6장이며, 각 장마다 바흐->카잘스->저자가 이 책을 쓰기까지의 여정으로 구성되었다.
한 권에 바흐, 카잘스, 저자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있는 것이다.
나는 각 장을 읽을 때 그 장에 해당하는 곡을 듣고 읽기 시작했다.
그러니 책에 서술된 해당 곡의 묘사가 더 잘 다가왔다.
곡을 들으며 책을 읽으니 이야기가 더 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각 장 앞부분 하단에 해당 곡의 일부를 들을 수 있는 QR코드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책을 읽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역시 카잘스가 우연히 악기점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었다.
길을 따라 악기점에 도착하고, 악기점을 뒤지다가 우연히 손에 넣게 된 악보를 구매해서 나오는 순간까지가 영상처럼 머릿속에 그려졌다.
또 바흐와 음악을 사랑했던 바흐의 고용주 레오폴트 대공의 관계성이 너무 좋았다.
둘은 함께 연주를 하기도 했으며 레오폴트 대공은 바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 장면을이 동화같았다면, 바흐가 레오폴트 대공의 곁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현실적이어서 둘이 함께 했던 때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바흐와 카잘스는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살았지만, 휘몰아치는 역사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점은 같았다.
책을 읽으면서 바흐와 카잘스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 배경까지 접하게 되었는데, 그 또한 흥미로웠으며 바흐와 카잘스에게 미친 영향을 보며 그들의 음악에도 분명히 반영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문에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의 작곡가, 연주자와 함께 배경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음악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적지 않은 양의 주석이 함께 있는데, 나는 탄탄한 주석이 책을 믿음직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중간중간에 책 하단에 보충설명이 있는 점도 좋았지만, 비르투오소, 갈리아노, 튜턴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치 않은 단어들도 하단에 보출 설명 되어있더라면 더 완벽했을 것 같다.
<이 리뷰는 서평단으로 지원하여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 솔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