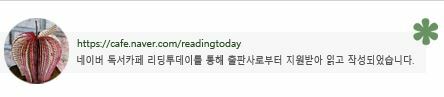-

-
그 부류의 마지막 존재
시그리드 누네즈 지음, 민승남 옮김 / 엘리 / 2021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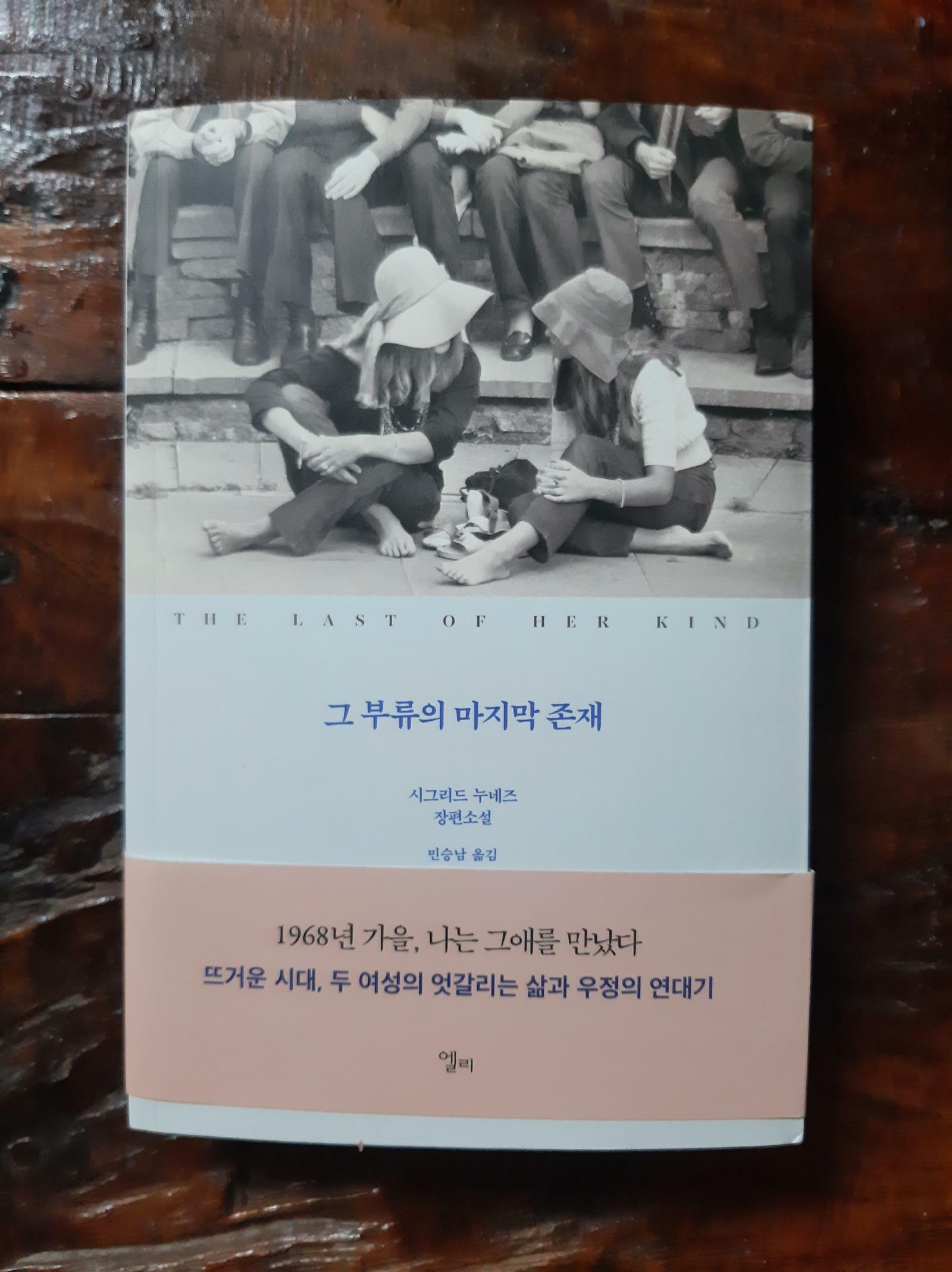
식상한 제목일 수도 있지만, 제목을 붙였다. 격동의 시대, 삶과 우정.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격동의 시대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 겪고 있는 세계 각국도 그렇고, 미국 역시 그러하다. 이 책은 미국의 격동기, 1968년을 지나며 만난 두 여성의 삶과 우정을 그리고 있다.
여성서사가 많이 소개되는것 같지만, 공감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형제애 보다 공감가고 짠해진다는 단어 '자매애' 이 책의 주인공들은 자매 처럼 돈독하진 않지만 함께 겪은 그 세월로 자매를 뛰어넘는 서로의 공감을 전한다. 또한 두 여인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겪은 자들의 삶을 보게 하는 글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극히 평범하다. 대학의 룸메이트로 만난 그녀들. '최대한 다른 세계에서 온 학생과 방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당당히 말하는 앤은 조지와 결이 다른 이다. 앤은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왔고, 그렇기에 스스로에 당당하고 모험적이다. 그와 반대인 조시. 조시는 끔찍한 생활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공부를 잘해서 엄마를 탈출하고자 스스로를 다그친 이다. 명문 사립대에서 만난 그녀들은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 가까워 지지 못했다. 자석의 극처럼 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그녀들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서로가 달라야 친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에겐 예외였다. 보이지 않는 벽에서 서서히 멀어지더니 헤어진 그녀들. 7부로 이루어진 이야기는 이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정환경, 동생, 사랑의 이야기와 함께 앤과의 재회를 읊는다. 1960~1970년대. 인종차별이 무너지며 혼란스러웠던 미국의 시기. 마음껏 자유롭고, 사랑을 나눈다는 청춘의 빛나는 20대를 주인공들은 사유하고, 저항하고, 반항했다. 술과 약이 만연했다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지만, 그들의 성장환경은 저항을 위해 길러졌고, 그렇기에 술과 약을 가까이 할 수 밖에 없었을지도.
누구보다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민감했고, 공감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만드려 했던 이들. 시대를 불문하고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이들에게 그런 수식어가 붙지 않을까. 앤과 조시가 그러했고, 앤은 그런 부류의 마지막 존재였다. 지금은 모든게 풍족해져 남의 고통에 공감할 겨를 없다고 한다. 나 살기도 바쁘고, 내 것 조차 챙기기 바쁜 현대사회에서 앤은 가르키는 '마지막 존재'라는 수식어가 왜이리 슬프게 와닿을까.
책을 읽으며 앤이 되기도, 조시가 되기도 하였다. 시그리드 누네즈, 이름만 들었던 그녀의 필력에 감탄하며 마치 살아있었던 것 같은 앤과 조시의 이야기를 통해 내 주변 격동의 시기를 보냈던 또다른 마지막 존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들이 있어 오늘이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