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물의 소멸 - 우리는 오늘 어떤 세계에 살고 있나 ㅣ 한병철 라이브러리
한병철 지음, 전대호 옮김 / 김영사 / 2022년 9월
평점 : 


해당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분야: 인문 에세이
부제: 우리는 오늘 어떤 세계에 살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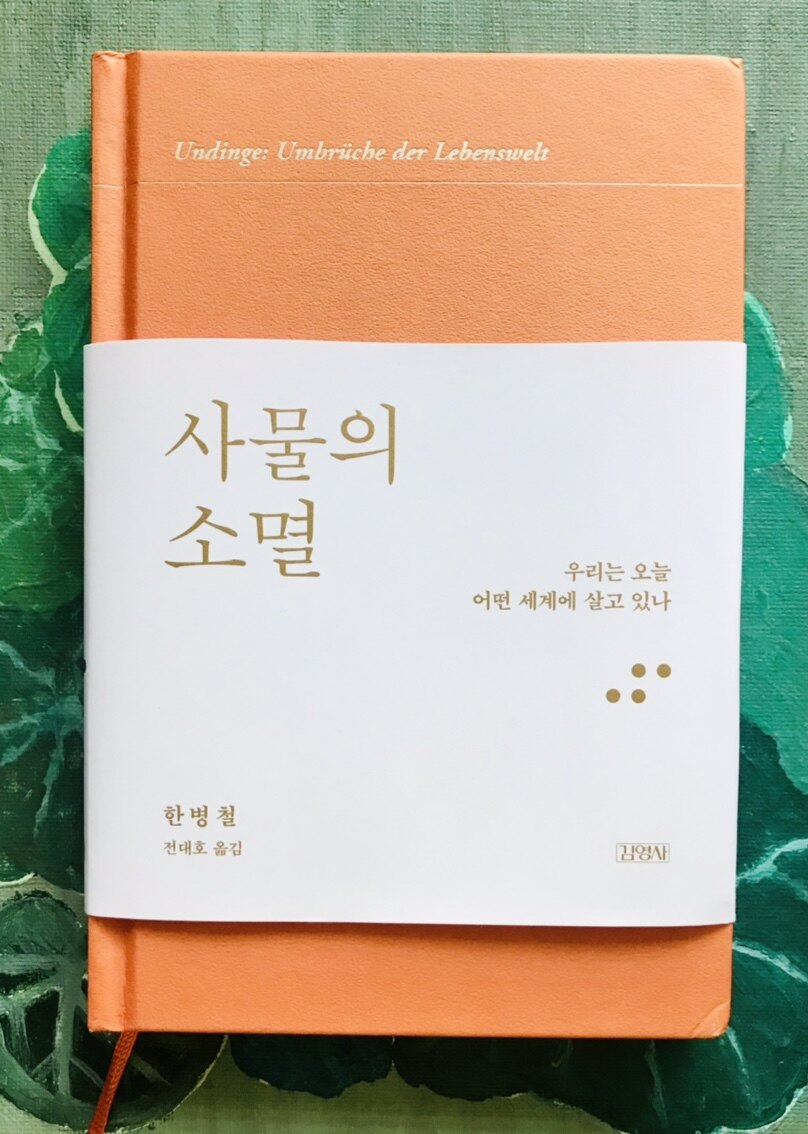

소설 <<은밀한 결정>>에서 일본 작가 오가와 요코는 이름 없는 섬에서 벌어지는 일을 서술한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물들이 사라진다. 사물과 함께 기억도 사라진다.
<<은밀한 결정>>은 우리의 현재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물들이 사라진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사물 인플레이션은 정반대가 사실인 양 우리를 속인다.
오가와 요코의 디스토피아와 달리 사물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소통 도취와 정보 도취다.
정보 곧 반사물Unding이 사물의 앞을 가로막고 사물을 완전히 빛바래게 한다.
우리는 폭력의 지배가 아니라 정보의 지배 아래 산다. 정보의 지배는 자유로 가장된다.
사물과 기억이 사라진 이름 없는 섬은 여러모로 우리의 현재를 닮았다. 오늘날 세계는 비워지며 정보에게 자리를 내준다. 디지털화는 세계를 탈사물화하고 탈신체화한다. 또한 기억을 없앤다. 기억을 되짚는 대신에 우리는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한다.
오가와 디스토피아와 달리 우리의 정보사회는 그리 단조롭지 않다. 정보는 사건Ereignis인 척한다. 정보는 놀라운 일이 주는 흥분Reiz der Uberraschung을 먹고산다. 그러나 흥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는 흥분을, 놀람을 목적으로 실재를 자각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정보 사냥꾼으로서 우리는 고요하고 수수한 사물들을, 곧 평범한 것들, 부수적인 것들, 혹은 통상적인 것들을 못 보게 된다. 자극성이 없지만 우리를 존재에 정박하는 것들을.
서문
[사물의 소멸]은 디지털화한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저자의 철학적 성찰이 담긴 인문 에세이다.
가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모든 지식들을 잘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기술은 발전하고, 정보는 넘쳐나는데 나에게 남는 건 추상적인 단편들뿐이다. 나는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자 한병철은 디지털화로 인한 사물의 소멸에 주목하며 이것이 사람들의 관계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3D 프린터가 '사물이 존재의 차원에서 지닌 가치를 없앤다'라는 문구를 보고 철학적인 사고는 여기까지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보통 상태의 내 사고는 이 세계의 패러다임인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찌들어있기 때문에-의식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생각해버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평소의 나는 3D 프린터를 보며 그저 기술 발전에 감탄하고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할 뿐이다.
이과 출신이긴 하지만 평소 내가 뼛속까지 이과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애초에 이런 이분법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과 그룹에서는 내가 문과에 가장 가까운 쪽에 속했으니까. 그런데 [사물의 소멸]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 싶다는 욕망,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생각은 한다. 나에게는 신기술이 주는 꿈과 희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부작용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 무엇이든 부작용은 존재하는 게 당연하니까.
디지털화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디지털화의 혜택이 막대하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 사회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소통 방식에 대체로 순응하고 심지어 열광한다면, 그 찬란한 새로움의 뒷면에 밴 어둠을 들춰내는 것이 그 사회를 위하여 철학자가 해야 마땅한 일일 것이다.
역자 후기
철학자인 저자는 그 부작용에 집중한다. 여태까지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생각도 해본 적 없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사물의 소멸]을 읽으면서 나는 그 경이의 뒷면에 신경 쓰게 되고 그렇게 그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물론 저자 역시 디지털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인정한다. 다만 그 흐름을 탈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 책은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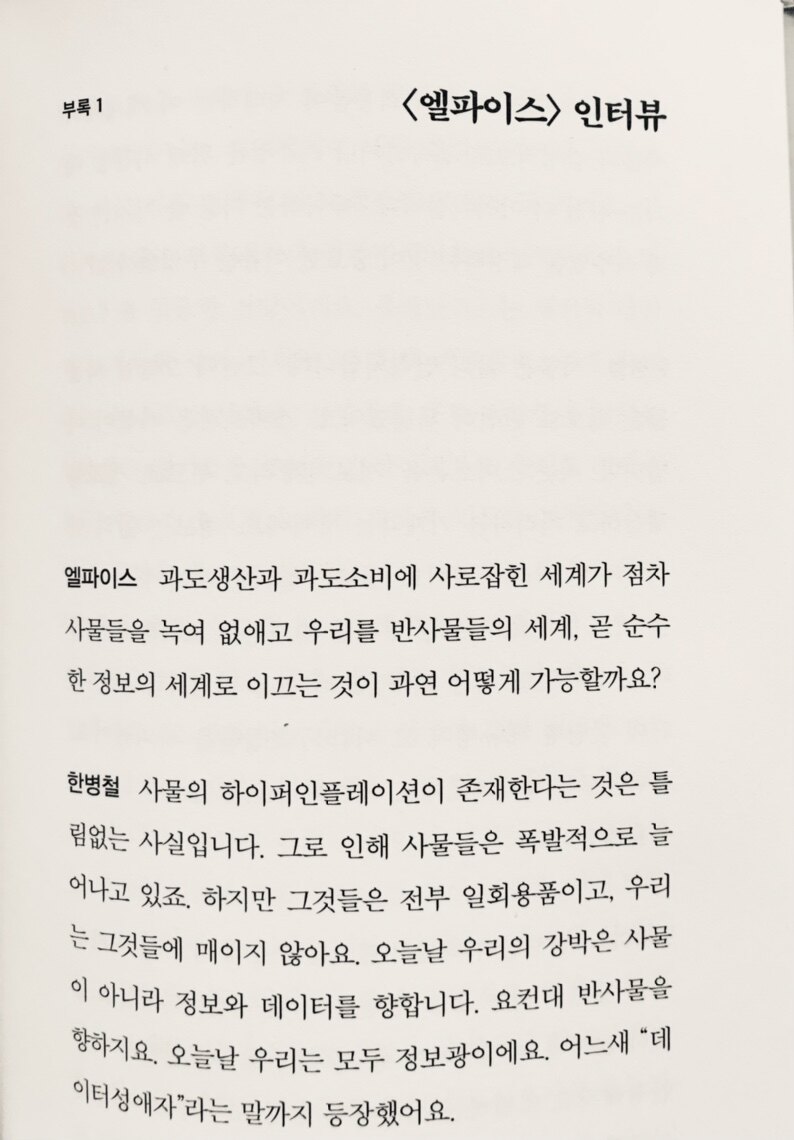
철학 이야기지만 난해하고 어려운 책은 아니다. 앞부분에 하이데거의 현존재 분석과 기술 비판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개념 정도만 잠깐 언급되는 정도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명료한 편이지만 읽다가 이해가 잘 안된다면 맨 뒤 부록 인터뷰 대담과 역자 후기를 먼저 읽고 본문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사물의 소멸]을 통해 아주 만족스러운 독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김영사의 다른 현대철학 책들도 도전해 볼 예정이다. (표지가 비슷한 책들이 있어서 시리즈인 줄 알았으나 시리즈는 아닌 듯. 시리즈/세트 구성 원해요.. plz)
+ 처음 [사물의 소멸]이라는 제목을 보고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이 떠올랐는데, 두 책 모두 디지털화로 인한 세계의 변화와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사물의 소멸]이 디지털화가 사람의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는 반면 [소유의 종말]은 비즈니스적, 경제적 측면에 집중하는 점이 다르다. 두 책 모두 읽어보고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