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벗어 달라는 제안을 받은 교사'라는 종잡을 수 없는 사적인 이야기는 이미 죽은 엄마와, 수상한 명함, 오만한 귀부인, 모든 걸 방관하며 달관한 귀부인의 딸로 흘러간다. 예상치 못하게 발발한 전쟁은 뒷거래를 즐기는 군인, 쓸데없이 우직한 수학교사 출신의 징집병, 돈 가방을 든 헌병을 끌어드리며, 변호사, 참모부, 신부로 탈바꿈하는 데지레라는 가공할 인물의 무대가 되어준다. 애초에 이상한 제안을 받은 교사는 지금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 폭격 소리와 순식간에 시체가 뒹구는 한가운데서 뇌가 액체가 되어버린 듯한 경험을 하고, 그토록 원하던 갓난아이를 셋이나 수레에 싣고 순식간에 걸인이 되지만, 전쟁은 그녀를 비껴가는 것 같다.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도 계속 중인 전쟁, 전쟁 속 개인들의 이야기는 의외로 깊이 들어갈수록 전쟁과 관계가 없는 듯한 게 신기하다. 전쟁은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뒤틀리게 하고 파괴하지만, 전쟁 전에 이미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뒤틀리고 파괴된 것들이 있다. 전쟁 직전에 많은 것을 잃고 사라진 삶과, 사라진 삶의 무게를 지고 전쟁을 치르는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이어진다. '이번에도 상황이 모든 이를 화해시켜 주었다'(611p, 에필로그)는 담담하면서 아이러니하다. 전쟁도 개인이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많은 이들의 삶은 이미 충분히 슬프고 가혹하다는 것을 정신없이 몰입도를 높이는 소설을 읽으며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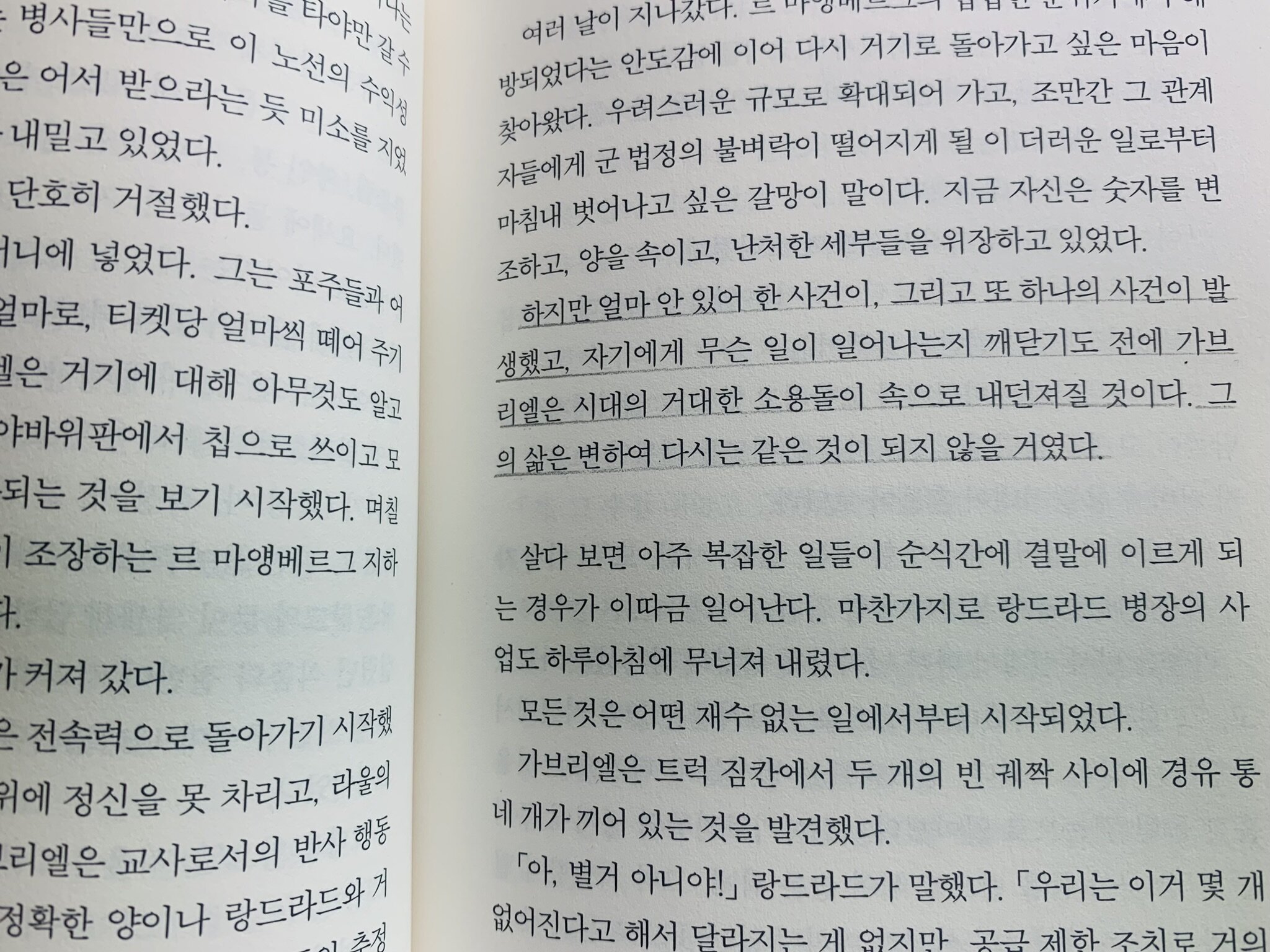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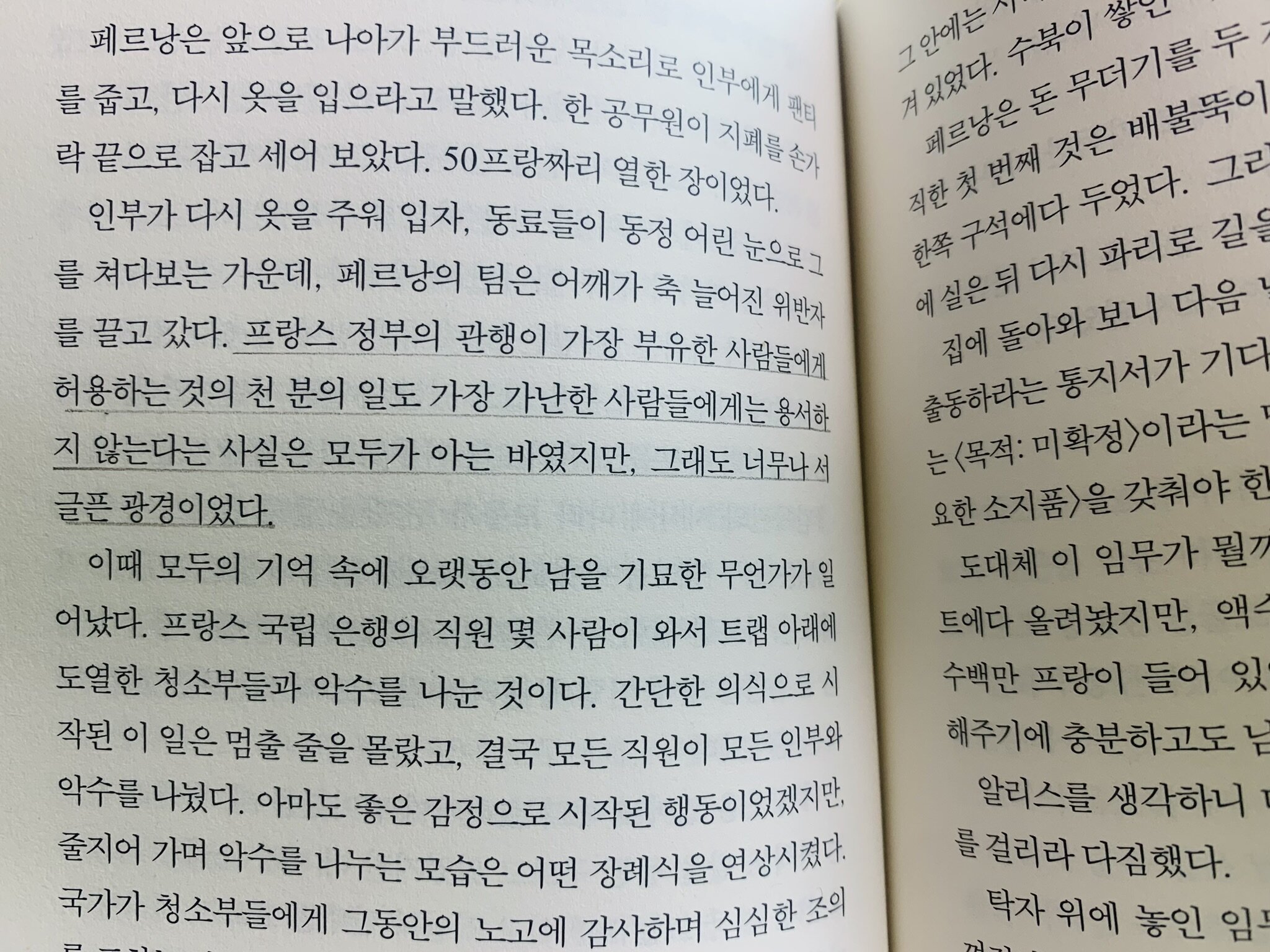
슬픔 - 고통의 거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