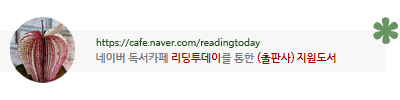책을 읽다가 한 문단 전체를 필사했었다. <빗속의 고양이>의 초입, 흔해 보이는 배경 묘사였는데, 독특하다고 생각되었다. 몇 문장 되지 않는데 그 분위기가 선명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책을 다 읽고 그 문단이 역자 해설에서 번역의 차이의 예로 다루는 걸 읽고선 무척이나 놀랐다. 기존 번역과 느낌이 너무나 달랐다. 문학 번역은 나에게 그저 난해하게만 느껴졌는데, 문학번역에서도 가능한 직역을 했을 때에만 느껴지는 감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문득 필사의 욕구가 느껴졌던 번역문을 역자 해설의 영어 문장으로도 필사해 보고, 헤밍웨이의 원문의 느낌에 더욱 가 닿을 수 있었다. 좋은 번역과 옳은 번역, 번역된 시대의 영향도 있을 것 같다. 나의 감상과 번역자의 감상이 동일한 언어로 표현되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모쪼록 여러 판본으로 읽어보고, 원서로도 읽어본다면 좋아하는 작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사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피하고 싶은 장편이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는 너무 좋아하는 소설이다. 직접 전쟁에 뛰어들고, 쿠바에서 살았던 특이한 작가. 그 작가의 색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단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여러모로 즐거운 읽기였던 새움 출판사 움라우트 세계문학, 헤밍웨이 단편선 <킬리만자로의 눈>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