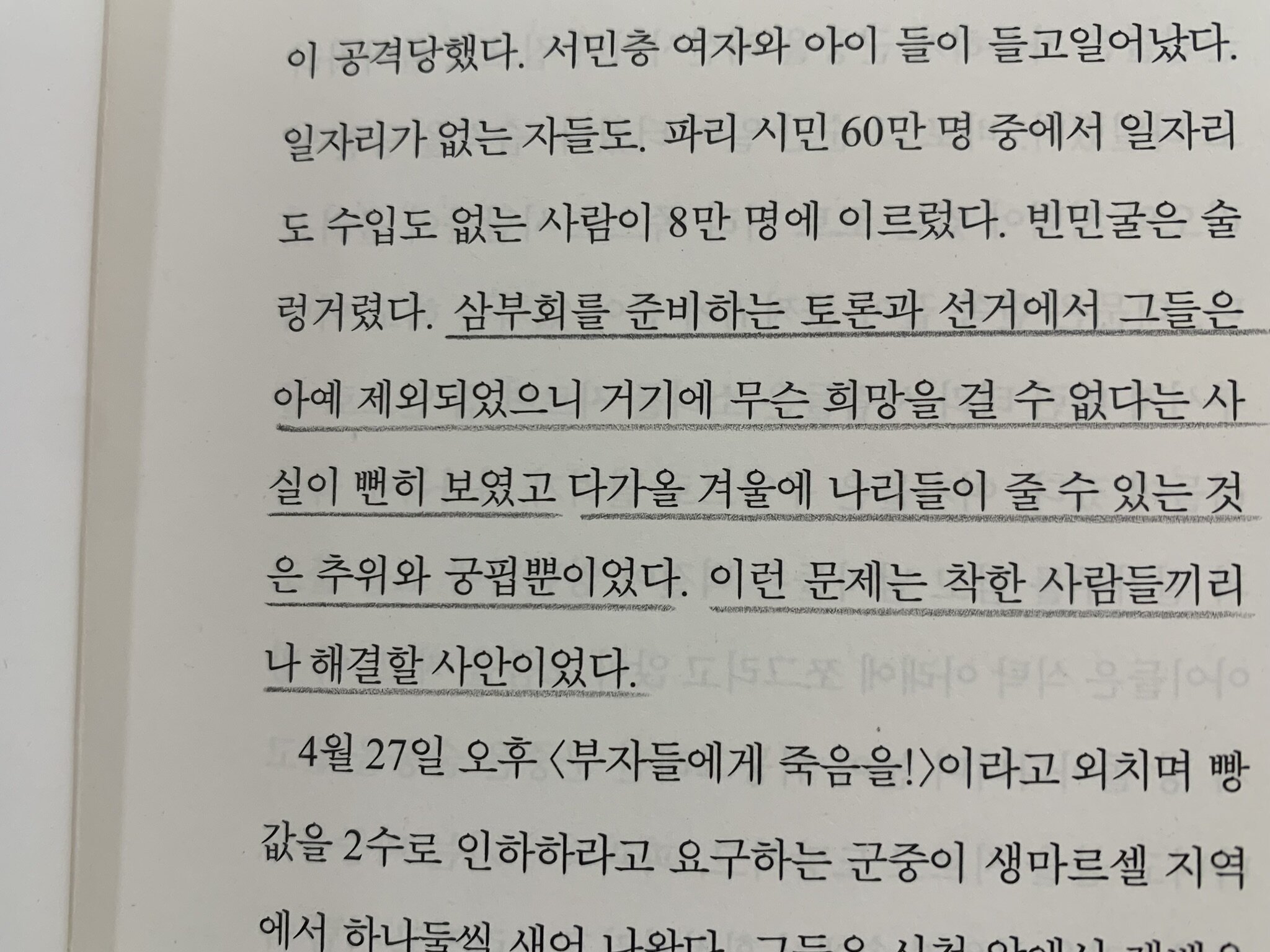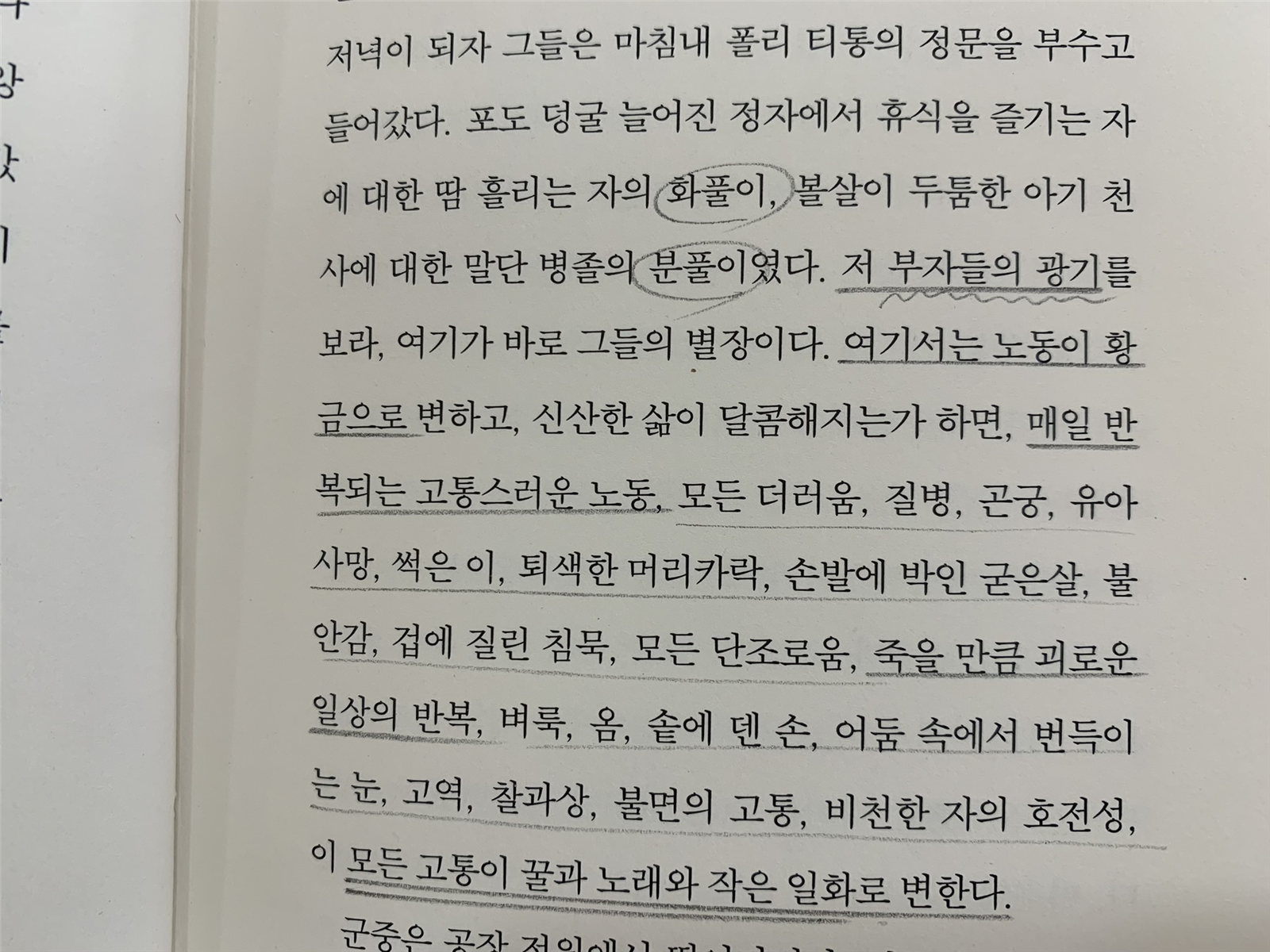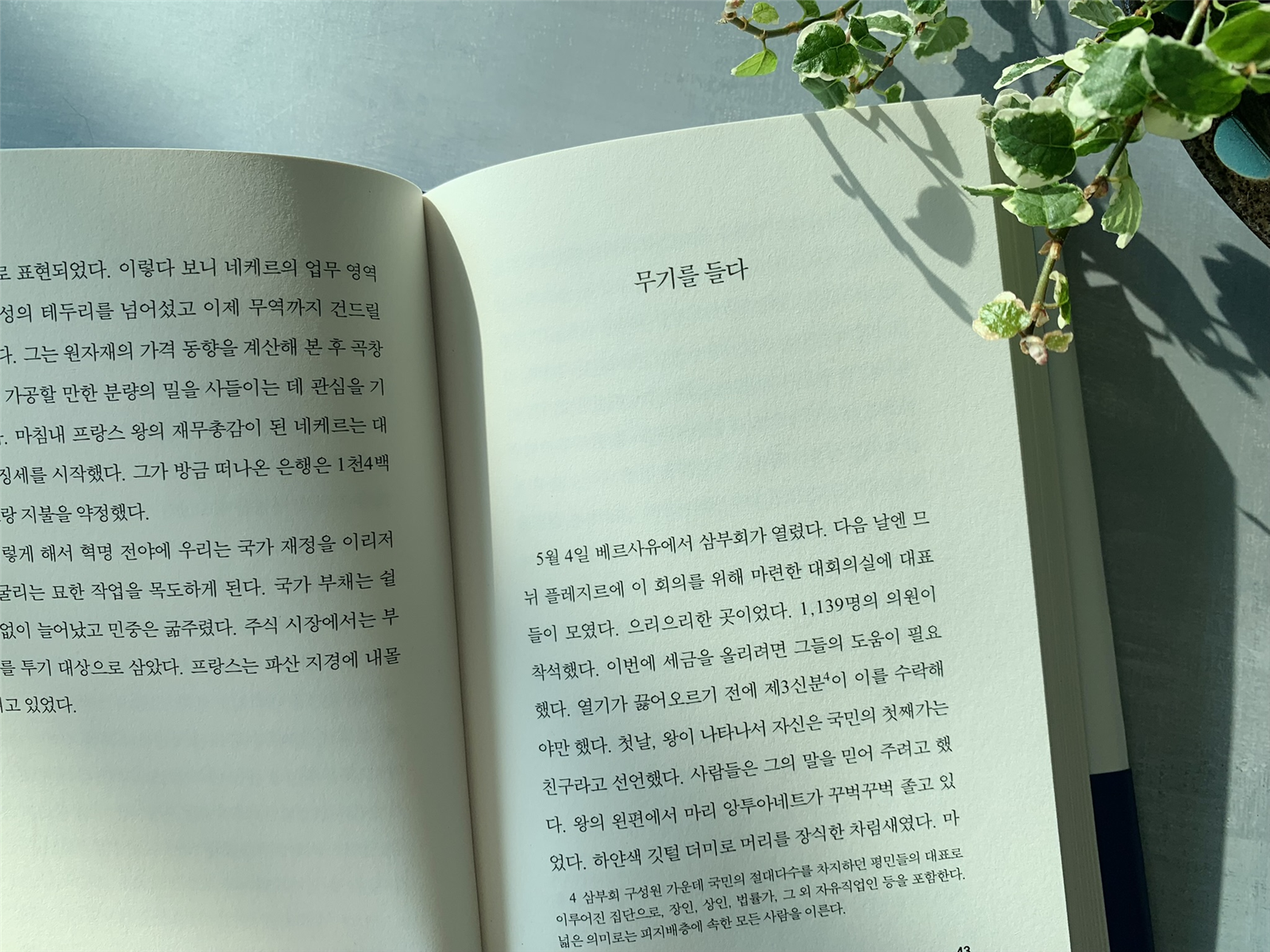소설은 흥분한 군중의 산발적인 습격, 약탈, 무기를 얻기 위해 여기로, 저기로, 몰려다니고, 바스티유로 향해 대포를 쏘고 도개교를 내려 왕권의 상징인 감옥을 함락하는 과정을 그리기에 과연 적합할까? 소설의 장면 묘사는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세밀했다. 영화라면, 당시의 복식을 입은 배우들의 생생한 표정과 억양, 소음을 재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삶, 어린 나이에 떠나보내야 했던 그들의 아이, 일상인 고생과 짧은 행복은 알려줄 수 없다. 그들의 양말은 누가 뜨개질 했는지, 외투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일일이 알려줄 수 없다. 에리크 뷔야르는 소설이라는 장르로 모든 장면을 넓게, 또는 좁게, 길게 또는 짧게 자유자재로 기술하며, 소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현했다.
14세 아이의 팔이 관통되고, 총상 입은 12세의 아이가 판자에 옮겨진다. 수많은 단역들의 이름을 적어 넣고, 감정을 치열하게 묘사하더라도, 불현듯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건들로 인해 시시각각 군중이 더욱더 흥분하듯이, 독자들도 군중 속에 섞여들어가 같이 흥분되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