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대하고 게으르게
문소영 지음 / 민음사 / 2019년 6월
평점 :



내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시와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다. 전시회에 가봐도 뭘 느껴야 하는지 뭘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물론 그림을 감상하는데 어떤 규칙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나는 그저 뭐가 급한지 쌩~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미술이나 시 분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저자처럼 그림에서 무엇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나도 나 나름대로 다른 분야에 탁월하지 않겠느냐라는 위안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이 책은 좀 작고 내가 주로 읽는 책들에 비해 그리 두꺼워 보이지 않아서 빨리 읽겠구나 했는데, 의외로 좀 걸렸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들고 있었던 건 아니고 한 이틀쯤 읽었다. 말은 에세이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에세이는 아닌듯. 내가 생각하는 에세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속 신변잡기라고나 할까 하는데 이 <광대하고 게으르게>는 생각을 하게 하는 글귀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점차 내 나이가 생각이 많아져서인지 쉽게 책장을 넘기지 못했던것 같다. 아니면, 에세이에 대한 나의 느낌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는 총 6부로 게으르게, 불편하게, 엉뚱하게, 자유롭게, 광대하게, 행복하게로 나뉜다. 그 안에 7편씩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 내가 유심하게 본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오해"편이 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디에선가 먼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본문 中 p.47)
아름다운 숲길에서 갈래길이 나온다면 분명 한길만 선택을 해야겠지. 뭐 물론 얼마큼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른길을 가도 좋고, 다음에 다시 방문에 이번에 지난번에 가지 않은길을 가야겠다고 할수는 있겠지만 어디 우리 인생이야 '다시 한번 갑시다~'가 될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한길만을 선택하고자 할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한다"라는 것을 교훈처럼 강조하는 오해가 생겨났다는 이야기이다. 프로스트는 굳이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내가 걸은 길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남기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마치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은 실패의 길이므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 성공의 길처럼 생각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생기는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

프로스트의 시를 읽을 때마다 떠오른다는 조지 이네스의 그림을 옆에 실어주시니 저 끝 어디선가 두 갈래길이 나올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것인가. 과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감당할수 있을까도 궁금하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망설임과 선택의 연속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길을 택하든, 가지 않은 길은 그 미지로 인한 신비와 아쉬움을 황홀한 안개처럼 두르고 저 멀리에 있을 것이다.(본문 中p.51)
두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을 거절할 권리도 있소이다"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은 <돈키호테>를 읽다가 어딘가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것 같아 중도에 포기했었는데 왜 난 이런 이야기를 몰랐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쳤는지 말이다. 이 이야기의 제목이 눈에 띄었던 것은 요즘 참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여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혹시나 이런일을 내 딸아이가 겪게 되는건 아닌가 걱정스러운 맘이 있어서 인지도 모르겠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일에 도전할때 쓰기 딱 좋은 말이지만 그것을 이성에게 쓰기는 좀 씁쓸하다. 아마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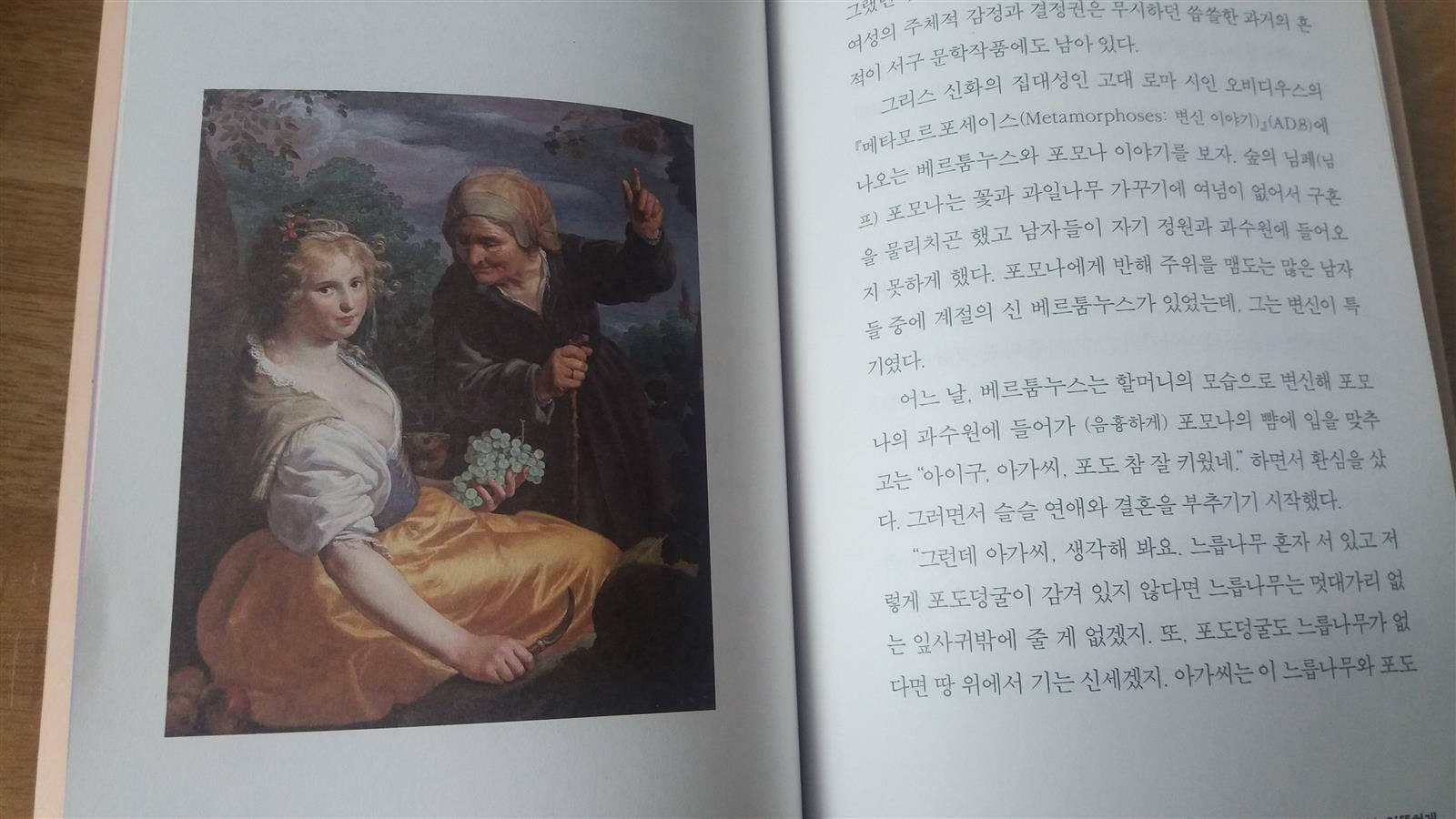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메타모르포세이스>에 나오는 베르툼누스와 포모나 이야기를 보면, 많은 남자들이 구애를 하지만 그를 무시하는 포모나에게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신한 계절의 신 베르툼누스가 연애와 결혼을 부추기며 여러 이야기를 하고 본 모습을 드러냈다. 포모나가 계속 거절으르 하면 힘으로라도 굴복시킬 생각이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포모나도 베르툼누스의 이야기와 그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는게 결말이라는데, 왜 꼭 남자들이 구애를 하면 여자들은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만약 포모나가 마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사회에 빈번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는가. 이에 반해 <돈키호테>에서는 어떤 양치기 청년이 아름답고 부유한 독신주의 여성 마르셀라 때문에 상사병을 알다 숨을 거두게 된다. 그 청년뿐 아니라 많은 남자들이 마르셀라에게 반해 상사병을 알고 있었는데 마르셀라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 비난을 퍼붓는다. 이에 마르셀라의 항변을 들어보자.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럴진대, 왜 오로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말했다는 이유로 내 뜻을 억지로 굽혀 그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고독을 선택했습니다.(…)나 나는 그것을 그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욕망이 희망으로 지탱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소스토모(상사병으로 죽은 청년)에게 아무런 희망도 준 적이 없으므로, 나의 잔인함이 아니라 그 자신의 집착이 그를 죽인것입니다."(본문中 p.130)
이것이 내가 다시 <돈키호테>를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였다. 왜 이런 이야기를 몰랐을까. 지금보다 400년전에 세르반테스는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참 진취적이다. 여성에게 사랑을 거절할 권리를 주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과거에만 머물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이 이야기는 "엉뚱하게"편에 속해있었는데 이보다는 "불편하게"에 넣어도 무방할것 같다. 꼭 여성에게만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보다도 여자가 피해자가 많은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로 하여금 나를 프로 불편러로 본다면 아직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생각할게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이다. 에세이를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내게 살짝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고나 할까. 하지만 그 이야기속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같다. 이런 좋은 책에 첫번째 독자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