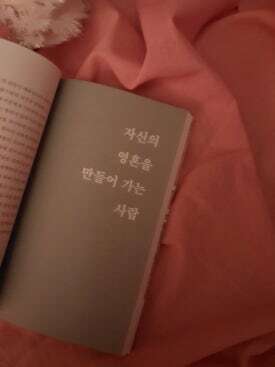-

-
세상에 나가면 일곱 번 태어나라
아틸라 요제프 지음, 공진호 옮김, 심보선 해설 / 아티초크 / 2024년 4월
평점 :



“삶은 나를 강인하게 단련시킨 반면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937년, 시인 아틸라 요제프가 입사를 위해 쓴 자기소개서의 일부이다. 그는 이 글을 쓴지 10개월 후 화물열차에 몸을 던졌다. 그의 나이 32살이었다. 기시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리라는 자각. 32살 젊은 시인의 문장이 가슴을 때린다. 이 독백은 삶이 자신을 강인하게 단련시키는 중이라고 위무하며 오랫동안 스스로를 단속하고, 닦아세우고, 몰아세웠던 청춘의 자기 고백이다.
사면초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련 속에 시인은 던져진다. 극한의 가난, 세 살 때의 아버지 가출, 열네 살 때의 어머니의 죽음, 일을 해도 어찌해 볼 도리가 가난, 낙인과 조롱, 차별과 처벌.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철벽의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 시인은 어떻게 정신을 가다듬고, 분투할 수 있었을까.
아틸라 요제프의 바리케이드와 횃불은 시였다. “뼈가 닿는 소리를 아는 나”는 “우리의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 아닌 비겁한 침묵”이라는 것을 알기에 “도끼와 칼과 돌을 집으려 손을 내민다.” 그의 시는 세계의 비참과 고통을 증언하고, 반역과 저항의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한다.
이번에 재출간된 아틸라 요제프 시집 ‘세상에 나가면 일곱 번 태어나라’는 국내에서 단행본으로 만날 수 있는 그의 유일한 시집이다. 시편마다 남겨진 거의 1세기 전, 다른 공간을 살았던 청년의 목소리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 청년의 목소리와 공진한다. 여전한 불평등과 차별, 여전한 배제와 억압 속에서 아틸라 요제프의 시들은 일깨운다. 늪이 깊을수록 각성과 저항의 언어를 길어내라고, 어둠이 깊을수록 자기 안에 빛을 스스로 밝히라고. 아틸라 요제프의 음성으로 묻는다.
대답해 보오,
원래 여기 사는 사람이요?
그리움이 무섭게 사무쳐
그치지 않는 이곳
억겁의 세월에 눌린
비참한 현인
말마다 주름마다 표정마다
일그러진 얼굴들
24페이지. <애가> 중에서
우리 각자가, 아니 우리 모두가 무서운 그리움에 사무쳐 그리워하는 그 장소는, 시간은 어디인가? 그곳에 사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틸라 요제프는 그를 일곱 번째 사람이라 부른다.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할 때에는
적에게 일곱 사람을 보여라-
일요일 하루는 쉬는 사람
월요일에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
대가 없이 가르치는 사람
물에 빠져 수영을 배우는 사람
숲을 이룰 씨앗이 되는 사람
야만의 선조들이 보호해 주는 사람
하지만 그들의 재주로는 충분하지 않아 -
너 자신이 일곱 번째라야 해!
29페이지. <일곱 번째 사람> 중에서
아틸라 요제프는 우리에게 태어날 때에도, 저항 할 때에도, 사랑에 빠졌을 때에도, 시인이 되어도 일곱 번 변신하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선언한다. 자기 갱신과 자기 변용. 시인인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시스템과 권력에 의해 대량 복제되는 복사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발명해내는 해방적 주체로 끊임없이 재탄생하라는 기도이다. 일곱 번에 머물 이유도 없다. 여덟 번, 아홉 번... 거듭 태어나는 존재는 전체주의적 폭압에 포획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아틸라 요제프의 ‘일곱 번째 사람’의 무덤에는 단정할 수 없는 무수한 사람이 묻힐 것이다. 또한 그런 이유로 “세상이 너의 비석이 될 거야-” 세상 전체를 비석으로 가진 사람이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확 트인다.
젊은 시인의 전망은 얼마나 눈부신 것이었나. ‘서리’, ‘누런 풀’, ‘유리 제조공’, ‘어머니’ 등 다른 시들을 읽는다. 출구 없는 가난과 노동에 꺾이고 꺾이는 신체와 정신. 이 고단한 목격 속에서 정신의 창발을 위해 애썼던 부단한 그의 고투는 어떤 것이었을까. 시집에 실린 시들이 보여준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이상과, 그의 낙담과, 그의 절망을. 그리고 그의 애씀을.
어깨에 봄을 두르고 다니며
가슴에 봄을 먹이는 나
- 중략
아무것도 나의 무릎을 꿇리지 못한다.
잡초로 무성한 어머니의 무덤 말고는, 아무것도.
75페이지, <격려의 노래> 중에서
다시 처음으로. “삶은 나를 강인하게 단련시킨 반면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금쯤 조금은 편안해졌을까. 앞서 간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고된 삶을 살고, 살았던 모든 이들, 그리고 스스로를 애도하는 시를 그는 남겨 두었다. 고즈넉한 별 아래, 따뜻한 빵 조각의 온기를 간직하고 그가 영면하기를.
나는 어른도 아이도
‘헝가리인’도 ‘동포’도 아니다-
여기에 누운 나는 당신처럼 지친 한 사람.
저녁은 고요를 퍼 담고
나는 따뜻한 빵 한 조각인데
고즈넉한 하늘의 별,
강가에 나앉더니 내 머리를 밝히네.
56페이지, <지친 사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