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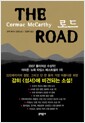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퓰리처상을 탔다느니, 아마존이나 뉴욕 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했다느니, 말빨 좀 서 주시는 소설가 스티븐 킹이 올해의 소설 1위로 뽑았다느니, 뭐 그런 숫자와 기록 따윈 저리 가라 해두자.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 마음에서 후순위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상이야 유독 상복이 있는 작가가 있기 마련이고, 혹 <로드>의 작가 코맥 매카시가 소설가 스티븐 킹과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면 낭패지 않은가. 만약 이렇다면.
매카시: '오우, 킹, 나 이번에 책 한 권 냈는데, 내가 말년에 늦둥이를 봐서 무럭무럭 키우고 있잖은가? (잠시 침묵) 알지? 분유값 장난 아닌거. 책 좀 팔아야 하니까 잘 부탁해.
킹: 나만 믿어 형, 내가 올해의 소설 1위로다가 입소문 좀 내줄 테니까.
뭐 베스트셀러 몇 주간 몇 위네 그 따위 숫자놀음은 신경도 안 쓰는 나이기에, 책 표지에 뭘 이리 주절주절 써 놓았나, 내용에 자신 없으니까 인해전술로 무슨무슨 상, 뭐 몇 위, 요 따구로 포장한 거 아냐? 했었다.
....................
불경스러운 짓이었다. 이런 세계를 창조해낸 작가, 먼발치에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멸망한 세계. 그 어떤 희망도 없는, 빛마저도 빨아들일 듯한 절망의 세계.
물론 종말의 세계야 <나는 전설이다> 등의 소설 및 영화에서 얼마든지 다루고 있지만, 이처럼 몸서리처질 정도의 지독한 절망의 세계를 이제껏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좀비도 없고, 뱀파이어도 없고, 유혈 낭자한 액션도 없지만,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다. 종이 한장에 담긴 수백의 글자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와 책장을 덮어도 쉽게 <로드>의 세계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뭐랄까 늪? 그래, 늪. 허우적거릴수록 빠져드는 늪과 같다고나 할까? 책을 읽는 내내 바짓단부터 서서히, 서서히 스며들어 끌어당기는 늪처럼 절망과 고통이 온 몸을 잠식한다. 살아서, 절망이 날 갉아먹는 것을 손놓고 보고만 있을 뿐이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희망이 절망에 갈려들어가는 소리.
남자가 아는 것이라고는 아이가 자신의 근거라는 것뿐이었다. 남자가 말했다. 저 아이가 신의 말씀이 아니라면 신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야. _<로드> 본문 중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
그리고 우리는 불을 운반하니까요.
우리는 불을 운반하니까. 맞아.
알았어요. _<로드> 본문 중에서
인간계는 결국 신계의 그림자이다. 모든 것이 환상과 같은 그림자이되, 그림자는 신을 닮았다. 아버지는 신과 가장 닮아 있다. 한편 신과 가장 가까이 있기도 하다. <로드>에 종종 등장하는 '불을 운반한다'는,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 글귀를 접하며,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죄로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 먹히는 신 프로메테우스가 떠올랐다.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에 파헤쳐진 간은 매일매일 새로이 재생되고, 프로메테우스는 매일 간을 쪼이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가. 아비가 된다는 것은 매일 간을 쪼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일지도 모른다.
세상을 밝힐 불씨 같은 깨우침을 전한 고타마 싯다르타, 그도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자식을 깨달음의 길에 내준 아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들을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는 것이다. 단 삼 년 간의 짧은 공생애를 위해 아들 예수를 내준 아비는 또 어떠하였을까. 아들의 영혼에서 신을 보되 그 육신에서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창세기를 쓰는 심정으로 아들을 길에 내어주었을 것이다. 고타마와 예수, 또다른 '아버지의 아들'들이 걸어간 그 길, 세상에 신을 내어놓되 아들을 지운 위대한 아버지들. 세상이 새로 태어나는 것보다 아들을 길에 내어놓는 게 아비로서는 더 힘든 일일 것이다.
<로드>에서의 아버지는, 인류를 위한 불을 어린 아들에게 남기고,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고통은 자신이 감당하기로 한다. 인류라 부를만한 것들이 아직 남아 있을까? 괴물보다 더 끔찍한 두 발 짐승 - 인간 - 이 생존하는 이 지독한 세상에, 인류를 위한 불을 아들에게 부탁한 아버지. 세상에 던져진 문명 개화의 불씨, 세상의 마지막 불씨로서의 불, 처음의 불길을 다시 타올릴 불. 그리고 희망.
결국 코맥 매카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빌려 새로운 신화를 쓴 것이다. 신계에 가장 근접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