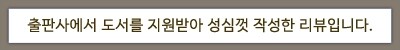-

-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
에쿠니 가오리 지음, 김난주 옮김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21년 10월
평점 :

절판


에쿠니 가오리(Ekuni Kaori, 1964년~58세) 도쿄 세타가야에서 시인이자 수필가인 「에쿠리 시게루」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별명이 특이한데, 일본에서는 여성 무라카미라고 부른다고 한다. 무라카미의 소설처럼 외국으로 많이 번역되어 출간되고 꾸준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그녀의 글쓰기는 청아한 문제와 세련된 감성 화법이 특징이라고 한다. 동화부터 성인소설까지 다양한 작품을 썼고, 수많은 수상도 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일본의 3대 여류 작가라고 불린다고 한다.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 2005년 출간된 단편소설인데, 마흔의 나이에 17살의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싶었다.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켜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온전히 아이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억의 한 쪽에 있던 17살의 자신을 소환해내어 글을 쓴 것일까? 6편의 단편에는 학생들 각자의 특별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머리빗과 사인펜』 다카노 미요는 피부색이 성적 분위기를 풍겼지만, 인상은 베티 붑의 캐릭터같은 앳되고 귀여운 아이였다. 순환 도로변에 있는 라면집에서 교복 차림으로 혼자 만화잡지를 보면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 내가 봤을 때 노는 아이라기보다는 남자를 아는 그러한 분위기를 풍겼다. 몇 번을 라면집에서 마주치고, 나는 미요와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과거 복서를 지망했고, 그 꿈이 무너진 후 방황하다가 육체노동으로 단련했고,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27살의 청년인데, 미요는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나는 집요하게 ‘이야기 좀 하자?’,‘차 한잔하자?’ 등 집요하게 말을 걸었다. 어린아이를 보는듯한 눈으로 미요가 말했다. ‘아저씨 참 집요하네. 아저씨 주소를 가르쳐줘 내가 찾아갈 테니까.’
미성년, 여성, 남성, 섹스와 같은 요즘 한참 사회적 문제가 되는 조건만남을 생각하면 오산이다. 나와 미요와의 사이에서 권력과 성 주도권을 가진 쪽은 미요이다. 상냥한 부모님과 평균 이상의 생활을 하며, 크게 문제도 없고 불량학생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서른 명쯤을 만난다는 미요는 나에게는 좀 더 오래 관심을 두었으나, 반년이 가기 전에 싫증을 냈다. 미요에게 중독된 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비굴에 매달리거나 협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나를 미요는 경멸하듯이 한마디 내뱉는다. ‘집요하네’
6개의 단편 중 가장 마지막에 정말 짧게 쓰인 단편이지만 나에게 남는 여운은 매우 크다. 나는 인간이 가지는 인생의 최대 목적이 ‘생존’과 ‘번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번식’을 유희로서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번식의 행위는 숭고하다. 서로의 합의로 즐기는 것에 법은 처벌할 수 없다. 실제 지금도 아프리카, 인도, 이슬람문화에서는 14세 이전에 시집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만 그녀들은 자신의 주도가 아닌, 가족이나 집안의 거래처럼 팔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성을 매매하는 것을 아주 악한 행위로 본다. 매매의 기준이 무엇일까? ‘돈’을 지급하면 매매일까? 그렇다면 돈 대신 밥을 같이 먹으면 매매가 아닐까? 업계에 영향력 있는 작곡가에게서 곡을 받을 수 있다면 매매일까? 아닐까? 재벌의 배경을 가진 남자를 만나 잠자리를 했지만, 아무런 금전을 받지 않았다면 매매가 아닐까? 사람을 착취하는 행위는 우리는 경멸한다. 노동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하고, 권력과 배경을 이용해 인간의 자존감을 착취하고 말이다. 매매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7살의 여고생이 금전적인 대가 없이 남성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고 다녔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저씨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운 영악한 소녀인가? 아니면, 자기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의 근원적인 쾌락을 추구한 것뿐인가? 나는 오히려 뭐랄까 굉장히 통쾌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꼈다. 일반적인 미성년 성매매의 약자가 아닌, 그런 지저분한 범죄가 아닌, 미요의 행동에서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