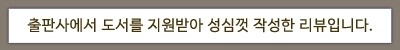-

-
디칸카 근교 마을의 야회 ㅣ 을유세계문학전집 116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 고골 지음, 이경완 옮김 / 을유문화사 / 2021년 11월
평점 :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 고골」 1809년~1852년, 제정 러시아 시절 극·소설작가. 그는 작품 속에 당시의 러시아 현실, 특히 지주 사회의 도덕적 퇴폐와 관료 세계의 결함과 부정 등을 예리한 풍자로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훗날의 러시아 문학과 연극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등 러시아 대문호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러시아 제국의 수도인 페테르부르크의 도시와 귀족들을 허영에 찌든 속물들이라 비판하였다. 유럽을 선망하여 프랑스어를 쓰던 당대의 러시아 귀족들을 비판하였다. 괜찮은 시골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였으나, 인맥과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현실에 좌절한다. 이후 이런 마음과 우크라이나 농민의 현실과 설화를 바탕으로 쓴 『디칸카 근교 마을의 야회』로 일약 문단의 총아로 떠오르게 된다. 당대의 문호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칭찬하면서 그와 친분을 가지게 된다.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의 명성에 가려져 왔었지만, 러시아 문학을 연구할수록 고골에 빠져드는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그의 문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후배 도스토옙스키는 고골의 작품에 빗대어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라며 매우 칭송하였다. 1836년 『코』, 1842년 『외투』 등은 무능하고 위선적인 관리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소설이라 하겠다.
『디칸가 근교 마을의 야회』 지역의 민담과 설화, 마녀와 악마, 인간의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다룬 소설이다. 소설 이전에 『간츠 큐헬가르텐』이라는 시집을 내었으나, 문단의 악평을 받으며 호되게 당한다. 250부도 팔리지 않은 것을 보며,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알았으리라 생각된다. 단편집으로 1부와 2부로 구성되고, 낭만 문학을 좋아했지만, 그의 재능은 시대를 꿰뚫어 보고 풍자하는 글쓰기이다. 이번 ‘을유세계문학전집 116’은 고골을 세상에 알린 단편집과 전성기의 작품 『마차』, 그리고 6년간의 로마 생활을 하면서 써낸 말년의 작품 『로마』를 싣고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과 톨스토이의 ‘부활’, 고골의 ‘코’ 올해 읽은 러시아 문학이다. 세 명의 작가에게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건 제정 러시아 시절의 빈곤한 농민들의 삶이었다. 당대의 양심 있는 지식인이자, 중산층, 귀족인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비현실적인 삶을 지켜보고, 지주 계급을 비판하고, 농민을 계몽하여 그들을 구하고 싶었을 것이다. 실제 대귀족인 톨스토이는 말년에 농민의 삶을 살겠다고 가출하였다가 폐렴에 걸려 사망하고 만다. 200년 이후 러시아에서는 이들을 능가하는 작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누군가의 말처럼 천재는 시대가 만들어 내는 것인가?
제정 러시아의 작가들 특히 고골의 작품을 읽으면 우리 사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수사와 기소를 많은 수장이, 자신의 정치 욕망에 본연의 업무를 망각했을 때, 피라미드의 아래쪽의 경찰과 검사들은 200년 전 러시아의 관리들만큼 무능하고 부도덕해졌다. 30년 전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치며, 탈주극을 벌인 범인들이 있다. 강도와 강력범죄자들이지만 세간은 그들을 옹호한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자신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전씨 때문이었다. 사망하는 그날까지 전씨의 형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다. 양심 있고, 본연의 일에 전념했다면 가능했을 일일까?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세계뉴스가 있다.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미국은 참으로 위험한 국가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2011년까지 기네스북에 등재된 단일범이 가장 많은 총기 살인을 저지른 것이 대한민국의 순경 우범곤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의령 총기 사건으로 불린 이 광란의 밤 96명이 사상을 당했고, 62명이 사망했지만 출동한 기동대는 겁먹고 숨어있었고, 현장지휘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당시 정권의 수장인 전씨는 순식간에 사건을 덮어버렸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들은 그날의 고통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단 하나의 위령비도 없이 말이다. 40년의 세월 동안 국가의 그 누구도 그들을 알지도, 돌보지도 않은 것이다. 이러한 세상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고골과 같은 대문호가 날 수 있을까? 라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