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좀머 씨 이야기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음, 유혜자 옮김, 장 자끄 상뻬 그림 / 열린책들 / 1999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좀머 씨 이야기.
장 자끄 상뻬의 <인생은 단순한 균형의 문제> 라는 그림책을 보고 다른 책에도 관심이 생겨 찾아보다가
알게 된 독일 소설이다.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마을의 희한한 좀머 아저씨를 보며 성장해가는 이야기다.
<향수>의 작가
파브리크 쥐스킨트와 아름다운 장 자끄 상뻬의 그림이 어울려 묘한 분위기를 준다.
동화책 같은 표현과 여전히 가만히 바라보게 만드는 아름다운
그림 덕분에 기분 좋아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먹먹해지는.
가느다란 금발의 여린 얼굴, 유행에 한참이나 뒤떨어진 낡은 스웨터 차림.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남자.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 상 받는 것도 마다하고, 인터뷰도 거절해 버리는 기이한 은둔자.
이 사람이 바로 전 세계 매스컴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작가
파트리크 쥔스킨트이다.
좀머 아저씨의 유일한 한 마디
'그러니 제발 날 좀 내버려 두시오!'
작가 소개 부분에서 작가가 은둔자로 유명하다는 걸 보고 난
이후로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꼭 작가가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차 안에서 우박이 엄청나게 쏟아져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인데.
그걸 표현한 그림이 왠지 너무 예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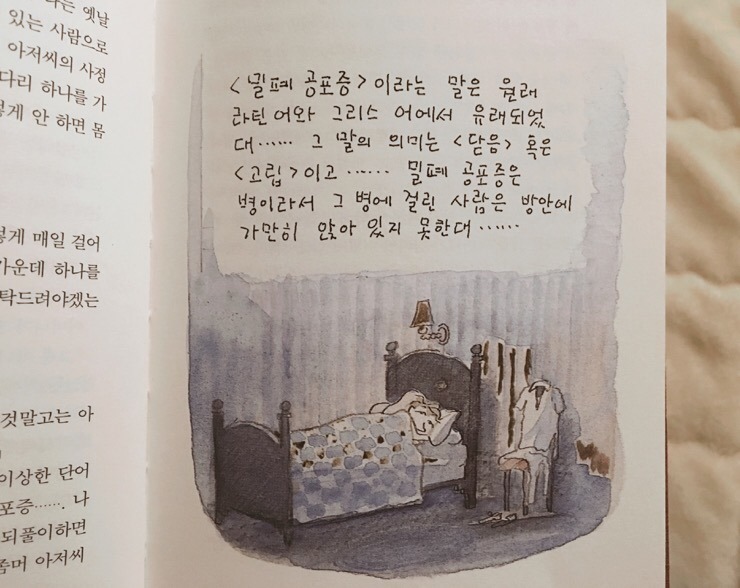
p.42
나는 괴상한 그 새 단어와 그것에 얽힌 모든 것들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다. 그런 다음 나는 좀머 아저씨가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강요도 받지 않고 있으며, 단지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내가 나무를 기어오를 때 즐거움을 느끼듯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모두 자기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좀머 아저씨는 밖에서 걸어 다니는 것뿐이고, 거기에 다른 설명은 필요치 않은 것 같았다.
좀머 아저씨는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걸어 다니기만 한다.
밀폐 공포증이니 뭐니 수군대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주인공은 좀머 아저씨는 그저 자신이 나무를 타는 것처럼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동화 같고 순수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p.58
나는 언덕을 내려가 집으로 향했다. 숲 가장자리에 다다라 무심코 윗마을로 향하는 길을 쳐다보았을 때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날 내가 굉장히 천천히 걸었던 것 같다. 그 자리에 서서 몸을 돌려 내가 방금 걸어왔던 구부러진 언덕길을 쳐다보았다. 초원에
햇빛이 충만하게 넘쳐흘렀다. 풀 사이로 바람 한 줄기도 불지 않았다. 풍경이 마치 그대로 굳어 버린 것 같았다.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집에 가는 길에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 며칠간을 행복감에 둘러싸여 있던 주인공은 완벽하고 달콤한 산책길을 계획하며 함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여자아이의 한 마디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날씨마저 완벽했던 그날의 소풍을 뒤로하고 집에 가는 길의 풍경은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버린다.
가장 예뻤던 장면. 여자아이의 한 마디 때문에 풍경이 굳어버렸다고 하는 표현도, 그다음 장에 나온 저 삽화도.

p.94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싹 가셨다. 웃기는 짓거리 같았다. 난 내가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 그까짓 코딱지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그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했던 내가 불과 몇 분 전에 일생을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보지 않았던가!
피아노 선생님에게 혼난 게 억울해서 나무에 떨어져 자살할 생각을 하는 주인공.
자살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자신에게 미안해하고 후회할
거라는 상상을 하며 즐거워한다.
나도 어릴 때 한 번쯤 해본 짓이어서 피식거리면서 본 장면.
것보다 잠깐 누워서 잠을 청할 수도 없을
정도로 쫓기듯이 걸어가는 좀머 씨의 사연은 뭘까.
주인공은 그 좀머 씨를 보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는다.

p.98
좀머 아저씨는 가끔씩 사람들 눈에 띄기는 하였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세월 다 보낸 사람이었다.

p.116
그것은 나무 위에서 들었던 그 신음 소리와 빗속을 걸어갈 때 떨리는 입술과 간청하는 듯하던 아저씨의 말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또 다른 기억은 좀머 아저씨가 물속에 가라앉던
모습이었다.
가슴 먹먹해지는 글과 삽화로 결국 끝이 나버린 좀머 아저씨의 이야기.
매일을 뭔가에 쫓기듯 걸어 다니던 좀머 아저씨는 결국
독자들에게도 자신을 가만 놔달라며 아무 말없이 물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주인공은 그냥 내버려달라는 좀머 아저씨의 말을
지켜주었다.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먹먹해지는. 그래서 뭔가 잔잔한 여운이 남는 좀머 씨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