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그러면 아비규환]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아비규환]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안 그러면 아비규환
닉 혼비 외 지음, 엄일녀 옮김 / 톨 / 2012년 8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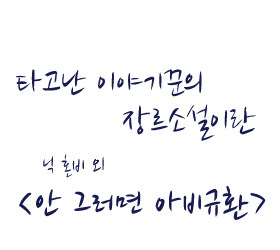
‘진짜, 아, 정말이지 이딴 것보단 훨씬 나은 소설이 분명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의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 영미권 장르소설이라고 해서 간호사 로맨스물부터 떠올리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반기를 들자. 이제부터 승부다.
영미권 현대 장르작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서 한 데 뭉칩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설이 통속적이지만, 어떤 의미로는 전혀 통속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거의, 최초의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의기투합합니다. 그 결과 탄생한 짧은 이야기들은 1930년대 펄프픽션의 느낌에 이릅니다. 마치 미국 최초의 펄프매거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 같은 모습으로, 장르소설이 꽃피웠던 50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숭고한 몸부림으로, 소설집 《안 그러면 아비규환》이 세상에 나옵니다.
한 권의 책 안에 거친 느낌의 단편 20편이 담겨 있기 때문인지, 소설집 《안 그러면 아비규환》은 굉장히 빡빡한 느낌입니다. 서로 자신의 이야기가 더 재미있다는 듯 호객행위를 하며 아우성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매 이야기마다 도입부터 과장된 손짓으로 독자를 유혹하고 어깨에 힘을 줘가며 으스댑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독자를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이런 경쟁을 지켜보는 것은 꽤 즐거운 일일 겁니다. 작가마다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며 강렬한 불꽃을 뿜는 이야기를 선보이는데, 너무나 색이 강렬해서 마치 흰 종이 위에 잉크가 그대로 배어나와 글자들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작품들은 장편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내러티브와 독특한 소재를 보이며 긴 여운을 만들어 냅니다. 그런 단편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독자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아, 이야기들 사이의 피를 말리는 경쟁에서 거칠게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들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이야기도 있어 보여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건 마치 주식시장 같습니다. 널리 알려져 상한가에 치달은 작가의 글은 이제 볼만큼의 재미를 다 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글은 이 소설집 안에선 내리막을 걷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상장되었거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하한가에 치달은 작가의 글은 오히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뜻하지 않았던 행운, 수익창출, 대박, 인생역전. 아무튼 이 같은 소설집을 통해 듣도 보도 못한 작가의 글을 소개받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론 닉 혼비, 댄 숀, 글렌 데이비드 골드, 크리스 오퍼트, 에이미 벤더의 글이 보인 색깔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자, 내가 지금부터 무척이나 심장근육이 쫄깃해질 이야기를 할 터이니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 하는 식의 말을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내비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게걸스럽게 손에 침을 묻혀가며 책장을 넘기고선 다음 장의 이야기를 계속 읽는 것 말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도록 독자를 몰아가는 서술 기술들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타고난 이야기꾼의 단편 장르소설이란, 바로 이런 걸 두고서 하는 말인가 봅니다.
이제 대충 결말이 어떻게 되겠구나 짐작할 텐데, 난 상관없다, 그래봤자 당신은 그애의 이름만 아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섹스에 이르게 됐는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섹스를 하게 됐나가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안 그러면 아비규환, 11쪽)
서커스단의 재정은, 긴긴 겨울밤 소품 담당자가 불길을 살리기 위해 고체연료 찌꺼기에 던져 넣는 우랄 산맥 산 허브 조합만큼이나 불가사의하고 중독성이 강했다. 대출과 환매와 예상수입에 근거한 계약 및 역재구매 합의서 등이 있는데, (…) 그 부채를 갚을 길이 없었다. 그에게 있어 경제적 신용이란 현대문명의 초석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 그의 신념이 동물들의 기본적 고결함에 대한 거의 신뢰와 어긋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경우와 같이 그 두 신념이 상충하게 되자 그 불화와 알력 때문에 속이 상했다. (스퀀크의 눈물, 다음에 일어난 일, 380쪽)
“세상에 귀신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네.”
“나도 알아.”
“죽음이란 인식이 종료되고 세포가 부패한다는 것을 뜻하지. 사후를 상상한다는 것은 몹시 끔직한 개념이야. 불멸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와 수많은 미신의 공통분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네의 말을 믿네.”
“어쩌면 내가 미친 걸지도 몰라.” (척의 버킷, 507쪽)
동반자살을 저지르는 커플은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연인 격으로 쳐주지만, 정확히 똑같은 시간에 서로를 살해한 커플은 온갖 신문에서 미친듯이 기사로 내보낸다. 가족들조차 헛기침을 하고 되도록 짧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들은 길고 복잡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싶어 했다. 나는 수없이 탐문수사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역겨움과 우월감을 감지했다. 하지만 내게는 아름다워 보였다. 종국에는 두 사람이 궁극적인 양보의 몸짓을 이루었음을, 자신들의 결합이 완벽한 원을 그렸음을 끝내 깨달았으니 이 얼마나 적절한가. 칼이나 독약보다 더 잔인하게 두 사람을 죽인 것은 필경 그 달콤하고도 쓰디쓴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소금후추통 살인사건, 542쪽)
어쩌면 우린 모두 장님이다, 마음의 눈으로도 한눈에 모든 것을 보지는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는다, 다만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좀더 빨리 죽을 뿐이다. (어둠을 잣다, 6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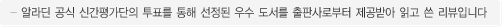
크롱의 혼자놀기 : http://ionsupply.blog.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