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끝이 바다에 닿으면
하승민 지음 / 황금가지 / 2023년 8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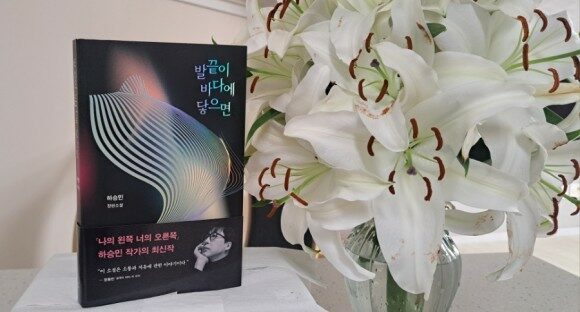
오늘따라 고양이 루키가 내 주위를 맴돈다. 오전에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오랜만에 봐서일까. 내 옆에서 냥냥거리다가 무릎 위로 펄쩍 뛰어올랐다. 내 무릎이 그리 편하지 않아서 그런지 금방 내려가 버린다. 루키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특별히 대답하진 않았다.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늘 이렇다. 고양이들이 냥냥거릴 때마다 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항상 궁금했다. 동물의 감정을 읽는다는 사람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믿기 어려웠다. 눈물까지 흘리니 더욱 그랬다. 사기꾼 같았다. 그럼에도 동물의 언어를 인간이 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그들의 감정을 읽는다면 정말 육식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승민 작가의 신작 소설 <발끝이 바다에 닿으면>에는 고래가 내는 소리를 인간의 언어로 변환시키는 커뮤니케이터라는 기계가 나온다. 완성체는 아니고 주인공 성원이 아내 승희의 연구를 이어 계속하는 와중에 고래 ‘이드’를 만나 커뮤니케이터로 번역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나처럼 반려동물과 소통하고 싶어서 기계를 만들고 실험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이번 소설은 심오했다. 작가의 데뷔작이 아주 강렬한 장르물이었기에 이 소설도 미스터리하고 하드코어한 작품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니었다.
순전히 내 오해였다. 신간 소개를 대충 읽었던 것이다. 내 맘대로 미스터리한 내용일 거라 기대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분량의 3분의 1이 지나도록 등장인물 소개만 이어지는 게 아닌가. 다시 작품 소개를 읽어보았고 명백한 내 오독임을 확인했다. 이번 소설은 SF장르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는데 각기 다른 일을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따로 진행되다가 소설의 절반 즈음에 이르러서야 접점이 생기고 비로소 몰입을 돕는다. 소설 중반 이후부터 돌마가 무사히 히말라야를 넘고 이드와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하게 만드는 쫀쫀한 구성이 펼쳐진다.
이 책으로 작가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빌드업을 제법 길게 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승민 작가의 스타일이라 여길 것이고, 줄거리와 작품 소개를 자세히 읽은 독자라면 나처럼 오해하지 않고 천천히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성원은 과학자이며 울성이라는 동해안의 어느 가상도시에서 일본학자 유코, 미국학자 퍼시와 함께 고래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해 모였다. 가상도시 울성은 마치 김정한의 소설 사하촌처럼 대대로 위정자들의 놀음터로 이용만 당한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울분에 차있다. 늘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어떤 계기만 주어진다면 화르르 타오를 것 같은 상태다. 그러한 인물로 그려지는 사람이 뱃사람 석기이고 해풍호로 조업을 하고 있다. 울성 앞바다에서 고래를 두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대치중인 두 그룹이 해풍호와 유자호다.
또 다른 그룹으로는 목숨을 걸고 전 세계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다니는 현지다. 그는 히말라야를 넘는 티베트 사람들을 찍으려고 가이드 쿠날과 함께 인도에서 티베트로 이동 중이다. 선배 성원과 종종 통화를 하는데 티베트에 가기 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성원은 고래 이드가 발화한 티베트어의 단어 의미를 현지에게 물어봤고 현지는 이드가 언급한 소녀 돌마를 기적처럼 만나게 된다. 울성에서 직선거리 2500km에 살고 있는 돌마는 이드와 소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통 서평을 쓰면서 줄거리를 길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번 소설은 등장인물 소개부터 길다. 어떤 인물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하지 않은 채 줄거리만 간단 소개하기엔 힘들어서 이렇게 길어져버렸다.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욕심을 좀 부린 것 같다. 종을 넘어서는 소통과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짧은 생을 가열차게 살았던 승희가 뿜어낸 언어에 대한 사고를 성원이 이드와 대화를 하며 깨닫는 계기가 된다. 마지막에 성원은 임사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승희를 만나 그녀와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 부분이 가장 SF적이다.
한편 중국의 티베트 탄압과 인권문제(우리나라 현대사 포함)를 현지와 티베트 소녀 돌마를 통해 펼쳐낸다. 다루기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큐 영상을 찍는 현지의 눈을 통해 그곳의 혹독한 자연과 정치적으로 억눌려있는 첨예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동물의 언어를 번역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도 물론이겠으나 티베트 문제는 심층 조사가 힘들었을 것 같다. 울성이라는 가상도시는 장생포구가 있는 울산이 연상되는데 석기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인간 부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이 책의 주제는 독자마다 다르게 찾을 수 있다. 등장인물 분류를 셋으로 했듯 각 부류의 인물들이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이다. 독자가 책을 읽는 시점에 신경 쓰고 있는 사안이 무엇이냐에 따라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나는 성원과 승희의 관계와 대화에 집중해서 읽었다. 승희의 몸은 없지만 성원은 그녀의 언어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가 연구하는 것이 그녀가 하던 것에서 이어졌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12살, 처음 봤을 때부터 승희는 반짝반짝 빛났다. 대학생이 되어 다시 만났을 때도 여전했고 “다 덤비라고 해”라며 거침이 없었으며 자신의 연구에 자부심이 있었다.
아래 인용은 모두 승희의 말이다.
p.269
승희는 언어가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도구라고 했다. 육천 개로 쪼개진 언어의 기원은 하나일 거라고. 생명체에 내재된 언어 창조 체계를 이해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고 했다. 그 꿈을 위한 커뮤니케이터였다.
p.337
언어는 창조야. 언어는 사고의 기준이야. 스스로를 정화하는 주문이면서 상대를 조종하고 상처 입히는 무기이기도 해. 의미의 집합이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체계야. 언어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도구야. 기억해 인간은 언어야. 살아있는 모든 건 언어야. 우리는 전체의 부분이고 언어는 세계의 파편이야. 우리는 언어야.
p.347
난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내. 여기서도 웃고, 여기서도 농담을 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해 하지만 네 몸은 아직 바다에 있어. 돌아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 옳은 일을 해. 지지마. 하지만 즐겨. 웃고 울어. 감정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있는 힘껏, 살아. 나는 나를 부르는 곳에 있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는 있어. 네가 부르면 내가 있을 거야. 발끝이 바다에 닿으면 나는 널 만날 거야.
승희의 무덤앞에서 성원은 장인과 만난다. 그녀의 기일이었다. 성원은 승희를 만났던 일을 장인에게 들려준다. 사내 둘은 국밥을 앞에 두고 술잔을 기울이며 꺼이꺼이 울 수밖에 없었다.
p.371
사람의 마음에도 해일이 일고 지진이 난다. 태풍이 불고 땅이 뒤집어진다. 성원은 오랫동안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연구만 생각하느라, 사람이 아닌 것들만 생각하느라 사람을 잊고 지냈다. 이제 겨우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승희는 세상에 없고 장인은 울고 있었다. 뭘 어찌할지 몰라 성원은 그저 무릎 위에 얌전히 손을 올렸다. 한 교수가 썩은 것들을 게워 낼 때까지, 문드러진 상처에 새 살이 돋을 때까지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봤다.
그 바다에서 성원은 승희와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또 다른 사람, 장인에게 일련의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승희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위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