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소한의 이웃 - 허지웅 산문집
허지웅 지음 / 김영사 / 2022년 8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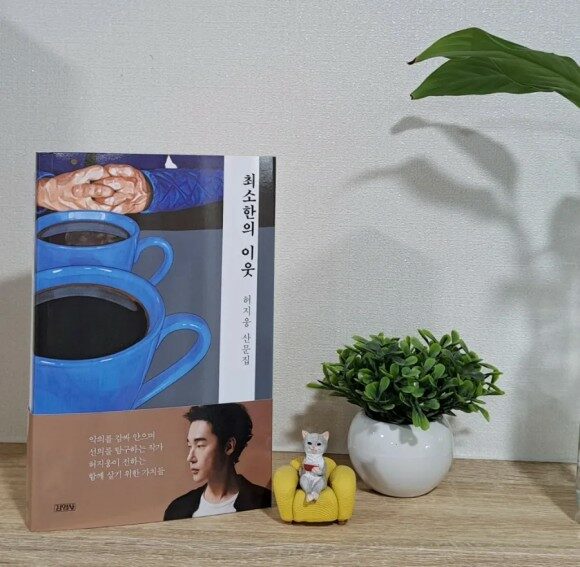
허지웅의 글은 <살고 싶다는 농담>으로 처음 만났고, <최소한의 이웃>으로 두 번째다. 앞부분을 읽다 갸웃했다. 지난 책이 좋아서 이번에 김영사 서포터즈 지원도서라서 신청해서 받아 읽었는데 이전 같은 감흥이 일지 않았다. 절반 정도를 읽었는데 여전해서 내가 썼던 <최소한의 이웃> 리뷰를 꺼내 읽어보았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의 이미지와 차이점을 글에서 발견했고 그의 스타일을 꽤나 맘에 들어 한 기억이 났다.
그럼 이번 책은 왜 다를까? 물론 감동받았던 작가의 모든 작품이 그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무래도 독자의 독서 컨디션이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한다. 독자가 그 책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당시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화두가 무엇이었나에 따라 감상의 폭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번 책의 주제는 작가의 말에 나와 있는 대로 이웃을 향한 분노와 불신을 거두고 나 또한 최소한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는 것이다. 공감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웃과 교류가 없어서일까? 꼭 옆집 사람만을 이웃이라 지칭한 것이 아님은 안다. 그럼 나는 주위 사람들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걸까? 소설 속 인물들에는 관심이 많은데... 몸은 현실에 있지만 머릿속은 가상 세계를 헤매기 때문일까??
이리저리 머릴 굴려보다 책으로 다시 돌아갔다. 한 눈에 들어오는 문장은, 책의 중간 중간엔 사이즈를 줄이고 조금 두터운 질감의 내지에 메모하듯 프린트된 문장들이었다.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에는 한 바닥 혹은 두 바닥 정도로 짧은 글이 20편 이상 실려 있다. 각 글의 소재는 우리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뉴스에 실린 각종 사건 사고들, 작가의 일상 속 일들이다. 이런 간단한 일화 소개 후 마지막에 작가의 단상을 다는 형식이다. 독자가 그와 유사한 경험이 있거나 접해 본 기사라면 공감하며 읽을 수 있고 작가의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 나는 그 단상에 살짝 거부반응이 들었다. 너무 교훈적으로 마무리 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언뜻 평범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이런 짧은 글을, 이렇게나 많이 모아서 책으로 내다니, 역시 작가라서 가능한 거구나 싶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썼던 전작 리뷰를 찾아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고 싶다는 농담>에서 발췌해두었던 문장을 다시 옮긴다.
"‘함께 버티어 나가자’라는 말을 좋아한다. 삶이란 버티어 내는 것 외에는 도무지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평정심과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밝은 눈을 갖게 되기를.“
다시 <최소한의 이웃>으로 돌아왔고 끝까지 읽고 보니 위 인용문의 해설서가 <최소한의 이웃>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p.128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이 거창한 게 아닐 겁니다. 꼭 친구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같은 편이나 가족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해받고 싶은 만큼 남을 이해하는 태도, 그게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의 전모가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p.252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매진하고 있는 모든 이를 떠올리며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당신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p.303
고통에 잠식되어 있을수록 눈앞의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희망이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
고통이 있으면 거기 반드시 희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평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평정을 찾아 희망에 닿기 위해선 이미 벌어진 일에 속박되지 않고 감당할 줄 아는 담대함, 그리고 타인을 염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찾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다만 잠시 희미해졌을 뿐입니다. 나의 일을 감당하고 남의 일을 염려하다 보면 반드시 평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 이렇게 짧은 글 한편 정도야 나도 쓰겠다며 허장성세 부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허나 이토록 밝은 눈으로 세상에 귀 열고 분주히 글을 써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허지웅 작가의 글을 후루룩 읽은 후 밥 뜸을 들이듯 잠시 포즈 상태를 유지해보자. 내 모습이 어떤지, 최소한의 이웃이 되려면 나는 어떠해야 할지 눈 감고 그려보자. 어떤 이웃이 될지 안 떠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글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담백함이었다. 두 번째 책으로 만나니 짱짱함을 느꼈다. 그런데 그는 오랫동안 휘둘리며 살았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의와 상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를 믿어선 안 됩니다. 당신은 달랐으면 합니다. 당신이 충분히 많이 읽고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구분할 수 있는 맑은 눈과 밝은 귀를 갖는 데 행운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는 옛날 드라마를 보며,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고맙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자취를 감췄다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스스로를 평가하게 만드는 이야기들만이 남았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했다.
또 “어렸을 때는 새해가 오는 것을 매우 기뻐했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 모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과거시험 문제를 낸 왕을 불러온 후 어린이날이 오는 걸 손꼽아 기다렸던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누군가에게 별 의미 없는 휴일이지만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볼 여유와 평정을 찾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꼭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어린이날이 될 거란다.
그의 짧은 글은 이런 저런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도록 만들었다. 이 책은 단번에 다 읽는 것보다는 한 두 꼭지의 글을 읽은 후 생각을 정리해보거나 글을 써보기를 추천한다. 날 지키는 파수꾼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전에 내가 이웃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자. 또 이웃의 범위를 길고양이, 집 근처 하천 등 사람을 너머 생태 전반으로 확장시켜야겠다.
**위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