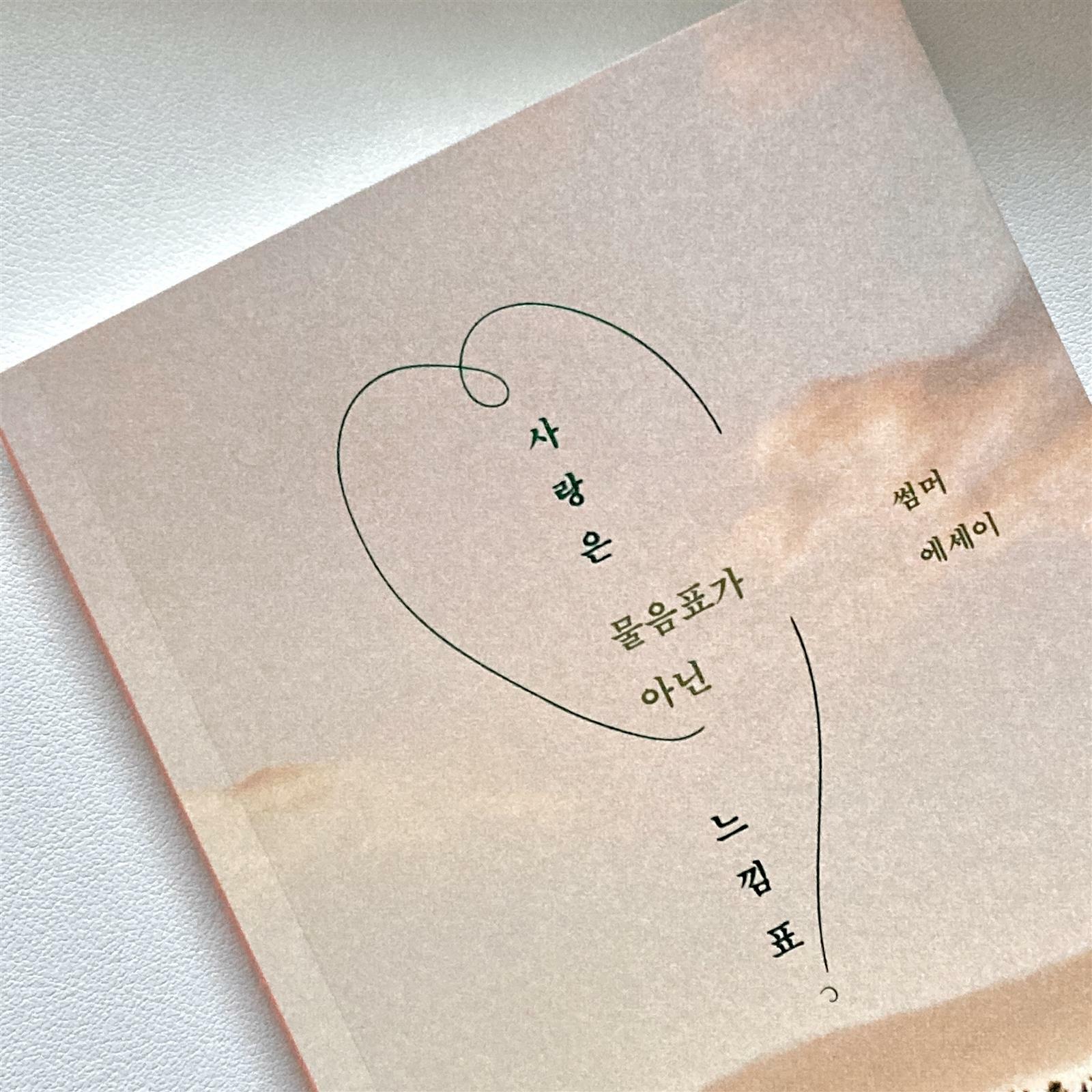
참 밝고, 예쁜 글이었다. '밝다', '예쁘다' 라는 수식어를 진심을 담아 썼던 게 언제였더라. 이렇게 예쁜 생각을 하시는 작가님이 어떤 분일지 무척 궁금해졌다. 문장과장면들 서포터즈 첫 도서니까 다음 책에서 또 작가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디오가 듣고 싶은 날>을 읽으면서 '텐텐클럽'을 보자마자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다. 작가님처럼 나도 라디오를 들으며 기나긴 야자시간을 보냈다. 딱 고3 때, 내가 좋아하는 이석훈님이 '텐텐클럽' DJ을 맡으셨다. 한시간 정도 듣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텐텐클럽이 10시부터였는데, 그럼 나 11시까지 야자했나? 대단한 걸?
요즘들어 문득문득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나는,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포개질 수 있다는 건 꽤 근사한 일이었다".(p. 123) 라는 문장에 약간의 용기?를 얻었다.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글을 쓰지 안 았던 이유, 핑계가 내 이야기를 누군가 아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물론 나의 완벽주의와 한 세트인 귀차니즘이 가장 큰 이유지만. 내가 이 책을 읽고 공감을 하듯, 누군가도 나의 이야기를 읽고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호기심이 조금씩 움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