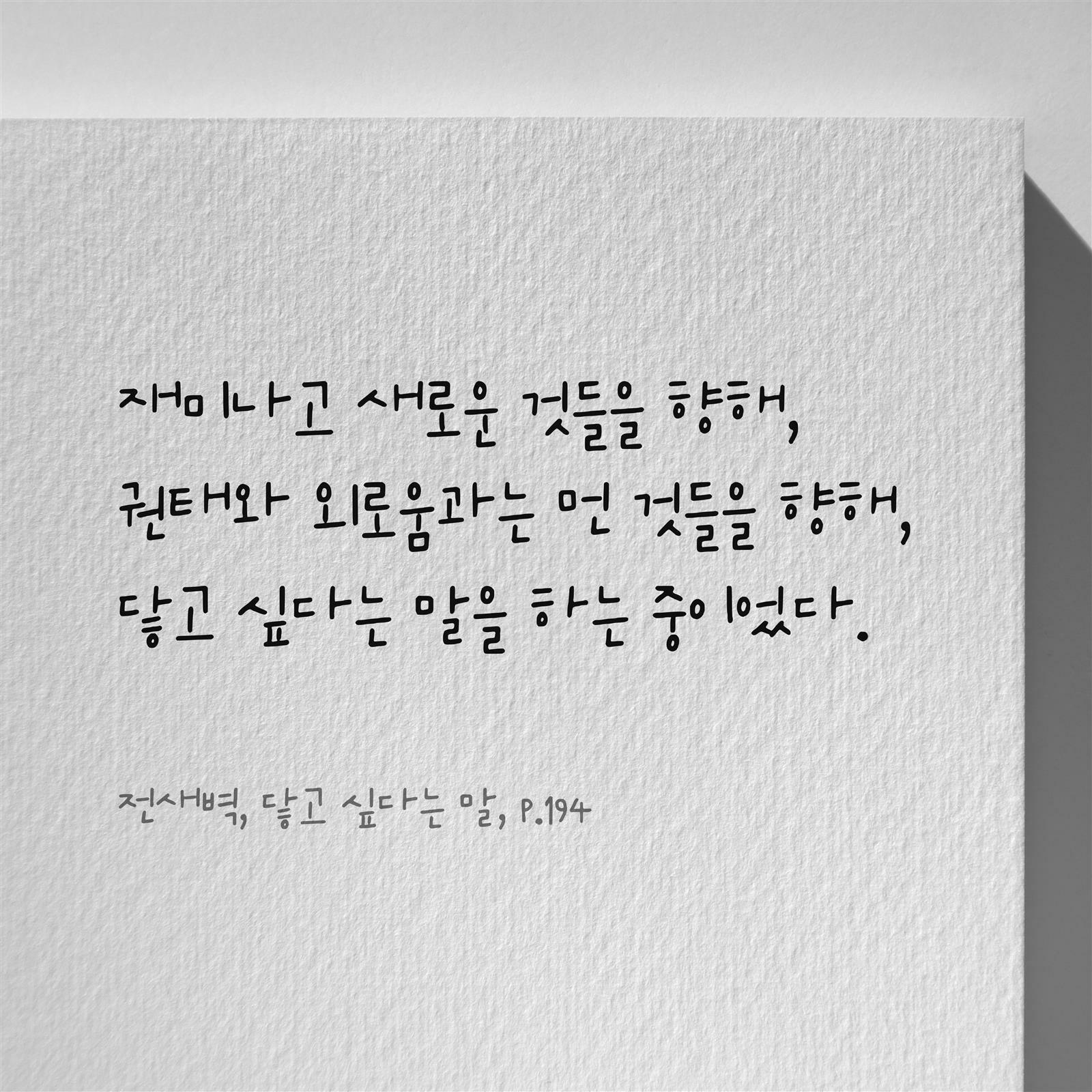재밌게 읽었다. 말 그대로 재미있었다(책이나 영화를 보고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정말 재밌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솔직한 작가님이 있었나 싶다. 본인의 병, 연애 경험, 결혼 생활까지 적나라하다 싶을 정도로 솔직했다. 물론, 덕분에 격공하면서 순식간에 읽을 수 있었지만.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잘 쓸 수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했다. 곤란하다. 이렇게 말 맛이 좋은 작가님을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말이지. 이럴 땐 그들의 다른 책들을 다 찾아 읽어보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애정표현이다. 아주 격한.
[닿고 싶다는 말]의 내용 중에 안소현 화가님과의 대화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했다. 화가님은 배낭여행 중 네팔 한 도시에서 햇빛이 정말 좋아서 한 동안 카페에서 햇볕을 쬐며 멍하니 사람 구경을 했다고 했다. 그러자 우울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작가님은 우울하다는 것은 "몸 안에 눈물이 쌓인 상태, 그래서 눅눅하고 곰팡곰팡한 상태, 마음에서 악취가 날 지경인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그럴 땐 "나를 활짝 열고 볕 속에 두는 것, 그저 볕이 치유하게 두는 것, 그 외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p.239)이라고. 이 내용을 읽고 공감한 게, 나도 비슷한 나만의 의식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일명 '해바라기'. 정말 우울의 끝을 달릴 때, 뭘 해도 맘에 안 들고 성질이 날 때, 무작정 나가서 해를 보며 걷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생기가 돈다. 신기하다. 고작 해를 따라 걷기만 했을 뿐인데, 의욕이 생긴다는 게.
전에는 에세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내게 에세이란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험이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에세이는 뭐랄까, '옛다, 위로의 문장이다! 옛다, 이건 격려의 문장이다 받아라!'하며 강제주입 시킨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 '이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한다고?'하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또 읽다 보면 그들의 생각과 위로, 격려의 말들이 '이게 답이야.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런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분명 공감과 위로를 받으려고 읽었는데, 더 우울해지기 십상이었다. '아, 내가 이상한 건가?.',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에세이가 편해졌다. 생각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를 때 오히려 더 찾게 되는 것 같다. 가볍게 슝슝 읽기 좋달까? 요즘 에세이는 막 거창한 말이 없다(이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저 작가님들의 경험과 그 때의 생각들을 적어 놓으셨을 뿐. 그 글을 읽고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것은 오롯이 나의 역할이다. 이젠 이렇게 생각한다. 굳이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대놓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지 않아도, '아, 나도 그런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 생각 자체가 내게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것이 에세이의 힘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