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네 한 바퀴 생활 인문학 - 도시에서 만나는 공간과 사물의 흥미로운 속사정
스파이크 칼슨 지음, 한은경 옮김 / 21세기북스 / 2021년 5월
평점 :




수도꼭지만 열면 콸콸 쏟아지는 깨끗한 물. 비눗물이 흘러가는 하수구. 사시사철 시원하게 유지되는 냉장고. 때 되면 우편함에 도착하는 우편물들. 걷기 편하게 정비된 아스팔트 거리. 봉지에 담아 밖에 내다두기만 하면 알아서 처리되는 각종 쓰레기들까지. 내 일상을 유지하는데는 꽤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있는 게 너무 당연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내게 오는 것인지 잊고산다.
사실 내 주변의 하나하나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을텐데. 문득 내 집에서 편하게 쓰던 물이 하수도가, 전기가, 쓰레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졌다. 물탱크를 청소하거나 온수관을 수리한다고 반나절만 물이 끊겨도 너무 불편하다. 위에 나열된 모든 것들은 내 일상에 필수적인 것들인데 왜 나는 한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싶었다. 국내 저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좀 다를지 몰라도 어느정도 비슷하게 돌아가겠지 싶어서 동네 한바퀴 생활 인문학을 읽어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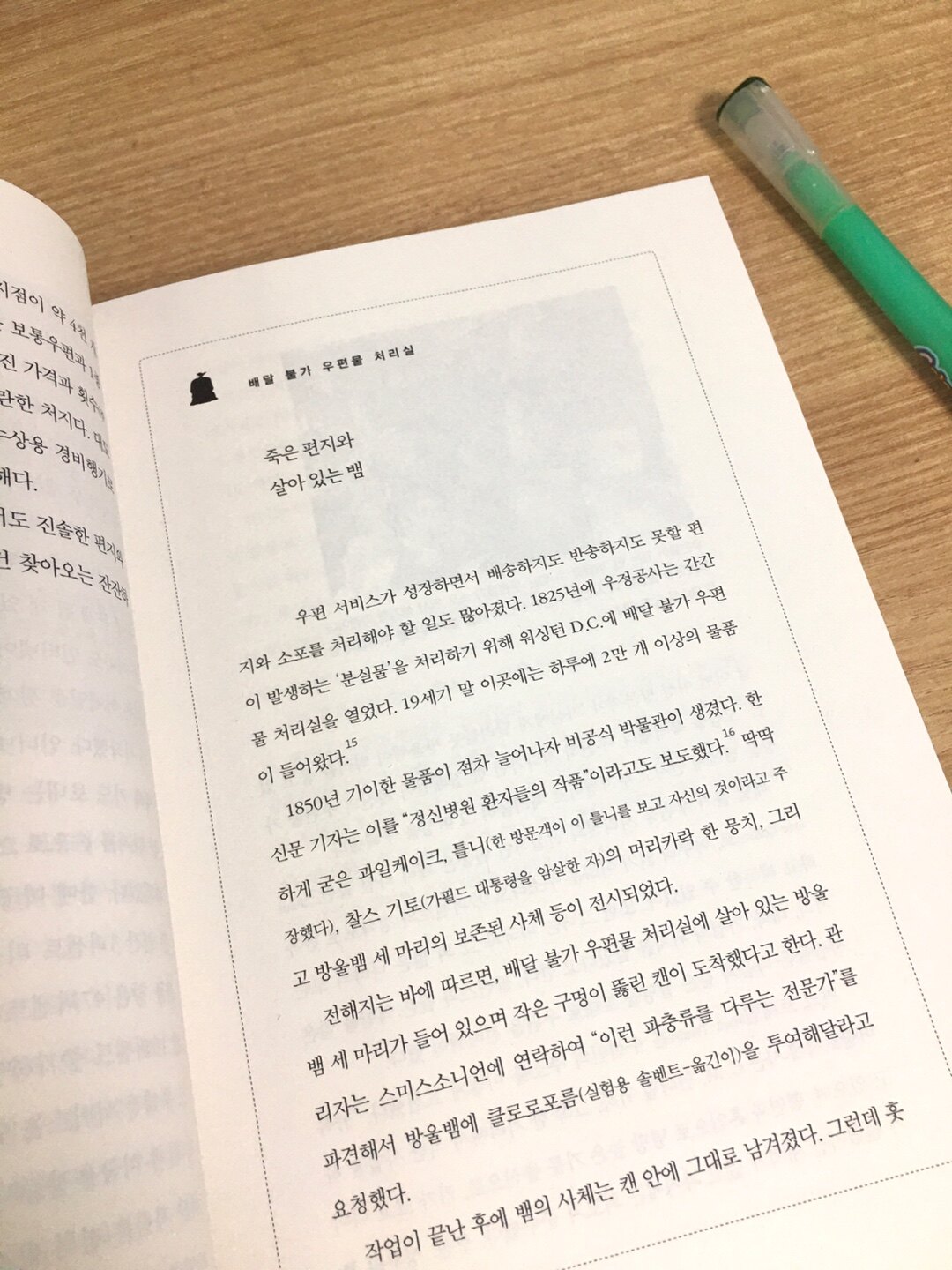
책의 목차는 집안부터 시작해 집밖, 길위, 자연으로 흘러간다. 우리 집으로 오는 전기는 많은 부분 석탄을 태워서 만들어지는데 미국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80퍼센트로 줄이고 2050년까지 100퍼센트 무탄소가 목표라고 하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석탄을 이용한 전기는 사라지겠구나 싶었다.
무엇보다 석탄을 대체할 대체에너지가 어떤 것이 될지는 사실 짐작이 가지 않는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풍력발전소로 모두 대체하기엔 땅이 좁을거 같고 태양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일조량과 면적을 생각해야 한다. 수력발전의 경우 다리를 건설하는데 든 시간이 45년이라고 하니 그것도 막막하고 원자력은 너무 위험성이 크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화석 연료고. 그렇다고 걱정을 많지 하지는 않는다. 티비에서 천재적인 과학적 재능을 타고나는 아이를 보면 미래에 저런 천재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지 싶달까.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 천재들이 모여서 대체 에너지를 잘 개발하겠지.ㅋㅋ
어렸을 땐 편지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인어공주라는 국내 영화에서 여주인공의 아버지도 우체부였다. 섬마을의 우체부였던 아버지와 해녀였던 어머니의 사랑이야기였는데 아버지가 우체부라는 설정이 딱 순박한 사랑이야기에 알맞아보였다. 풋풋했달까. 지금이야 거리에 우체통도 거의 안보이고 손편지를 쓸 일도 없어진지 오래지만 어렸을 땐 친구들이랑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손편지를 주고받는 즐거움도 있었다.
편지는 더이상 받을 일이 없지만 각종 고지서는 지금도 매달 꼬박꼬박 받고있다. 사실 우편함에 들어있는 수많은 고지서들이 주소가 다 다를텐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분류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그 많은 우편물을 다 분류하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겠구나 했는데 알고보니 1종 우편물을 분류하는 건 기계가 하는 거였다. 기계손이 우편물 주소가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컴퓨터가 주소를 읽고 수령인과 주소 우편번호를 확인하고 바코드를 찍는다. 이런 기계가 1990년대 기계들이라니 이미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존재했던 것들이었다.
미국 우체국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었다. 미국 건국 초기 미국의 여러 주는 전혀 통합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기 위해 우체국이라는 바늘이 필요했다. 우체국 서비스는 의견 교환을 위한 공개 토론장을 조성하고,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신문이나 책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했다고 한다. 그렇게 우체국은 빠르게 모임 장소 및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변모했다고. 다만 안타까운 점은 그 시대에 노예들은 우체국에서 일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선언하는 문서를 볼 수도 있어서였다.
이제는 사실 편지를 쓸 일도 받을 일도 거의 없지만 어쩐지 메일도 sns도 아닌 손으로 쓴 편지는 그 자체로 잔잔한 기쁨이 있어서 그런지 길을 걸어도 보이지 않는 우체통이 아쉽게 느껴진다.
그동안 편리하게 사용해 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과 기계의 손을 거친 것들이라는 걸 책을 통해 상세히 알고보니 새삼 내가 감사를 참 많이 잊고 살았구나 싶었다. 세상엔 당연한 게 없는 법인데 너무 익숙해서 어디서 온 지도 모른채 그저 당연하게만 사용해 온 것들이 참 많았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지만 앞으론 길을 가다 하수도 뚜껑을 보면 이 책의 내용이 문득 떠오를 것 같다.ㅎㅎ
출판사에서 무상으로 책을 제공받아 읽고 리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