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버지에게 갔었어
신경숙 지음 / 창비 / 2021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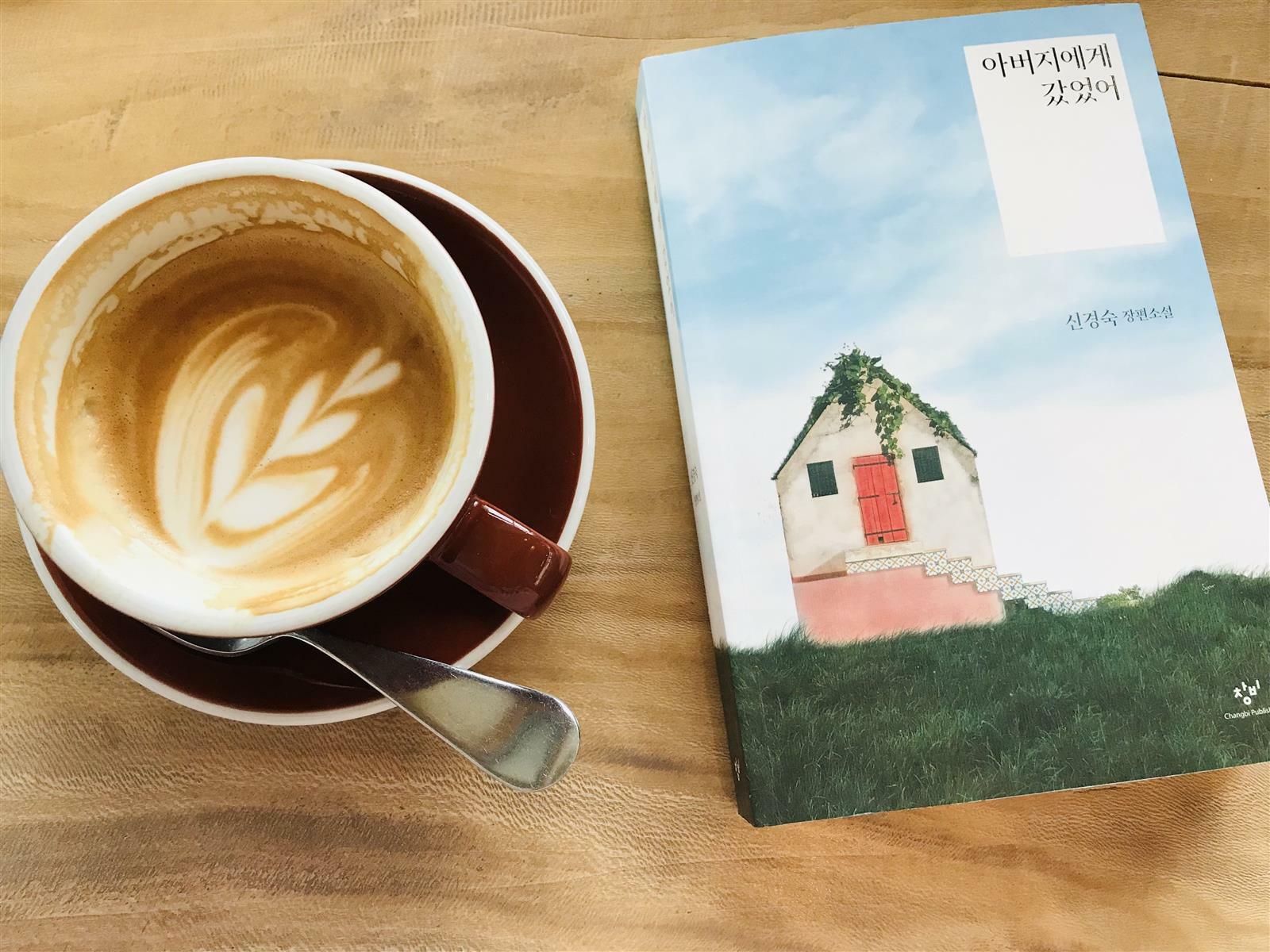
아버지에게 갔었어.
어버이날 전날 밤, 3주간 곁에 두고 조금씩 나눠 읽던 ‘아버지에게 갔었어’를 마저 읽고 잠들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날 아버지에게 갔다. 보통은 나의 어린 시절을 보낸 부모님 댁을 가는 것인데 여동생에게 말할 때에는 엄마 보러 갈 거야.라고 말하곤 했었다. 별다른 의식 없이.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간다.라는 마음이 되어 있었다. 머리맡에 두었던 책의 눈길이 내게 어느 정도 묻어왔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눈길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다.
그 눈길은 아버지가 장롱 위에 올려두고 한 번씩 내려서 기타 교본을 보며 연습하시는 기타를 지나 유튜브를 볼 때 쓰는 돋보기안경에 머물고, 고장 난 물건은 뭐든 고쳐 주셨던 아버지의 도구들로 옮겨갔다. 그리고 요즘 청력이 점점 안 좋아지셨다는 사실과, 몇 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변화에 머물렀다.
밥을 먹는 것보다 내가 몰고 온 차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려고 나가셔서 언제쯤 돌아오실지 알 수 없는 아버지. 카네이션 장식의 케이크는 결국 아버지 없이 엄마 앞에서 초에 불이 켜졌고, 우리 아이들의 손가락은 기다리지 못하고 케이크에 그림이라도 그리듯 생크림을 파먹었다. 아버지 없이 케이크 축하했네요. 아버지는 별 상관도 하지 않으시고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아버지답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버지 답다,라고 해도 될까?
이런 물음이 찾아온 것은 아버지에게 갔었어의 헌의 영향이다.
_너는 갑자기 왜 아버지가 궁금허냐?
아버지 답답하다고 해쌓더마는
세상은 인자 우리들은 다 잊은 것 같던디.
주인공 헌이 오지 않았던 J시, 일생을 J시의 집터에 집을 두 번 허물고 다시 지었을 뿐 다른 곳에 집을 가져본 적 없는 아버지의 집, 그녀가 올 수 없었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무엇이든 잃어버렸다. 그녀가 겪은 지울 수 없는 상실로 인하여 그녀의 일상이 상실로 도배됐다. 아버지를 비롯해 가족 누구도 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방패를 치려고 애쓰며 살아온 헌의 시간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상실의 시간에 곁에 머물게 된다. 잠의 상실, 기억의 상실, 소리의 상실. 그 상실의 곁에서 아버지의 기억의 조각들을 모은다. 상실의 아픔으로 부서지고 깨진 헌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기억들이 부서지고 깨진다. 그녀의 아버지가 겪는 수면장애의 밤,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느라 피로에 절어 혼절하는 상태가 되곤 하는 잠을 잃은 아버지. 자면서도 울고 있는 아버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말해지지 않은 무엇이 아버지 심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헌은 아버지의 살집이라곤 전혀 없이 가볍게 된 아버지의 정강이를 보며 죄송해요.라고 듣지 못할 말을 한다.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속에 가장 큰 것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일 것이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마음 안에 자꾸 고여 드는 더 늦기 전에,
아버지라는 틀에 묶어 생각하면서 그의 심장에 쏘아버렸을지 모를 화살을 뽑아드리고 싶었다.
-작가의 말(신경숙)-
돌아보니 왜 아버지께 무관심했을까. 나 역시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된다. 내게 아버지는 어머니의 남편, 어머니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키우는 아버지, 그 자리에서 바라보았기에 아버지의 욕구와 재능, 관심, 개성은 두렵고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재능과 관심이 가족의 일을 향할 때는 든든하고 고마웠으나, 개인적인 방향으로 향하며 아버지의 부재로 이어질 때는 인정하기 싫고 아버지는 안 바뀌니까.라는 체념과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게 아버지의 심장에 나도 모르는 사이 화살을 쏘고 있었던 나는. 아버지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고통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땅 속에 묻었다.
꽃이 자라고 나비가 그 위를 날아간다.
체중이 가벼운 그녀는 땅을 거의 누르지도 않았다.
그녀가 이처럼 가볍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브레히트의 시(본문 중)-
작가인 헌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그녀는 겨울밤을 떠올렸다. 엄마가 늦게 귀가한 아버지를 위해 내놓은 구운 김이 있는 밥상, 그 앞에 빙 둘러앉은 여섯 남매의 입에 김에 밥을 싸서 차례로 넣어주던 순간, 그녀가 행복을 떠올렸던 기억의 그 겨울밤, 아버지에게 어땠을까? 헌의 아버지는 무서웠다고 했다.
내일 끼니 걱정을 하며 살었을 때, 밥 지을라고 광으로 쌀 푸러 갈 때 쌀독 바닥이 보이는 때도 있었는디. 그 가슴 철렁함을 누가 알까.
자식에게는 행복이었던 기억이 아버지에게 두렵고 무서운 날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충격이었다. 그리고 먹성 좋은 자식 여섯이 무섭기도 하고 살아갈 힘이 되기도 했다는 엄마처럼 아버지께도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힘이 되기도 했을지 헌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개별적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도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를 농부로, 전쟁을 겪은 세대로, 소를 기르는 사람으로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버릇이 들어서 아버지 개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게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자식들이 하나둘 집을 떠날 때마다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인지. 두렵고 무섭지 않은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을는지.
그녀가 느낀 아버지를 모르겠다는 기분. 아버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게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이 내게도 의식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해 여전히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보게 한다. 아버지에게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개별적 인간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뭉뜽그려지고 함몰된 자리들이 얼마나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_별걸 다 기억한다.
_당신 말처럼 나는 별 것이나 쓰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 별것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해요.
그녀의 글에 대한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하는 나는 그 별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해요, 라는 헌의 혼잣말이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살아냈을 뿐이다.
살아냈어야, 라는 아버지의 말과 함께 책을 덮는 그 순간에 동시에 혀 끝에 남는다.
살아가야만 하는 삶과 살아낸 삶.
그 사이 말 수 적은 아버지의 말이 있다.
_매일이 죽을 것 같아두 다른 시간이 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