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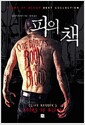
-
피의 책
클라이브 바커 지음, 정탄 옮김 / 끌림 / 2008년 7월
평점 :

품절

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왜 사람들은 끔찍한 것을 좋아할까?’이다. 해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전에 극장가에는 무시무시한 핏빛 영화들이 쏟아지고, 케이블 방송에서는 몇 십 년 전 ‘13일의 금요일’과 같은 소름끼치는 영화를 연일 방송해준다. 서점가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잘한 솜털마저 모두 일어서게 만드는 호러소설이 인기를 끈다.
끔찍한 장면이 많은 추리소설만 보아도 움츠러드는 내가 올해는 공포소설 한 권에 도전해 보았다. 책을 손에 잡으면서 “제목도 참... ‘피의 책’이네...”하며 건장한 남성의 등 뒤로 선혈이 낭자한 책 표지부터 으스스함을 느끼며 즐겁지 않은 기분으로 책장을 넘겼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피의 책’부터 ‘스케이프고트’까지 9편의 끔찍한 중단편의 소설들은 좀 전에 먹은 음식이 다시 솟구칠 것 같은 구역질과 도대체 이 소설을 쓴 클라이브 바커의 정신세계는 어떤 것일까를 궁금해 할 정도로 짜증나지만, 이미 나의 눈 안에 들어온 활자들의 움직임을 쫓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듯 중간에 책장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이다.
클라이브 바커의 많은 호러소설들이 영화화되어 전 세계에 배급 된지 이미 오래고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이 상영되었다. 호러영화를 보러갈 용기는 안 나지만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 싶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는데, 내가 처음 읽게 된 영화평이 아주 재미있었다. 한마디로 혹평이었는데, ‘그게 무슨 호러냐?’였다. 내 생각에 이 영화평을 썼던 사람은 대단한 강심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본다. 몇 컷 안 되는 영화의 이미지만을 본 바로도 영화가 얼마나 끔찍할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
느낌이야 개인차가 워낙 크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못되겠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한 번 나를 비롯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내린 결론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란 것이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즉 기쁜 일을 보며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을 보며 같이 슬퍼하듯이 무서운 것을 보고 같이 무서워하며 기쁨이나 슬픔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코믹영화를 보고 배꼽 빠지게 웃고 나면 내 안에 맺혔던 것들이 해소되는 것 같은 경험은 많이 해 보았을 것이다. 무지하게 슬픈 영화를 보고 머리가 띵해지도록 울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무서운 영화라고 해서, 책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을까?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단, 그 일이 내게 닥치는 일이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