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우스 오브 구찌
사라 게이 포든 지음, 서정아 옮김 / 다니비앤비(다니B&B) / 2021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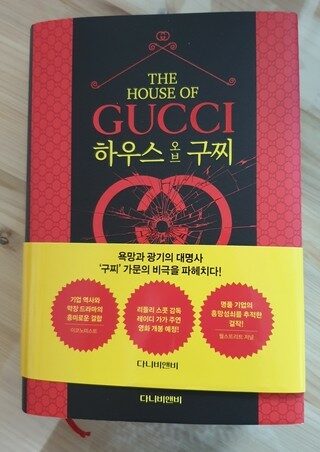
개인적으로 명품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책을 받아보고선 왜 명품을 좋아하는지 조금을 알 것 같았습니다.
고급스런 표지가 시선을 끌었는데 책 표지 속지까지 정성스레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이것이 명품의 장인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의 디자인만으로도 이토록 맘을 설레게 하는데 가방이며 향수 악세서리는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다보니 어쩌면 제 자신이 명품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GUCCI 너무도 익숙한 브랜드지요. 그런데 꽤 오래전 홍콩에 놀러갔을 때 홍콩 달러를 다 쓰고 올 작정으로 백화점인가 마트엘 들어갔는데 떨이상품처럼 나와 있는 구찌 제품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명품이라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망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서 살까말까 고민하다가 가이드가 출발해야한다고 재촉해써 지갑하나 사들고 온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후 부터인가 머릿속에서 구찌가 명품일까 아닐까에 대해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책을 읽다 보니 아마도 마우리치오가 죽고 구찌가 몰락해가고 인수합병이 한참이던 그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책표지에 있는 구찌 연대기와 첫 부분에 제시된 구찌 가문 가계도가 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마우리치오의 죽음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살인사건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라 흥미진진하겠단 기대가 생기다가도 여러 인터뷰 자료를 통해 사실에 바탕을 둔 소설이란 생각을 하니 고인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일단 소설로 읽겠노라 마음 잡고 읽었는데 이탈리아도 우리네 양반 가문 따지듯, 아니면 강남 출신 따지듯 피렌체 사람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이 대단하단 것을 알았습니다. 이래저래 지금의 명품이면 되었지 생각할 듯도 싶은데 100년이란 세월이 허투루 흘러간 것도 아니고, 그 시작이 피렌체 사람이었기에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수 있었나 봅니다.
구찌 가문은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였나 봅니다. 구찌오 구찌가 파산한 집안에서 도피하듯 고향을 떠나 런던 샤보이 호텔에 취직했다가 부자들의 소지품을 눈여겨보고 가죽에 관심을 갖게 되며 구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찌오 구찌의 여러 자식들 중 알도와 로돌포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었는데, 구찌 가문이 구찌를 경영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이었지만 경영 방식에서는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갈등은 그들의 자식대까지 되물림 되었고, 결국 구찌가의 구찌는 몰락 위기에 처하고 새로운 경영자를 만나 회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돈의 양면성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많으면 나누고 없으면 아끼면 될 것 같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욕심 갖게 되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전문 경영인의 중요성을 이제는 알고 있지만 전통 고수, 가업이란 말에 가치를 느끼고 있기에 안타깝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의견의 타협점을 찾아 지혜롭게 운영해 갔더라면 구찌 가문 가계도의 아래부분도 끊임없이 채워져 나갔을 수 있을텐데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다면 소설이 참 재미없었겠다 싶기도 합니다. 갈등이 참 싫지만 재밌는 요소임엔 틀림 없으니까요.
마우리치오 구찌 살인사건 용의자로 잡혀가는 파트리치아의 한껏 치장한 복장을 보면서 닌니 형사는 측은함도 사라졌다고 하였지만 전 되려 측은한 맘이 생겼더랍니다.
리틀리 스콧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 개봉할 예정이라 하는데 영화와 비교해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구찌가문과 관련된 100명의 인물을 만나 인터뷰한 작가의 노력도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앞으로 구찌를 볼 때 뱀부 가방을 볼 때 많은 생각이 떠오를 것 같고 나름 아는 척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것 같네요.
600페이지가 훌쩍 넘는 두께있는 책이지만 가독성이 있어 훌훌 읽으며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명품 책 추천합니다.
* 해당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쓴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