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부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약국 앞에 긴 장사진을 친 장면은 세월이 지나고 다시 이 광경을 보게 된다면 겪지 않은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광경이다. 코로나는 국제 질서도 바꿔놓는다.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전 세계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북미, 유럽의 중심 매체들이 연일 한국을 거론하며, WHO를 포함한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에게 묻고 따라하기 바쁘다. 코로나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굳건하게 유지되던 세계 질서 마저도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자면 서평을 못 쓰지 싶다.
이러한 코로나의 영향력은 출판업계도 피할 수 없다. 바이러스, 위생, 세균, 감염, 전염병과 같은 메인 키워드를 담은 책들이 앞다투어 신간도서에 진열되고 있으니 말이다. 나도 그러한 관심에 편승해서 <세균, 두 얼굴의 룸메이트>를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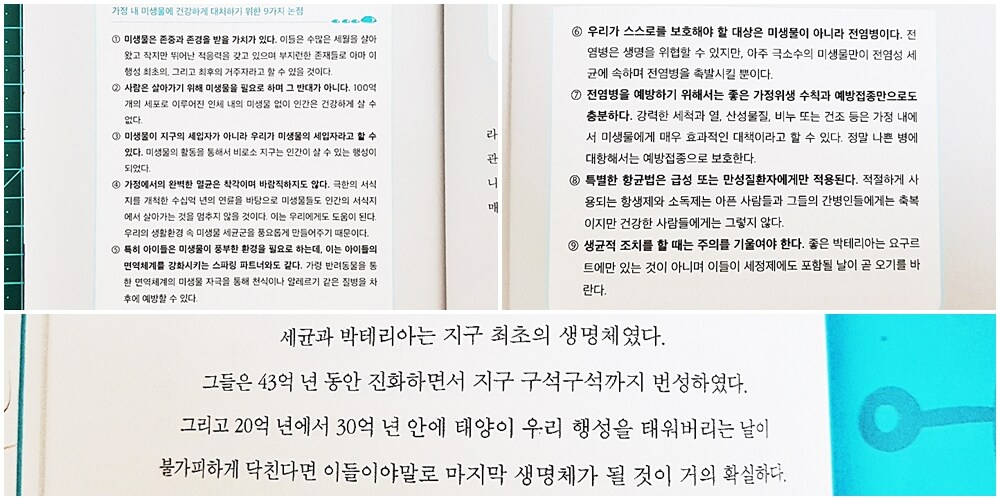
책을 읽으면서 이 분야 전공자가 아닌 사람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내 상식이 부족했던 것을 느낀다. 혹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세균'과 '박테리아'의 차이를 아시는가. 참고로 나는 가까운 지인들(10명 이상)에게 대면으로(검색하지 않고 답을 듣기 위해) 이것을 물어보았다. 아쉽게도 답을 할 수 있는 이가 없었다. 나도 몰랐다. 이번에 책을 읽으며 알게되었다. 나와 내 주변사람들을 욕(?)먹이면서까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두가 아는 저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도 모르고 쓰고 있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균'과 '박테리아'의 차이는 '언어'의 차이 밖에 없다. '세균'이 영어로 '박테리아'다. 허무한가. 하지만 약간의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책을 번역한 분도 이를 명확히 알고 계신 것 같지 않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세균과 박테리아는 지구 최초의 생명체였다." 이 문장은 이제 "뉴턴의 머리로 사과와 애플이 떨어졌다."로 느껴진다. 철학과 독일어를 전공하신 번역가도 미생물학의 관점에서는 우리와 같은 비전공 일반인이기에 그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나를 포함한 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언급한 것이다. 나는 나에게 세균과 박테리아의 차이를 알게 해준 것 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책은 나에게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해줬다. 어쩌면 내가 이 분야에 너무도 무지했기에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진 것 같기도 하다. 오늘은 무슨 고백의 시간 같다. 나는 메르스와 사스의 병원균이 같은 이름이며 그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책을 보고 알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에 뚝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내가 몰랐을 뿐이지.
바이러스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세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면, 책을 읽으면 세균들과도 친해진다. 지금 기억나는 이름은 '(황색)포도상구균'이다. 우리 피부에 많이 존재하는데 손에 상처가 나서 감염이 되면 이 녀석이 용의자 1호다. 이름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자를 풀어보면 쉽다. 포도(포도) 모양(상)처럼 생긴 동그란(구) 세균(균)이다. 이렇게 관심 가져서 이름을 풀어보니 처음의 낯선 느낌과 달리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가.

세균 하나를 더 소개하자면 다들 한번은 들어 봤을 '대장균'이다. 대장균으로 한 가지 고백을 더 해야겠다. 이번 서평에서는 양심선언을 많이 하게된다. 하지만 나의 이런 부끄러운 고백이 혹시나 나와 같이 느낄 사람들에게 '당신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그냥 살짝 넘어갈 수 있음에도 밝히는 것이다. '대장균'은 '캡틴'처럼 강한 '세균'이라서 대장균인 줄 알았으나 우리 몸 안의 장기 중 '대장'에 있는 세균이라는 뜻으로 대장균이었다. 이 대장균은 대장에 있을 때는 참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유익균'이지만 대장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각종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활동한다. 그런 위생학적인 관점을 반영해서 독일에서는 여자 유치원 생들에게 대변처리교육을 할 때 요도감염을 막기 위해 앞에서 뒤로 닦도록 가르친다고 한다. 다른 세균들도 그런 특성을 보인다. 세균도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할 때 없어야 하는 '낄끼빠빠'를 잘해야 하는 것이다. 책 제목<세균, 두 얼굴의 룸메이트>처럼 세균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유익하기도 해롭기도 한 우리 몸의 동반자임을 알게된다.
책의 저자는 독일에서 미생물학과 위생학 교수로 미생물과 위생 전문가다. 다소 무뚝뚝하고 깐깐한 이미지로 알려진 독일인 답지않게 시종일관 책에서 그는 유머를 구사한다. 읽으면 느낄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괴짜 과학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괴짜 과학자 같은 걸. 그 덕에 좀더 쉽고 편하게 읽어 나갈 수 있게 쓰인 책이다.
특히 2017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으로 그는 엄청난 문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바로 수세미에 관한 것이다. 그는 수세미를 '애완동물'로 표현한다. 이것 또한 그의 유머 표현 중 하나이다. 이는 수세미에 엄청난 세균이 서식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수세미 1㎤ 속에서 540'억' 마리가 있다고 한다. 참고로 우리가 늘상 쓰는 스마트폰에는 1㎠당 1.37마리, 화장실 변기에는 1㎠당 100마리 밖에 없다. 수세미는 내부까지 고려해 3차원 단위인 세제곱센치미터를 쓰고 스마트폰과 변기는 표면의 세균이 중요하기에 2차원 단위인 제곱센치미터라는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다. 세균으로 보자면 변기보다 싱크대 수세미가 '억'배나 더 오염된 것이니까. 상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그 외에도 천주교 신자인 그는 성당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손으로 성수를 찍어 성호를 그리는 것을 주목했다. 전공이 이래서 무섭다. 위생을 전공한 그였기에 이런게 눈에 띄는 게 아니겠는가. 실제로 조사해보니 성수반의 성수가 위험수치 이상으로 세귬에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외곽의 작은 성당에서는 정상범위 안에 들었지만 신도가 많은 성당에서는 위험치에 들었던 것이다. 책을 읽으며 성당 입구에 성수반이 있고 사람들이 손을 담구어 성수를 뭍히고 성호를 그은 후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병문안 갔을 때 환자의 환부에 성수를 뿌려주기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이것을 더 심각하게 우려했다. 실제 사례도 소개되는데, 환우를 찾아간 사람이 그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좋은 뜻'에서 성수를 뿌려주는데 그 성수의 세균이 약한 환부를 통해 더 쉽게 감염을 일으키고 환자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세균, 두 얼굴의 룸메이트>를 읽으며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진실과 거리가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기 영역이 아닌 분야의 책을 교양삼아 읽는 것의 필요성도 느꼈다. 조금 진부한 말이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분명 진실이다. 일상속에서 '단어'로 익숙해져버린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니 그만큼 더 많이 보이고 와닿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다. 세균, 바이러스를 막연히 겁내기 보다는 그들에 대해 이해하여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덕볼 것은 덕보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