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일락과 고래와 내 사람 ㅣ 문학동네 시인선 37
김충규 지음 / 문학동네 / 2013년 3월
평점 : 


눈이 부신 연둣빛 시집을 만났다. 시인 김충규의 유고시집, '라일락과 고래와 내 사람'.
시집과 제목과 같은 시로 처음 그의 언어를 만났다. 전혀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시인의 시집을 펼쳐 보았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허공 중에 끌어올린, 그의 세계 속에 푸욱 빠져 버렸다. 이상하게도 툭, 하고 눈물이 났다. 내가 열망하던 세계가 그곳에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일까. 나는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지가 않았다. 그의 언어가, 그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좋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일관성 있게, 생과 사를 오가면서 그는 허공 중에 바람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고래와 구름을, 숲과 물새를 그려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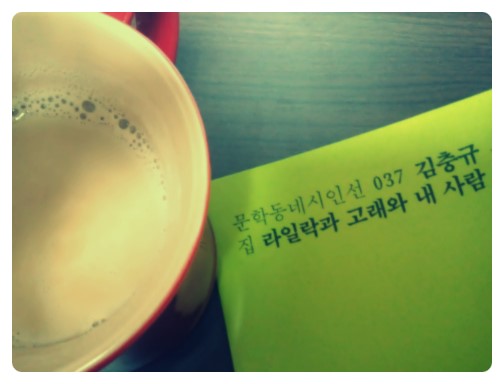
허공에게 바치는 시를 쓰고 싶은 밤이다. 비어 있느 듯하나 가득한 허공을 위하여.
허공의 공허와 허공의 아우성과 허공의 피흘림과 허공의 광기와 허공의 침묵을 위하여......
그리하여 언젠가 내가 들어가 쉴 최소한의 공간이나마 허락받기 위하여......
소멸에 대해 생각해보는 밤이다. 소멸 이후에 대해. 그 이후의 이후에 대해......
구름이란 것, 허공이 내지른 한숨...... 그 한숨에 내 한숨을 보태는 밤이다.
2012.1.16. 밤 10시 25분
김충규
내 속에 잠재해 있던 끓어오르는 열망이 그의 언어로 다시 되살아났다. 내 속에 갇혀 있던 언어가, 타인의 언어 속에서 새파랗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소 나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가치있고 의미있는 것으로 부풀어 올랐다.
시인이 발견한 가치와 의미. 그가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무수한 어둠을 통과했을 것이고, 막막한 터널 속에서 길을 잃었을 것이고, 치열한 자기 내면과의 싸움, 처절한 고독과 마주했을 것이다. 슬픔, 절망, 외로움, 무의미와 고독, 허무 속에서 자주 괴로워했을 것이다.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그 무언가 때문에 끝나지 않은 밤속을 헤맸을 것이고, 허공 중에 할퀴어진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며 자신의 울음소리로 외로움을 달랬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낸 그의 시가 나를 위로해주었다. 내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다. 무의미를 의미로 바꾸었고, 허공 중에 쏟아낸 음악이 나를 웃게 했다.
울지 마 곧 밤이 와 밤이 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저 허공에 성곽을 지으러 올라가야지 허공만이 유일한 안식처
둥둥 허공으로 떠오르는 영혼들을 봐 지상에서 고당했던 영혼일수록 더 가볍게 둥둥
나비같이 투명한 영혼은 제트기같이 빠르게 허공으로 올라가
.
.
빛이 수줍게 내려와 시신들을 수습하는 지극히 한가롭고 평화로운 이 세상에
만약 허공이 없었다면 어찌 생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아, 하공이 없다는 상상만 해도 질식해버릴 것 같아
텅 비어 있어도 허공은 늘 만찬이야 영혼이 맑아 날개를 얻은 생명들이
.
.
허공에 오르기 위하여 행복한 사후(死後)를 위하여
너도 뛰지 않을래? 우리 같이 뛰자
-p.16,17 [허공의 만찬] 중에서
그가 만들어 놓은 따뜻한 안식처인 허공에서 나는 따뜻한 숨결을 느낀다. 생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힘을 믿게 되었다. 만찬같은 허공 속에 그려진 그의 언어에 내 영혼이 맑아지는 기분이다. 그래, 함께 함께 뛰고 싶다. 그것이 생이든 죽음이든, 그 중간이든 상관없이!
시간이 정지해 있을 수도 있는 숲으로 가요
어제도 내일도 없는 숲이 우리를 매혹시킬까요
다만 낙오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만족합니다
.
.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게 유일한 길이거든요
말할 수 없이 지겨우니까요 이곳, 우우......
_p.18,19 [말할 수 없이 지겨우니까요]
내일이 오지 말기를, 중얼거리는 밤이다 살아온 날의 흔적을 싹 긁어내었으면 하는 밤이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지금 이 순간만 약간 허락되었으면 하는 밤이다
-p.59, [내일이 오지 말기를, 중얼거리는 밤이다]
그가 만들어 놓은 숲엔 낙오자가 없다. 어제도, 오늘도 없다. 그리고 내일도. 그저 존재하는 곳. 그곳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매혹시킬 것이다. 가끔 시간의 흐름이 우리를 어떤 곳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멈추는 순간 아니 그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어떤 몰입을 경험하는 것 같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란 그런 것. 시간 따위는 없는, 어떤 구획도 없는. 너와 내가 그저 만나는 시간. 그 시간 속에는 지루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이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지금 이 순간만 약간 허락되었으면 하는 밤, 이라고.
우리 모두는 자궁 속에서 죽은 태아같이 웅크리고만 있습니다
숨결이 간결해지려면 맑은 어둠을 더 많이 들이켜야 합니다
-p.33 ,[우리는 누구인가요?]
왜 내 곁에 있나요? 정, 말, 당, 신, 누, 구, 예, 요?
-p.57, [당신, 참 이상한 사람]
나는 누굴까. 당신은 누구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
그저 이 밤, 허공 중에 떠도는 당신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같다.
내 곁에 있는 당신은, 왜 내 곁에 머물까.
나는 도무지 내 자신이 멀쩡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 당신은 나와 같은데....
나는 당신이 되고, 당신은 내가 되는, 그렇게 잘 버무려진 우리가 되려면 맑은 어둠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빛을 숨겨둔 맑은 어둠. 어둠을 그렇게 들이키고 나면 좀더 깨끗하게 빛이 나겠지.
한번 얻은 육체는 바람도 사람도 어쩌지를 못하는 법
하여 서럽기도 하고 생이 두렵기도 하고
유리창에 미끄러지기도 하는 것
.
.
.
그저 세상이라는 유리벽에 반복적으로 미끄러지다
일생을 훌쩍 허비한 것에 불과할 테지만
앞을 가로막은 유리창을 원망할 필요는 없는 것
-p.24, [유리창과 바람과 사람]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다 지금이 그런 때
.
.
질서 없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영토이므로 먹구름은
몽롱한 동경이다 불안하므로 더 애틋한 불륜이다
.
.
먹구름이 비를 내리지 않아도 나는 이미 흥건히 젖어 있다
_p.60, [먹구름을 위한]
어떤 밤이었다. 모두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밤이었다. 어둠이 몰려왔다. 나는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다. 불을 꺼둔 채로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침대 옆 창문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내 속에 뿌리박힌 어둠이 빛을 몰아내고 있었다. 땅 속으로 꺼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질 것만 같았다. 허공 중에 가볍게 날리는 먼지는 내 육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듯 풀썩 주저 않고 말았다. 그 밤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어떤 것도 내 슬픔을 견뎌내지 못할 것만 같았다. 아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슬픔이 완전히 나를 지배했다. 그것은 생을 간단히 포기할 수도 있는 무섭고, 거대한 물결처럼 내게 다가왔다.
한번 얻은 육체는 바람도 사람도 어쩌지를 못하는 법/ 하여 서럽기도 하고 생이 두렵기도 하고/ 유리창에 미끄러지기도 하는 것/ 이 구절에서 나는 아주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아마 그 기억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먹구름처럼 이미 젖어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질서없이 흐트려져도 좋을 그런 밤이다. 그런 그런 밤. 누군가를 느끼는 밤.
느닷없는, 꽃의 붉은 울음
창밖에 수북수북
언어로 무언가를 완성하느라 밤새 끙끙거렸다
가녀린 펜으로
붉은 울음을 듣고도 앉아 있다면 참 아득해지는 일이어서
슬그머니 일어나 창을 열었다
지붕에서 어둠의 유약을 제 몸에 바르던 고양이가 멈칫
내 쪽을 돌아본다 무심히...... 물끄러미......
허공의 유전에서 솟구치는 흐릿한 빛의 원유(原油)
사방으로 튀는 소리
끝없이...... 꽃 없이......
참으로 오랫동안
고갈을 모르고 언어를 주물렀지
아니, 정작 내가 원했던 건
꽃의 붉은 울음을 술잔에 모아
고양이와 나란히 지붕에 앉아 나눠 마시고 싶었지
서로 붉게 붉게 취하고 싶었지
내 속은 원유(原油)를 다 생산해버린 텅 빈 유전 같아, 후훗-
이봐, 내 등에도 어둠의 유약을 좀 발라주겠니?
-p.86, [참으로 오랫동안] 전문
제일 마음에 들었던 시다. 이 시를 읽으니 왠지 시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그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엿보는 기분이었다. 어느 새벽, 붉은 눈으로 창을 열어 바라본 세상. 어둠 속을 가로지르는 고양이 한 마리. 더 맑아지고 싶었던 영혼에 빛으로 가득찬 어둠의 유약을 바르고 싶었던 시인 김충규. 그는 빛으로 만든 어둠이었고, 생과 사를 오가는 허공을 떠도는 영혼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허공 중에 내지른 한숨, 그 한숨으로 만들어낸 구름, 풍성한 여인과 같은 안개, 바다 위를 날으는 물새이자 어둠 속을 유유히 걸어가는 고양이었다. 살아있는 동안 써내려간 그의 시는 생과 사가 다르지 않은 그 무엇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뿌려놓은 시들에 둘러싸여 그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낀다. 생은,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빛이 나는 것이라는 걸 알기에.

라일락 향이 번지면, 바람이 불면 나는 또 그의 시집을 펼쳐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뚜벅뚜벅 세상 속으로 걸어갈 것이다. 벚꽃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