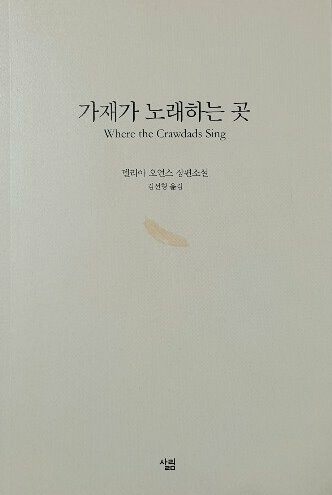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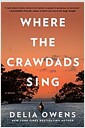
-
Where the Crawdads Sing (Hardcover) - '가재가 노래하는 곳' 원서
델리아 오웬스 / Putnam Pub Group / 2018년 8월
평점 :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안선을 따라 있는 외딴 습지.
근처 '바클리코브' 마을 사람들이 '습지 쓰레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곳은 초기 정착 시절부터 반란 선원, 조난자, 빚쟁이, 도망자 같은 떨거지들이 모여 들어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은 빈곤하지만 처박하지는 않은 곳이었다.
1952년 8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아침,
엄마는 한켤레 밖에 없는 외출용 구두를 신고 떠나 버렸다.
전쟁에서 다리를 잃은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언니와 오빠들도 차례로 달아나 버렸다.
새들의 노래와 별들의 이름과 억새풀을 헤치고 나룻배 젖는 법을 가르쳐 준
'카야'의 바로 위 오빠인 '조디' 마저도.......
이제 습지의 판자집엔 아버지와 여섯살 어린 소녀인 '카야'만이 남아 있다.
1969년 10월 30일 마을 근처 소방망루 아래에서 고등학교 시절 동네에서 가장 뛰어난 쿼터백이자
바람둥이인 '체이스 앤드루스'의 시체가 발견된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이렇게 시작된다.
어린 소녀의 '카야'의 성장과 '체이스'의 살인 사건, 이 두 주제를 시간대를 오가면서 들려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로 종결된다.
무려 450페이지가 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습지에서 홀로 남은 '카야'의 성장은 말 그대로 야생의 날것 그 자체 였다.
아버지 조차도 신경쓰지 않더는 어린 소녀.
아이들의 놀림에 학교도 단 하루 밖에 다닐 수 없었던 어린 소녀.
먹을것이 없어 홀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던 어린 소녀 카야.
가족들이 떠난 후 그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없었던 카야의 고립감과 외로움은
이 책 전반에 걸쳐 스며들어 있고 읽는 내내 자연스럽게 파고든다.
카야가 비틀거리면 언제나 습지의 땅이 붙잡아 주었다.
꼭 짚어 말할 수 없는 때가 오자 심장의 아픔이 모래에 스며드는 바닷물처럼 스르르 스며들었다.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더 깊은 데로 파고 들었다.
카야는 숨을 쉬는 촉촉한 흙을 가만히 손을 대었다, 그러자 습지가 카야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런 '카야'에게 깃털 선물과 함께 글쓰는 법과 사랑을 느끼게 해준 '테이트'.
'카야'에게 '테이트'는 타인의 모든것이였고, 세상과의 연결고리 였고, 배움의 시작이였을 것이다.
그런 그 마저도 '카야'의 야생의 모습에 놀라 떠나 버렸다.
그녀의 삶은 외로움과 불신이였다. 그녀가 믿었던 사람들의 떠나감은
그녀를 더욱더 외로움의 절벽 끝으로 몰아 버렸다.
외로움은 점점 커져 카야가 품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카야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 존재, 손길을 바랐지만,
제 심장을 지키는 일이 우선 이었다.
몇달이 흐르고 또 한해가 갔다. 그리고 또 한해가 흘렀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카야'를 통해 편견과 차별을 얘기하고 있고,
여성의 자립과 인종 차별, 사회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생태까지도 화두로 삼고 있다.
모든것의 종합 선물 셋트라고 할 수 도 있을 이야기 들의 흐름이지만 어느것 하나 어색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이것이라고 강하게 외치지도 않지만 조화롭게 서로의 주제를 바쳐준다.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것들이구나 조용히 생각하게 한다.
왜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피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용서의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걸까?
재판이 끝났지만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가슴 속을 쓸어 내리듯 의문이 풀어진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사건을 가슴 속에 묻어 버린다. 그와 동조하여.
마지막 까지 재미 있다.
마지막 한글자 까지도 놓칠 수 없다.
이제 습지는 '캐서린 다니엘 클라크' 아니 '카야' 자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