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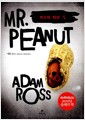
-
미스터 피넛 1
애덤 로스 지음, 변용란 옮김 / 현대문학 / 2011년 3월
평점 :

절판


세 명의 남자가 있다. 직업이나 생활환경,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에서 오는 공통점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분에서 닮아있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행태와 아내에 대한 태도는 묘하게 닮아있기도 하다. 그런 캐릭터적인
유사성 때문일지는 몰라도 세 남자가 들려주는 자신들의 이야기는 변주곡 같다는 느낌이 든다.
2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권 합쳐서 700쪽에 아슬아슬하게 가깝다.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 예상을 확실하게 깨부순다.
2권의 마지막 줄까지 읽어내는데 한나절이 안걸렸던 것 같다. 책을 읽는 사이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텔레비전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역시 스티븐 킹의 칭찬을 받아서일까? 이 책은 스티븐 킹 본인의 책만큼이나
페이지가 빨리 그리고 가볍게 넘어간다. 주요 등장인물이 세 군집으로 나뉘어져있고
그에 따라서 이야기가 마치 3개가 있는듯한 구조인지라 지루할 틈이 별로 없었던 게
이 책을 빨리 읽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인 듯 싶었다.
결혼생활은 어떤 과정으로 암흑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가를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다지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의 소설은 아니었지만
머뭇거림없는 과감한 장면전환이나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긴 페이지를 흥미를 가지고 읽어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로맨스이면서 미스터리이기도 하면서 경찰 수사물이라고 이 책소개글에서 읽었더랬다.
그런데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 책이 로맨스라면 그건 너무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고,
미스터리라기에는 긴장감이 조금 떨어지며 산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며,
경찰 수사물이라고 하기에 경찰로 등장한 인물이 본업에 정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딱히 어느 장르에 집어넣기 힘든 소설이었다고나 할까.
로맨스이자 미스터리이며 경찰 수사물은 무엇일까 책을 읽기 전부터 궁금해했었기에
페이지를 넘기면서는 아리송해졌었고, 다 읽고나서는 그런 책은 존재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젓고 있었다.
물론 이 책의 소속 문제만으로도 호기심을 가지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이 책은 어떤 분위기로 내용을 풀어나갈 것인가가 무척 궁금했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다보면 가끔 주인공들 중에서 아내를 죽이고 싶어하는 인물들이
드물지만은 않다. 그러다가 정말 아내를 살해하려는 시도를 진지하게 실행하게 되면
공포나 스릴러로 빠지고, 결국은 아내에게로 향해있는 자신의 숨은 애정을 발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들면 코미디로 흘러간다. 물론 다른 타입도 있었다.
그래도 블랙유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었다. 그래서 이 책의 스토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이 책의 주인공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에 초점을 두고 읽었내려갔었다.
그런데 이 책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상답안에는 없는 또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소설은 코미디도 아니었고, 블랙 유머는 더더욱 아니었고, 공포와 스릴러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진지하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세 명의 남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내를 죽이고 싶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아내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시간과 페이지를 넉넉하게 할애해서
들려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마치 누군가의 자전적인 내용을 담은 소설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