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눈을 뜬 곳은 무덤이었다
민이안 지음 / 북폴리오 / 2022년 6월
평점 :




얼마 전 개봉했었던 버즈 라이트 이어가 떠오른 건 아니다.
오빠와 취미생활을 공유했던 학창 시절, SF 소설과 영화를 좋아했던 오빠의 취향 덕분에 나는 그 시절 친구들이 읽던 하이틴 로맨스, 할리퀸 로맨스 소설보다 SF 소설과 추리소설을 좋아했다.
막 빠져서 봤다기엔 부족하고, 집에 책이 있으니 보게 되었다가 정답일 것이다.
그렇게 뿌리내린 취미는 성인이 된 뒤에도 영향을 미쳐서, SF 소설과 영화를 나름 즐겨보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절 봤던 환상특급이라는 TV 시리즈도, SF 소설도, 영화도 생각해 보면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다수였다.
인간의 미래는 점차 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있다.
현재 인간의 미래가 밝은지 암울한지 생각해 보면, 암울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
지구는 그동안 인간이 자연과 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발전만 해왔기에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동식물들은 이미 멸종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완벽한 치료 바이러스조차 없는 질병들이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미래가 꼭 디스토피아적으로만 그려져야 할까?
다시 생각해 보면 현재와 닥쳐올 미래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SF 소설이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그리는 것 같다. 미래는 유토피아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근거 없는 낙천적 세계관만 그려서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디스토피아를 그린 작품들이더라도 엔딩에서만큼은 희망의 단서를 남기는 작품들이 많아졌다. 예전엔 허무주의와 시니컬한 정서가 다수였다면, 척박한 환경, 전쟁과 질병이 만연한 요즘의 상황에서는 희망까지 빼앗아가지 않는다.
국외에서는 SF 소설이나 영화들이 소개되었지만, 국내는 불모지라 할 정도로 관련 장르가 큰 발전이 한동안 없었다.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은 달라졌다. 극장가뿐이 아니라 OTT라는 국경을 넘어선 콘텐츠 창고가 생겨서 그런 것인지, 극장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SF 장르를 꽤 많이 보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읽게 된 <눈을 뜬 곳은 무덤이었다>라는 책은 짧지만, 꽤 흥미로운 설정의 작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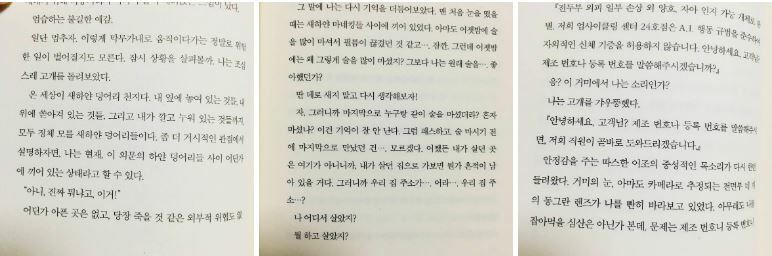
갑자기 외딴곳에서 눈을 뜨게 된 주인공.
이곳이 어디인지 전혀 감조차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깨어났지만, 어제 무엇을 했는지 자신에 대한 기억조차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막막함뿐이다. 마냥 막막하다고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인간의 시체가 가득한 곳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수많은 마네킹 아니 고장 난 안드로이드 고철 더미 속이었다. 거기다가 주인공의 목숨을 노리는 사이코패스 안드로이드의 추격까지 받게 된다.
공격을 받고 간신히 상대를 따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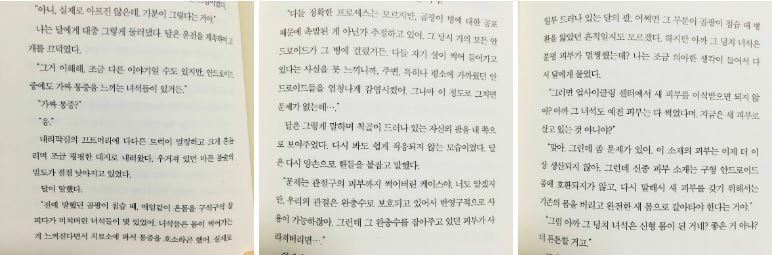
분명히 자신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인간이 아닌 안드로이드였다.
그것도 신형 모델 안드로이드. 하지만, 자신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장 난 안드로이드들로 가득 찬 쓰레기장 속에서 구형 안드로이드 달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아가게 되는 주인공.
과거 안드로이드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고, 달에게서 안드로이드의 상황들과 사고방식에 대해서 듣게 된다. 기존에 존재했던 안드로이드 중에서는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서, 자꾸만 인간인지 물어보는 달.
자신이 인간인지, 안드로이드인지에 대해서 모호한 가운데, 주인공은 달의 비밀업무인 파란 장미를 찾는 여행을 동행하게 된다.
주인공 풀벌레는 달에게, 혹은 만나는 다른 안드로이드에게 인간다움에 대해서 교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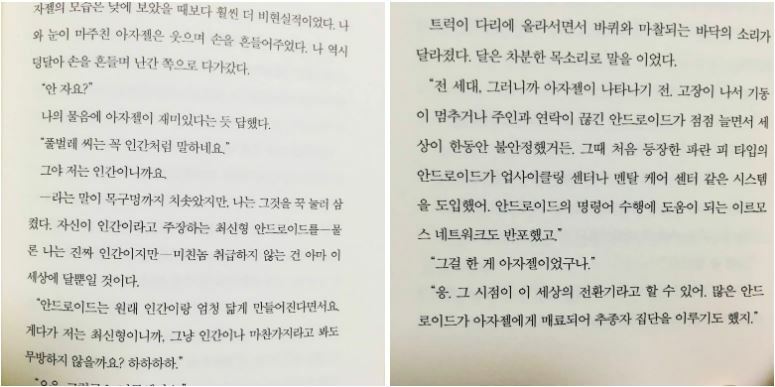
달과 함께 푸른 장미를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지만, 결국 자신이 인간인지 안드로이드인지 확인하기 위한 여행이기도 하다. 수수께끼와 같은 아자젤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불안정한 세상에 등장해서, 세상의 질서를 다시 세운 존재인 아자젤이 알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메모리가 차면, 덜 중요한 것부터 지워야 하는 구형 안드로이드 달은 인간의 뇌의 효율적인 형태를 부러워한다. 종종 달이나 안드로이드와 주인공 간의 대화를 보면 인간답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 여러 영화의 주제로도 쓰였던 인간다움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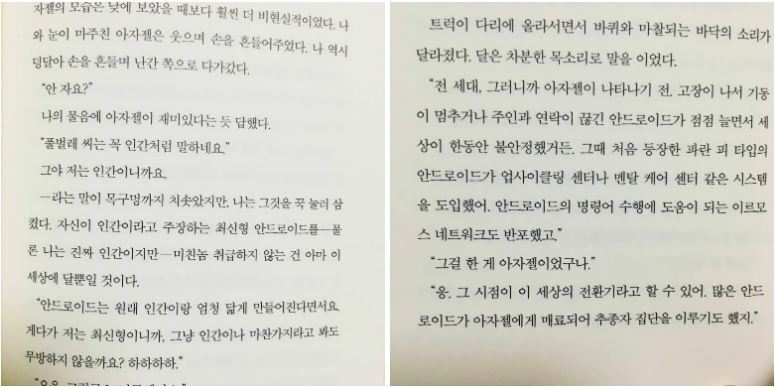
잔잔하게 흘러가던 것 같던 스토리는 모호하던 상황이 확실해지는 부분으로 향해갈수록 점점 더 흥미진진해진다. 어찌 보면, 책의 내용에 등장하는 설정이나 이야기들은 다 이미 보았던 영화 작품들에서 등장했었다.
새로울 것 없을 것 같던 이야기지만, 작가는 자신만의 필력으로 이야기를 새롭게 재창조해나간다.
책을 읽으면서 꽤 많은 영화들이 떠올랐는데, 그 작품들의 설정들을 아주 조금씩 촘촘하게 엮어나간다.
나의 모든 의식은 나를 인간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나의 피부, 나의 뼈, 나의 피, 모두 인간의 그것과는 전혀 달라.
그런데도 나는 왜 내가 로봇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걸까?
망가진 메모리의 백업 데이터를 찾으면 알 수 있을까?
나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눈을 뜬 곳은 무덤이었다
위의 문구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건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애프터 양>이라는 작품이었다.
가족을 케어해주던 안드로이드 양이 고장 난 뒤의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실은 알고 보니 신형 모델이 아니었다. 양을 고치려고 했던 주인과 그 가족들은 양의 기억 데이터를 보다가 이전 데이터가 있는 걸 알게 된다. 그 기록과 데이터를 더듬어가면서, 양을 둘러쌌던 환경을 보면서 그의 빈자리를 애도하게 된다.
인간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인간과 안드로이드는 어떤 미래를 향해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감상했던 영화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작가의 마지막을 한번 음미해도 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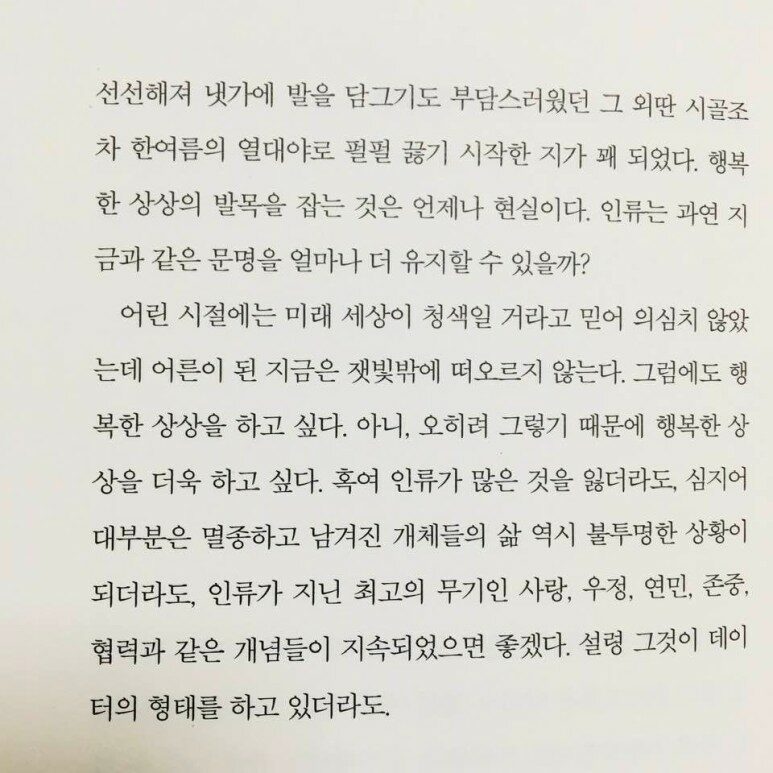
소설을 읽고 함께 보면 좋을만한 영화들을 추천해 본다.
책 읽으면서 떠올랐던 비슷한 설정의 대표적인 영화들.
1. A.I. : 현대판 피노키오 같은 느낌. 인간을 사랑하게끔 프로그래밍된 최초의 로봇 소년 데이비드. 버려진 A.I.가 인간이 되어 엄마의 사랑을 찾기 위해 푸른 요정을 찾는 여행 (왓챠, 티빙)
2. 조 :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 로봇 조. 과연 이 사랑은 설계된 것일까? (넷플릭스)
3. 아임 유어 맨 : 인간 개인의 행복을 위해 맞춤 설계된 휴머노이드의 등장. 과연 이 존재는 인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
4. 블레이드 러너 2049 : 인간과 복제인간이 함께 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 (넷플릭스, 왓챠)
5. 애프터 양 : SF와 휴머니즘의 만남.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기억과 시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작품. 누군가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이 글은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