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헤르만 헤세 시집 ㅣ 문예 세계 시 선집
헤르만 헤세 지음, 송영택 옮김 / 문예출판사 / 2013년 5월
평점 :



타고난 시인이었던,
그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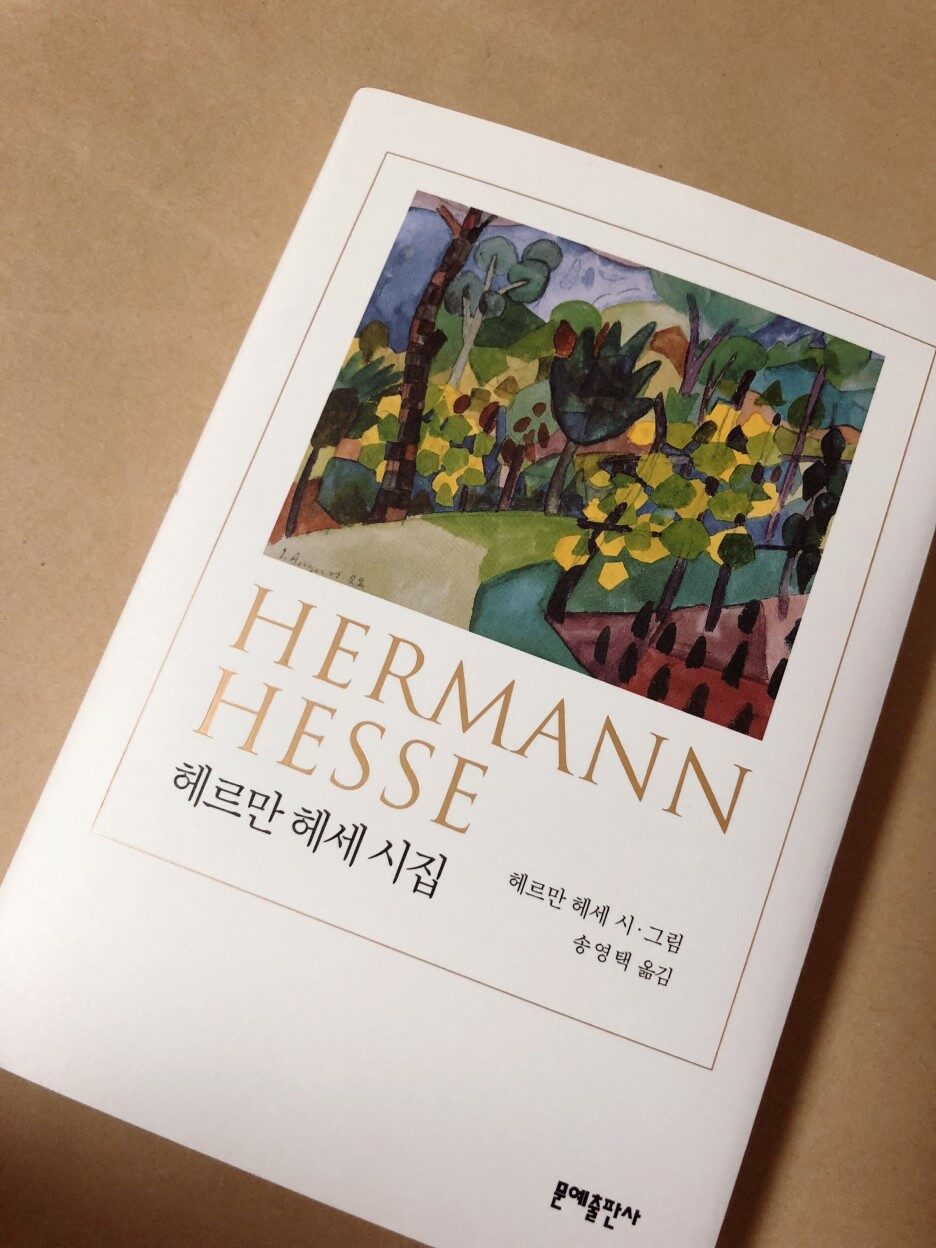
어릴 때부터 시인이 되는 것이 헤세의 유일한 염원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길잡이 없는 위험한 길을 홀로 헤쳐 나와서 필경에는 시인이 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쓰는 사람이라는 뜻만은 아니고 훌륭한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도 포함한다.
그의 어머니의 일기에 따르면, 헤세는 다섯 살 때 벌써 시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는, 밤에 잠자리에서 그것을 노래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가 후에 대성한 것은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선천적인 시인이었던 것이다.
_송영택 해설 中...
헤르만 헤세.
그는 소설가였고 작가이면서 독자라고 생각했다. 그를 시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 낯설었다. 적어도 그의 시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알쓸신잡 2>에서 우연히 헤르만 헤세의 시 한편을 만났다. 장동선 박사가 낭송한 시로, 제목은 '나는 별이다'였다. 제목부터 낭만이 묻어난 그 시 한 편은 "헤세, 그 친구 시 잘쓰네."라는 탄성을 불러오기 충분했고, 그의 다른 시들을 궁금하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헤르만 헤세, 그가 누구인지 몹시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그의 시와 그림이 엮어진 《헤르만 헤세 시집》으로 눈과 마음이 향하게끔 만들었다.
그의 시집을 사서 돌아온 저녁, 나는 생각했다. 왜 그가 시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까. 혹은 저자 소개에서 그가 시인이라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는 '시인'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시인으로 알려지기에, 소설가로 널리 알려진 작가였기 때문이 아닐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여러 편 쓴 독일의 대표 소설가라는 이미지가 강한 편이다. 또 당대에 작가로서 명성을 어느 정도 얻은 때에 들킨 "데미안 사건"은 소설가로서 그의 이미지를 더 굳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를 읽는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요즘, 그가 좋은 시를 많이 썼더라도 그의 시가 독일에서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헤르만 헤세 시집》 출간과 관련된 에피소드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책을 만드는 곳이며 동시에 책을 파는 곳인 문예출판사에서 《헤르만 헤세 시집》은 위험성이 큰 책이었다. 하지만 시집을 세상에 내놓는 고민을 출판사 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독자들과 함께 나누자 시를 읽는 게 잊힌 때에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응원에 힘입어 《헤르만 헤세 시집》이 세상에 나왔다. 조금 더 시인들의 시를 돌아볼 수 있는 문학적 감수성이 우리 사회 곳곳에 번져나가길, 보다 짙은 감성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그의 시집을 보고 읽고 느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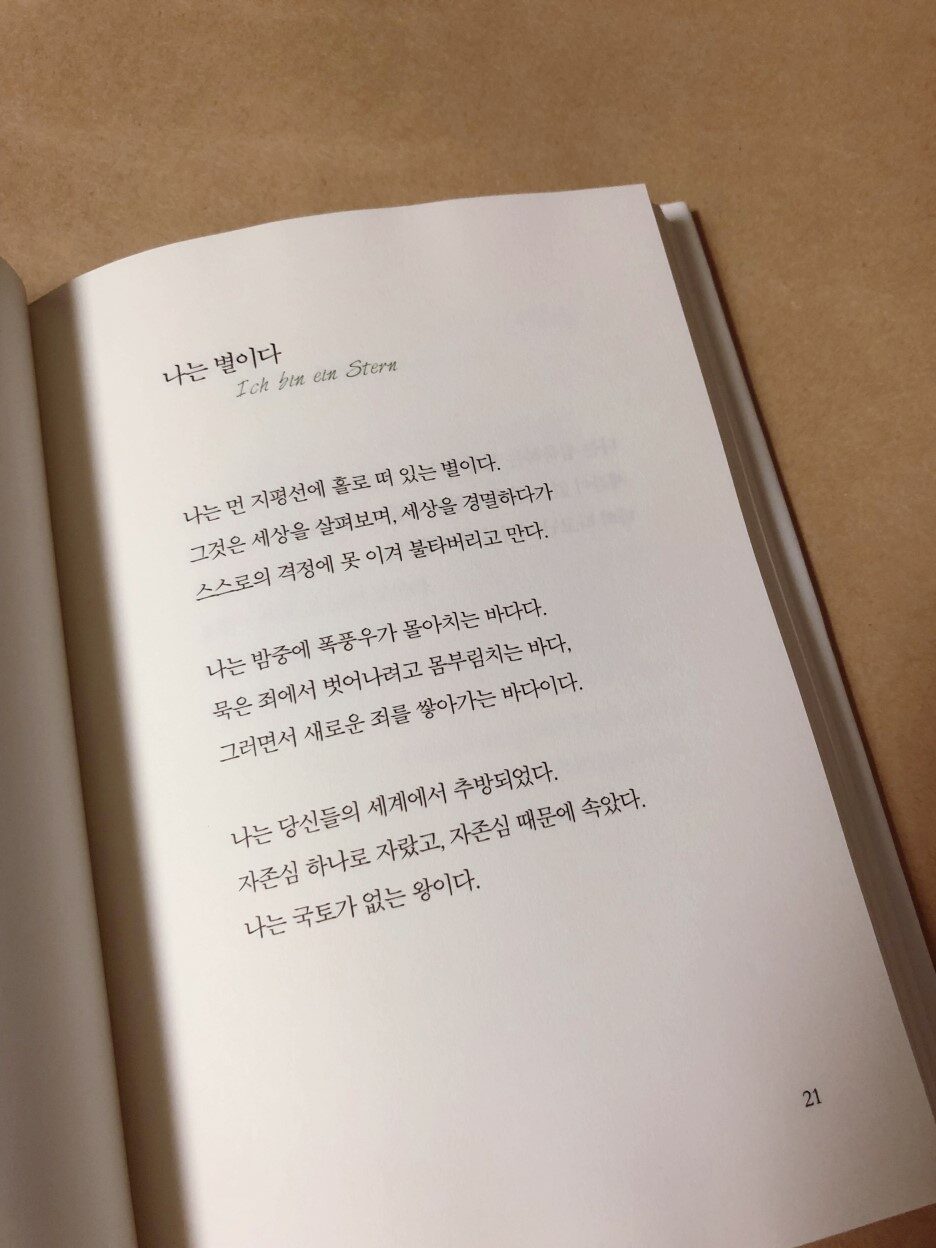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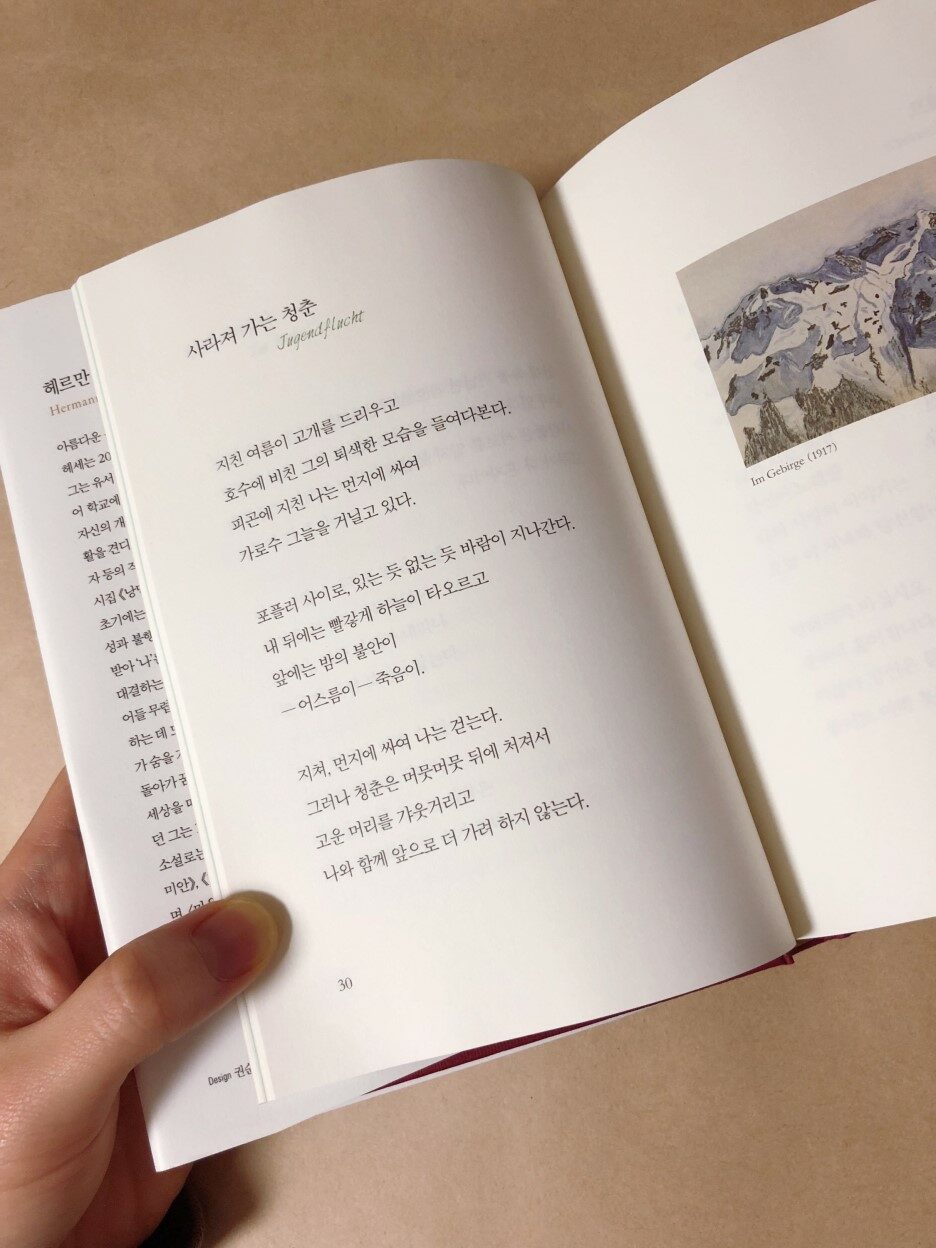
독일어를 할 줄 모르지만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언가 아쉽다. 이건 외국 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마다 마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우리나라 시를 외국어로 번역했을 때 그 감성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듯이, 다른 나라의 시도 마찬가지다. 시란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학 장르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에는 단어와 행, 절 그 텍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시 안에는 우리나라 문화적 정서는 단어 사이에 젖어있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의 말로 시를 낭송했을 때 마음을 휘몰아치는 여운은 남다르다. 헤르만 헤세의 좋은 시를 본래 모습 그대로 옮겨오고 싶었고 고민에 고민 끝에 문장화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 역자의 고민은 시 한편 한편에 충분히 깃들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럼에도 시라는 장르와 번역이라는 한계가 주는 불가피함은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헤르만 헤세의 시를 한 편 한 편 읽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여러 편이 눈과 마음에 쌓이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다. 독일 낭만주의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의 그림 속 장면들이었다. 마치 내가 우리나라 시인들의 시를 읽고 마음과 머리에 무언가 떠올렸듯이. 여러 시가 내게 쌓이자 프리드리히 그림이 떠올랐다. 헤르만 헤세가 그린 삽화와 전혀 다른 질감과 분위기의 그림이 말이다. 거대한 자연과 초월적인 힘 앞에 한없이 작은 인간을 화폭에 담은 프리드리히처럼, 시의 세계를 세상에 전달하는 시인이고 싶지 않았을까 싶었다. 하지만 헤세는 자신이 거대한 시의 세계 속에 작은 시인일 뿐이었다고, 자신의 바람은 바람일 뿐이며 그저 작은 시인이고픈 마음이 그의 시안에 조금씩 녹아져 있다. 누군가는 시구 중간중간 묻어난 그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 편 한 편에서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시를 천천히 생각하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작고 작은 독자이자 감상자일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