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위로 읽는 세상
김일선 지음 / 김영사 / 2017년 10월
평점 :



믿을 만한 단위 체계를 만들어보려는 과정은
사실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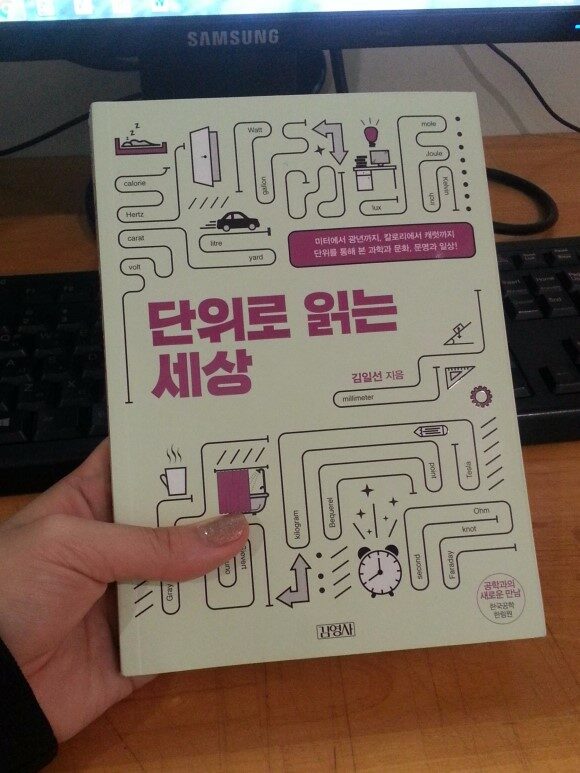
쉽게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에 대한 모든 것! <단위로 읽는 세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가진 의미를 쉽게 풀어 놓은 책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단위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지 좀처럼 인지하기 쉽지 않다. 지금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해 올린 사진의 용량을 나타내는 '바이트'나 몇 시인지 확인하는 '시' '분' '초' 그리고 공간의 너비를 나타내는 '평' '제곱미터', 소리의 음역대를 나타내는 '헤르츠' 등등 이외에도 많은 단위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단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단위로 정의 내린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대로 생활한다. 사용하고 있는 단위의 정당성에 대해 물어보지 않은 채 말이다. 정확하게 단위에 대해 질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 당연함은 편리함이라는 효용이 있기에 사용한다는 암묵적인 인식이 내 안에 내재화되어 있었다.
<단위로 읽는 세상> 속 저자는 나의 생각에 절반 정도는 동의하고, 절반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과학이 가지는 '합리성'에 기초한 단위의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과학적인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위가 있는 반면,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단위가 존재했다. 대표적인 예가 '시간'이다.
지구의 자전에 기반을 둔 개념인 하루와, 공전을 기준으로 하는 1년은 천문학적인 기준이므로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한 시간과 한 달은 하루와 1년을 어떤 식으로 '자를'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결국 달력이나 시간을 둘러싼 접근은 나누기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저기 흩어진 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보다는 있는 것을 적절하게 나누기가 훨씬 어려운 법이고, 시간이 바로 그랬다.
시간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이를 나누는 것에는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또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1분을 60초로 나누는 것은 시간을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속도"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그 의미는 크다. 단위의 탄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소통'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소통이 순수한 편리함을 기반으로 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중요하다.
<단위로 읽는 세상>을 읽으며 가장 많이 생각난 개념은 부르디외의 이론들이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담긴 함축 의미를 만들어 내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무의식적인 수용에 대해 경계했던 그의 이론과 '단위'에 대한 접근이 동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단위는 같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개념이다. 가령, 방사능에 대한 단위는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X-ray를 찍을 때 받는 방사능의 수치와 원자폭탄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노출된 방사능의 수치를 다루는 단위가 다르다. 이처럼 어떤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위험성이 더 부각되게 마련이다. 물리량, 나아가 과학은 본질적으로 무색무취하다. 하지만 방사능 관련 단위는 미지의 공포감을 발산한다." 단위에 대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단위가 비합리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어떤 단위에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니다. 많은 단위들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인간이지만, 이 기술을 인간이 완벽하게 통제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계가 아닌, 기술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이 <단위로 읽는 세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단위의 등장과 이 단위를 활용할 때 인간은 기존에 유지해온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단위로 읽는 세상> 속에 등장한 많은 사례들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말한다. 즉 우리는 기술을 활용하지만 동시에 기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소리의 높이로 길이와 부피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신체 부위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이고, 국가라는 조직의 틀이 잡혀야만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처럼 기발한 방법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소리'라는 주관적인 요소가 단위와 결합하는 순간 체계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율, 음역대 역시 임의적으로 만든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소리를 측정하고 구체화할 때 우리는 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소리에 대한 측정은 악보의 탄생, 절대 음감에 대한 생각, 녹음 등 다양한 음악적 활동과 음악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의 우리는 오선지와 서양식 8음계에 익숙하다. 이렇게 측정한 음악적 단위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게 음악은 선율보다 박자가 더 중요할 수 있고, 어떤 민족에게는 화음을 어떻게 구현하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음악을 도식화하고, 측정할 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면 음악의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은 비트나 화성을 측정하는 단위, 기술 역시 존재하며 이를 토대로 우열을 가르지는 않지만, 음악에 있어서 대중음악과 예술로서 음악에 대해 선험적 구분을 하고 있다. <단위로 읽는 세상>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단위를 선점하고 하나의 통용 언어화되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책 곳곳에서 하고 있다.
<단위로 읽는 세상>은 기술을 이용하는 측면의 시각에서 기술(
단위)의 시각에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