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의 역사
자크 엘리제 르클뤼 지음, 정진국 옮김 / 파람북 / 2020년 7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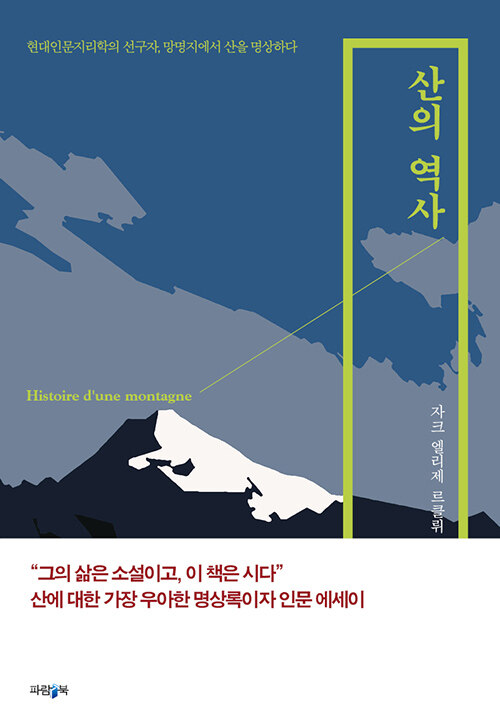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한다. 산에 자주 오르고 산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 그 이유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산을 통해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일상과는 한 발짝 떨어져 스스로의 우리 모습을 관조할 수 있는 동시에 도전 의식을 고취함이 아닐까. 1800년대 중후반 한 프랑스 인문지리학자가 쓴 ‘산의 역사’는 산을 주제로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담긴 고전을 읽다 보면 100여년의 시간의 차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현대의 우리가 읽기에 손색이 없고 시사하는 점 또한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산에 관해 딱딱하게 설명되어 있는 비문학 도서가 아니라 작가의 생각이 담긴 인문학 저서에 가까운 동시에 산에 관해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 방법인 신화적, 두려움의 요소를 담은 이야기가 아니라 근대적 방법에 따라 알게 된 당시의 과학적 지식을 담아 자신의 생각을 풀어낸다. ‘파리코뮌’에 참여했다가 정권의 핍박을 피해 스위스 산골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오랜 관찰을 통해 발견한 산에 담긴 모습들을 그리스 신화 및 비유 등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산이 어떤 의미였는지 담아내면서도 당시 일어나고 있던 근대적 발견에 덧대어 암석의 종류 등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의 복합적인 서술 방식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산을 담아 함께 살아가며 볼 수 있는 산마루와 골짜기, 바위, 흙, 화석, 구름, 안개, 산사태, 산짐승 등에 대한 관찰과 산과 함께한 우리 인간의 역사들을 다룬 작가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새삼 산에 가더라도 잠깐밖에 볼 수 없었던 자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감탄하게 된다. 그리고 뿌리 깊게 우리와 함께해온 산의 역사를 떠올려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기후나 산의 내부 압력으로 발생하는 자연 붕괴에 비하면 하찮기 짝이 없다. 거대한 암석 붕괴가 남긴 수 세기 후까지 정말로 무시무시한 자취를 남긴다. 그렇지만 자연은 재앙을 스스로 수습한다.
산에서 가장 우아한 곳들은 바로 산 밑으로 바윗돌을 굴리며 흔들렸던 절벽이다. 오랜 세월 동안 물도 자기 몫의 일을 해낸다. (중략)
이미 우아하던 산악 전체의 풍경은 더욱 큰 매력을 갖춘다.
사람의 얼굴처럼 자연도 인상을 바꾼다. 주름살을 펴고 미소짓는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산을 통해 지금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슈인 환경문제를 주제로 삼아 이야기하는 점이었다. 수많은 유럽의 탐험가들이 높은 봉우리를 정복해나가고 심지어 산악열차를 통해 기차로도 산을 올라가 관광을 하고 필요하다면 산을 제거하기까지 하는 근대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작가는 ‘도망칠 데가 어디 있어? 자연이 더러워졌는데...’라며 생산력 증강에만 몰두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우리에게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주며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산을 대표로 하는 자연을 찬미한다. 근대로부터 100여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사회 모습은 작가가 살고 있던 당시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산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산이 함께하게 된 양상을 살펴보고 신화가 아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산을 존중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좋은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