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출처 : merced > 프랑크푸르트 > 슈테델뮤지엄
전출처 : merced > 프랑크푸르트 > 슈테델뮤지엄
도서전 마지막날은 30m를 움직이는 데 10분은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책을 제대로 볼 수 있기나 한 건지. 작가님 사인회와 몇가지 마무리할 일들로 전시장에 갔다가, 반가웠어, 수고했어,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우린 이만 간다, 인사하는 데만 또 한참.
점심을 먹고 트램을 타고 마인강 건너 미술관 거리, 슈테델 뮤지엄에 갔다. 8유로짜리 티켓을 끊으면 입장권에 미술관 카페에서 커피 한잔 케익 한조각이 포함된다 (입장권만은 5유로). 1층 다 둘러보고 나면 출출한데, 다리도 쉴 겸, 딱 좋다.

뮤지엄 입구. 날이 흐렸다. 아래 사진은 뮤지엄 웹사이트에서 퍼옴.
오호, 맑은 날 강 건너에선 이렇게 보이는구나.

슈테델 뮤지엄에는 14-16세기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종교화가 많다 (크고, 무섭고, 어떤 것들은 잔혹하다). 17-18세기 네덜란드 작품 컬렉션이 훌륭하다. 19세기 프랑스 인상파는 기대에 못 미치게 얼마 되지 않았다. 램브란트, 꾸르베, 모네, 뒤러, 르누아르 등등 거장의 이름에 혹했으나 작가마다 한두점 정도?

르누아르, 점심 먹은 후에, 1879.
담뱃불을 붙이는 남자의 게슴츠레 뜨다 만 눈이 압권이다.
인상파 화가들은 다 싸이코 같다. 가까이서 보면 겹겹이 떡진 물감인데, 햇빛 찬란한 풍경, 붉은 빛이 언뜻언뜻 비쳐나는 연꽃, 하늘거리는 옷자락을 어떻게 담아내는 것일까. 맨정신일 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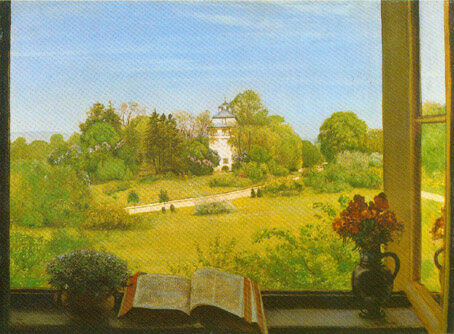
Hans Thoma, Die Oed (무슨 뜻이냐), 1883
신기하여라, 여러 작품 이런 풍경화인데, 마법사가 그림 틀 속에 인물과 풍경을 가둔 것처럼, 살아 있는 풍경 실제의 순간을 정지시켜 그림 속에 꼭 잡아 놓은 듯, 바라보면 꼭 빨려 들어갈 것 같다 (그림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마술에 걸려 그림 속에 갇힌 사연을 듣고 그 사람을 구출해 현실로 돌아오거나, 그 사람은 탈출하고 나는 갇히거나 -- 알고보니 그 사람도 원래 갇혔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빨려들어 온건데 그렇게 당해서 그동안 갇혀 있었다 --, 더 바람직한 것은 그림 속의 세상이 좋아 나도 그냥 거기 살기로 한다).
 Hans Thoma, Auf Der Waldwiese, 1876
Hans Thoma, Auf Der Waldwiese, 1876

Lionello Balestrieri, Beethoven
이 그림, 마음에 들었다. 제목은 베토벤이라지만 아무도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방안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절망에 빠져 있거나 피곤에 쩔어 멍하니 있다.
베토벤과 피아노를 제외한 방의 뒤편은 이미 반쯤 어둠의 세계인양 형체들이 불분명하고 그로테스크하다. 흩어지는 담배 연기가 더 뚜렷하다. 오른쪽 구석, 발갛게 타오르는 난로의 빛이 새어 나오는 모양도 인상적이다. 제일 뒤쪽에 허연 대머리 아저씨는 방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인지 유령인지 정체를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고보니, 열심히 듣는 것은 아니지만, 무념인 채로 음악이 몸 속으로 그냥 흘러들어오게들, 아주 잘 듣고 있는 것인지도... 그 음악은 또 방안의 인상을 담아내는, 쓸쓸하고 무심한 듯 하면서 가슴 아린 선율일 것 같다.

Lucas van Valckenborch, View of Antwerp with the Frozen Schelde, 1590
16-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는 스케일은 크지만 소박하고 사람이 사는 풍경이고 사실적이면서도 유머가 있다. 풍속화라 해야 할까... 브뤼겔의 그림들도 그렇고... 소재로서의 풍경은 칙칙할 것 같으나, 계절이 또 공간이 본래 가진 칙칙함도 그대로 사실적인데, 색감은 종교화나 동화의 삽화처럼 따뜻하고 몽롱하다.
(아래 브뤼겔의 작품들은 슈테델 뮤지엄에 있지 않다)

Pieter Bruegel, The Hunters in the Snow, 1565; Kunsthistorisches Museum, Vienna

Pieter Bruegel, The Harvesters, 1565;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Pieter Bruegel, Peasant wedding c. 1568; Kunsthistorisches Museum, Vien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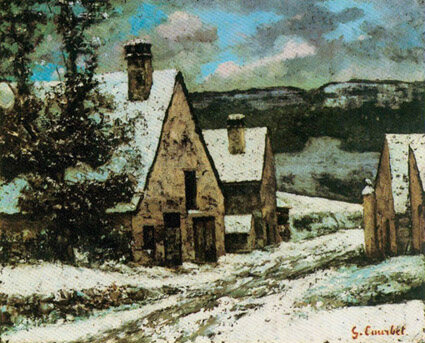
마음에 들었던, 꾸르베의 겨울 풍경.
베르메르를 만나다:
들어오는 길에 뮤지엄샵에서 본 엽서들중에 이 그림만은 어쩐지 꼭 봐야할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에 어떤 작품이 좋다더라, 꼭 이걸 봐야겠다 하는 것도 없었고, 뭐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1층을 휘적휘적 다니며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니, 뮤지엄도 꽤 크고 작품도 많다, 그러니까 다리도 눈도 아프다. 그냥 갈까도 싶었는데, 2층에서 계속 그 그림이 나를 가만 부르는 것 같다.

Johannes Vermeer, The Geographer, c. 1668
그림을 보는 순간 (크지도 않다 53 x 46,6 cm), 어라, 가슴이 아프다. 저 남자 아는 사람 같다. 에, 전생에 무슨 인연이라도 있었던 거냐...
유약한 듯도 하고 생각이 깊고 단호할 것 같기도 하고. 지도를 펼치고 한참 해야 할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듯 한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무엇이 그를 일하던 자세 그대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들었을까. 그의 시선은 캔버스 너머 벽을 향하고 있지만, 정신은 다른 데 가 있다. 다른 생각이 든 그 순간이 그대로 멈추어 있다.
게다가 이 정적인 분위기, 얼굴과 지도에 반사되는 저 햇빛, 어쩌자고 저런 찰나를 담아낸 것일까, 으아아.... 이렇게 몰두해 있으면서도 넋나간 그림이라니, 그리고 바라보는 나도, 넋이 나갈 것 같다.
 Johannes Vermeer, 물주전자를 든 젊은 여인, c. 1662
Johannes Vermeer, 물주전자를 든 젊은 여인, c. 1662
처음엔 이 그림 때문에었다. 뉴욕 매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본 이 그림. 엽서를 보면서 언뜻, 그림 속의 남자와 이 여인이 서로 아는 사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히 끌리지는 않았지만, 선명한 듯하면서 뿌연 색감과 부드럽고 흐릿한 것 같으면서 분명한 선이 인상에 남았던 이 그림. 하지만 그 때는 그렇게 가슴을 울리지 않았던 거다. 작가가 누군지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했으니. 아닌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적여보니, 둘이 어쨌거나 친구는 친구다.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베르메르의 그림들을 찾아보고 그에 관한 글들도 읽고 (썩 공감이 가지는 않는다), 그러다보니, 전에 서점에서 보고 읽을까 말까 망설였던 책-- 아, 이 그림도 베르메르구나, 주문했다.

재미있게 읽었는데, 모델이 화가는 아닐 텐데, 소설을 읽으며 난 자꾸 베르메르의 모습을 지오그래퍼의 그 남자로만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베르메르의 묘한 분위기, 소녀들의 속을 전혀 읽을 수 없는 눈빛은 이렇게 깜찍한 광고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2003년 1월 뉴욕. 42번가의 대형 광고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약칭인 MET, <소녀의 초상>이 깊은 눈, 옅은 미소로
HAVE WE "MET"?
이라고 묻고 있다. 어찌 아니 만나러 갈 수 있는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