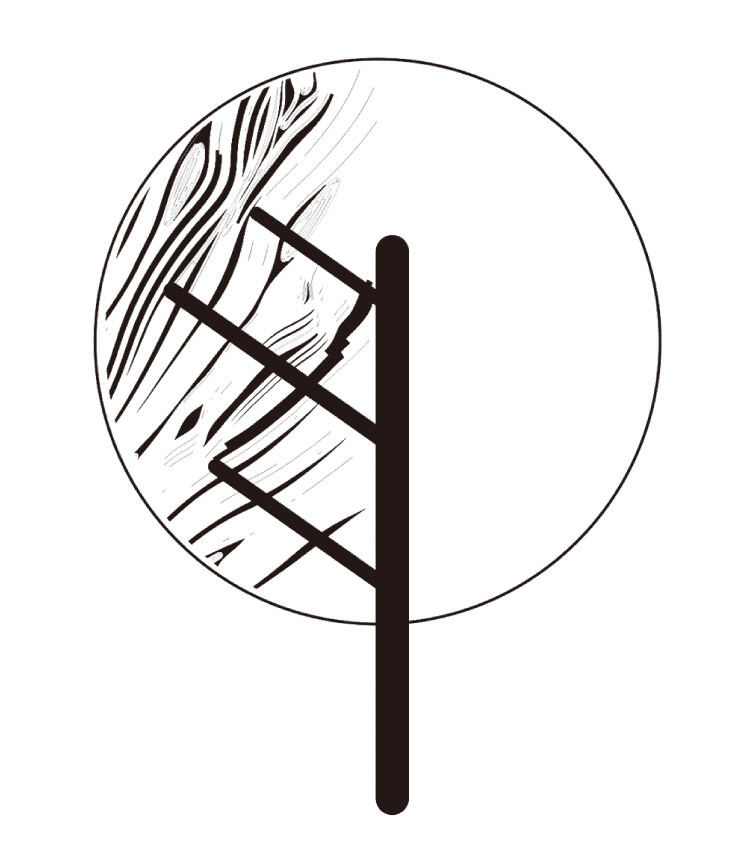
스며든 연인, 나무와 사랑에 빠지다
나무는 늘 우리 곁에 존재해왔지만 나무가 사람과 공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무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나에게 나무는 《멀고도 가까운》 곳에 존재하면서 《천천히, 스미는》 존재다. 나무는 내 삶과 멀리 떨어진 산에 다른 나무와 숲을 이루면서 존재하기도 하고 가까운 거실과 서재, 그리고 나의 연구실에도 존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생태학 관련 책을 읽으며 생태학자들이 펼치는 관념적 주장과 이상적 슬로건에 식상해질 무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면서 말없이 살아가는 나무의 일상에서 생태학적 상상력의 단초를 얻기 시작했다.
생태학도 생명체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지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관념적이고 허구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는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 퍼질 수 있다. 하지만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작은 생명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가는 방식과 원리에 관심을 갖고 유심히 관찰하면서 놀라운 생태학적 관심과 상상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나무가 살아가는 모습이 수없이 스쳐 지나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뇌리를 파고들어 심장 속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다. 스치면 인연이지만 스미면 연인이다. 나는 나무를 그동안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나무가 내 마음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다.
수없이 많은 사람과 사물이 스쳐 지나갔지만 내 심장에 담긴 감정의 파고가 드높지 않은 이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난 시절의 과거일 뿐이기 때문이다. 내 몸에 남아 있는 감정의 파고만큼 내 삶의 파도도 그 높낮이가 다르다. 나무를 만나고 느낀 지난 시절의 내 추억이 강렬할수록 내 몸에도 나무와 만난 사연이 오롯이 살아 있다. 하지만 모든 나무가 다 그런 추억을 갖고 있지는 않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늘 만났던 갈참나무나 떡갈나무, 밤나무와 감나무, 앵두나무와 살구나무는 늘 먹거리를 제공해준 아련한 추억들을 지니고 있다. 봄날 냇가에서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버들피리를 불던 추억, 신작로 가로수 길에서 언제나 등하굣길에 만났던 미루나무,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에서 아낌없이 그늘을 만들어주었던 느티나무와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겨울에도 늘 푸르름으로 청춘의 뛰는 가슴을 자극했던 소나무에 대한 추억이 아롱지게 남아 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성복 시인의 시집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에 실린 〈그날〉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것을 나무에 대입해보면 “모든 나무가 거기 있었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고 할 것이다. 나무는 항상 우리 곁의 저마다의 자리에서 존재해왔다. 그러나 아무도 나무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경영컨설턴트 고미야 가즈요시가 쓴 《창조적 발견력》에 나오는 말이다. 나무를 잘 알지 못하면서 늘 만나서 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나무를 알려는 의지는 물론 관심까지 증발시킨 것이다. 나는 알면 사랑한다는 입장보다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입장에 공감한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전과 다른 관심과 애정이 생기고 앎에의 의지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나무도 마찬가지다. 나무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늘 거기에 있던 나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시속 0km로 자라는 나무, 세상에서 가장 독립적인 생명체
자기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주체는 나체(裸體)일 때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나체는 그냥 벗은 몸이 아니라 자신을 위장하거나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를 떼어버리고 본래의 내 모습으로 드러날 때 보이는 몸이다. 나무의 본질은 사계절 다 엿볼 수 있지만, 특히 새봄의 파릇한 새싹을 성하의 녹음으로 바꾸고, 이어서 불타는 단풍으로 한 시절을 정리하면서 겨울맞이를 하는 나무를 보면 나무야말로 ‘나무(裸務)’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나무가 ‘나무(裸務)’인 이유는 나력(裸力)으로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보여주려는 저마다의 몸부림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나무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소명과 의무를 다하는 ‘나무(裸務)’다. 다른 생명체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생명체다. 물론 나무가 자라는 데는 토양의 양분과 수분이 필요하고, 적당한 햇볕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며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나무는 누군가를 의존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성장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스스로 받아 순환시키면서 살아간다.
의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직분을 말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에 걸맞은 나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 경쟁력이 바로 나력(裸力, Naked Strength)이다. 나력은 내 이름 석 자로 버틸 수 있는 본래의 힘이다. 조직에서 받은 직위나 누군가 나에게 붙여준 각종 형용사의 덤불을 다 걷어내고 이름 석 자로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경쟁력이다. 나무는 나력의 대명사다. 이에 반해 인간은 어떠한가.
“인간은 생물체 중에서 유독 혼자만 암 유발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 이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 우리 환경의 일부가 되었다.”
지식채널e에 ‘시속 0km’라는 나무에 관한 동영상이 있다. ‘시속 0km’는 세상에서 가장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나무의 성장 속도를 말한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 보이(Little Boy)는 시속 320km로 돌진, 무려 8만여 명을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주변을 순식간에 복구가 불가능한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시속 320km가 생명을 앗아간 그 땅에는 시속 0km로 자라는 나무만 남았다. 그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다. 은행나무는 그 자리에서 천 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무는 태양, 물,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지구 어디에서나 자신의 자리에 서서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지 않은 채 가장 크고 오랫동안 자랄 수 있는 지구 생명체다. 그 어떤 생명체보다 느린 시속 0km의 속도로 자라지만 다른 생물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양분을 섭취하고 만들어내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립적인 생명체인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자라지만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 그러면서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나무는, 나무라지 않고 맨몸으로 그 자리에서 언제나 살아간다. 나무는 그래서 나무(裸務)다. 이에 반해서 날이 갈수록 속도를 높이며,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종속적인 생명체다. 가장 종속적인 생명체인 인간은 가장 독립적인 생명체인 나무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가장 독립적인 나무 없이는 가장 종속적인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