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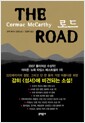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이 책이 영화로 나온다고 하지만
난 절.대.로. 그 영화를 보지 않을 작정이다.
소설로도 충분하다.
충분히 무섭고 절망적이었다.
그리고 쐐기를 박듯, 잔인한 희망까지 심어준다.
그 어떤 호러무비의 피가 철철 흐르는 장면보다
이 책의 한구절 한구절을 상상하는 것이 더 끔찍했다.
눈을 감으면 내 상상 속은 온통 잿빛이다.
지하실 환기창을 통해 보는 햇빛처럼,
소설 속의 햇빛은
숨막힐듯 먼지가 빽빽히 들어찬 공기 사이를 뚫고
간신히 존재만을 알리고 있다.
우리가 알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독자는 알 수가 없다. 그저 상상할 수밖에.
무시무시한 뭔가가 모두를 태워버렸고
남은 것은 재와, 먼지, 약탈자들, 소수의 생존자들뿐이다.
보이지 않는 달의 어둠. 이제 밤은 약간 덜 검을 뿐이다.
낮이면 추방당한 태양은 등불을 들고 슬퍼하는 어머니처럼
지구 주위를 돈다.
(이 표현이 너무 가슴아프고 비참하면서도 아름다웠다. p.40)
그 폐허를 아버지와 소년이 걷고 있다.
더럽고, 냄새나고, 배고프고, 지친 채.
지난 세상의 기억은 달콤한 추억이 아니라
현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악몽일 뿐이다.
읽는 게 너무 힘겨웠다.
그들의 삶이 언제 당장 끝장나버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애간장을 졸이면서 제발, 제발..무사하기를 바랬다.
아빠는 정말로 용감해요?
중간 정도.
지금까지 해본 가장 용감한 일이 뭐예요?
............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거.
(p.307)
남자는 거의 매일 밤 어둠 속에 누워 죽은 자들을 부러워했다.
(p.260)
남자에게 소년은 빛이고, 세상이었으며, 희망이었고,
그 폐허를 살아가는 이유였다.
남자의 선택은, 그 희망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다.
진정 용기일까, 그보다는 덜하지만 진한 부성애일까.
난 이 작가를 처음 만난다.(물론 소설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꽤 오랫동안 내 '보관함'에만 들어있고
'장바구니'로 옮겨진 적은 없었다.
'로드'를 읽고 나서 그 책이 궁금해진다.
거기서도 작가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