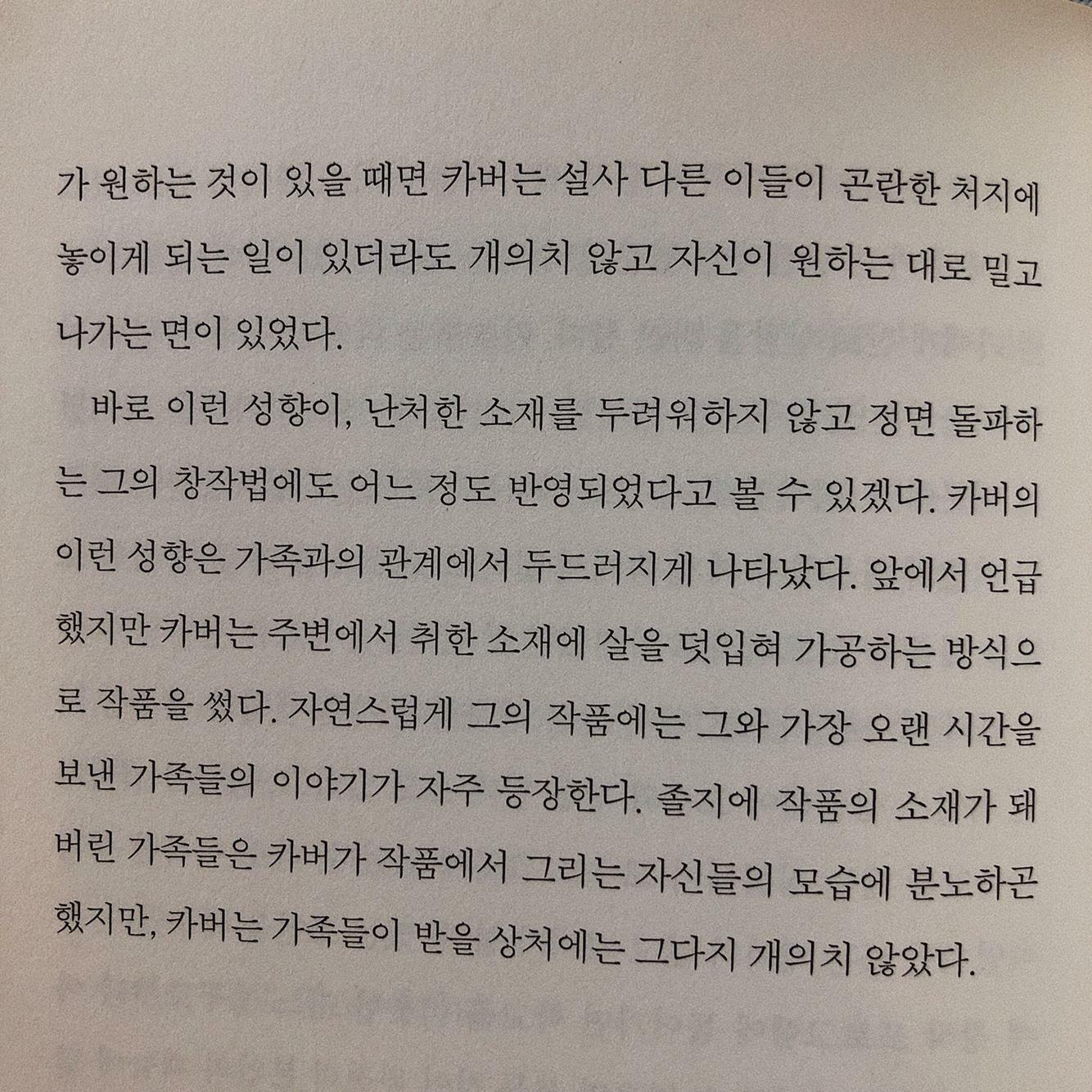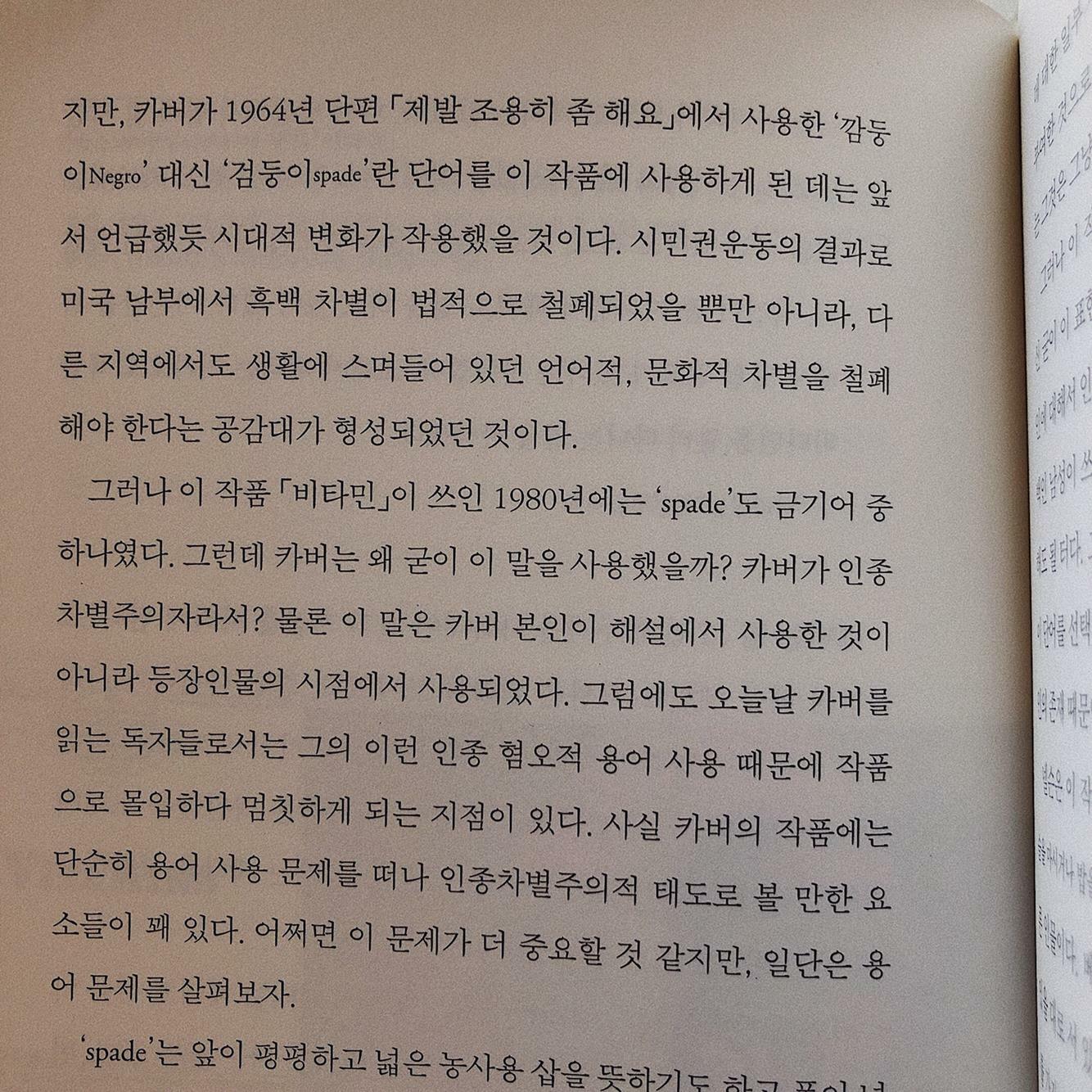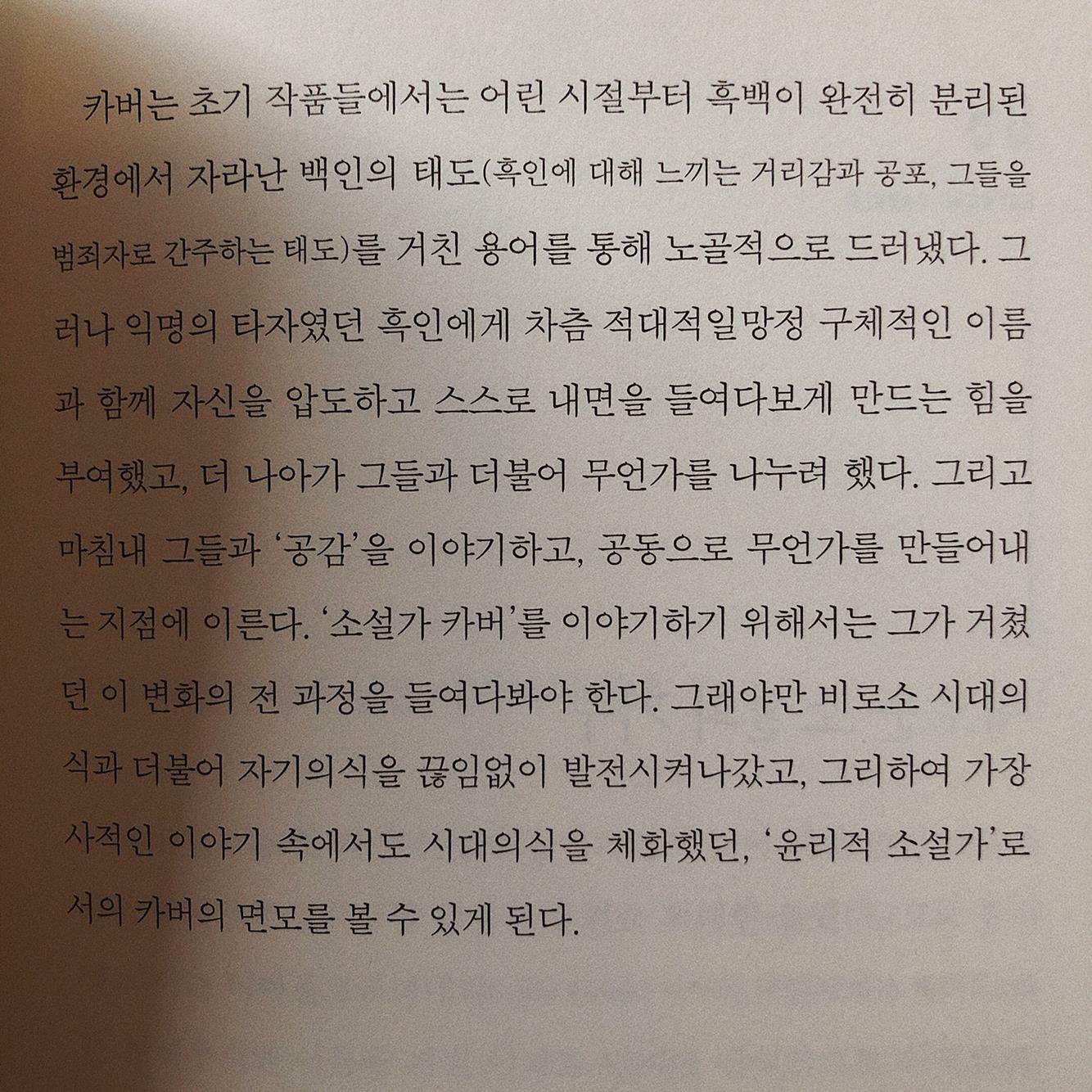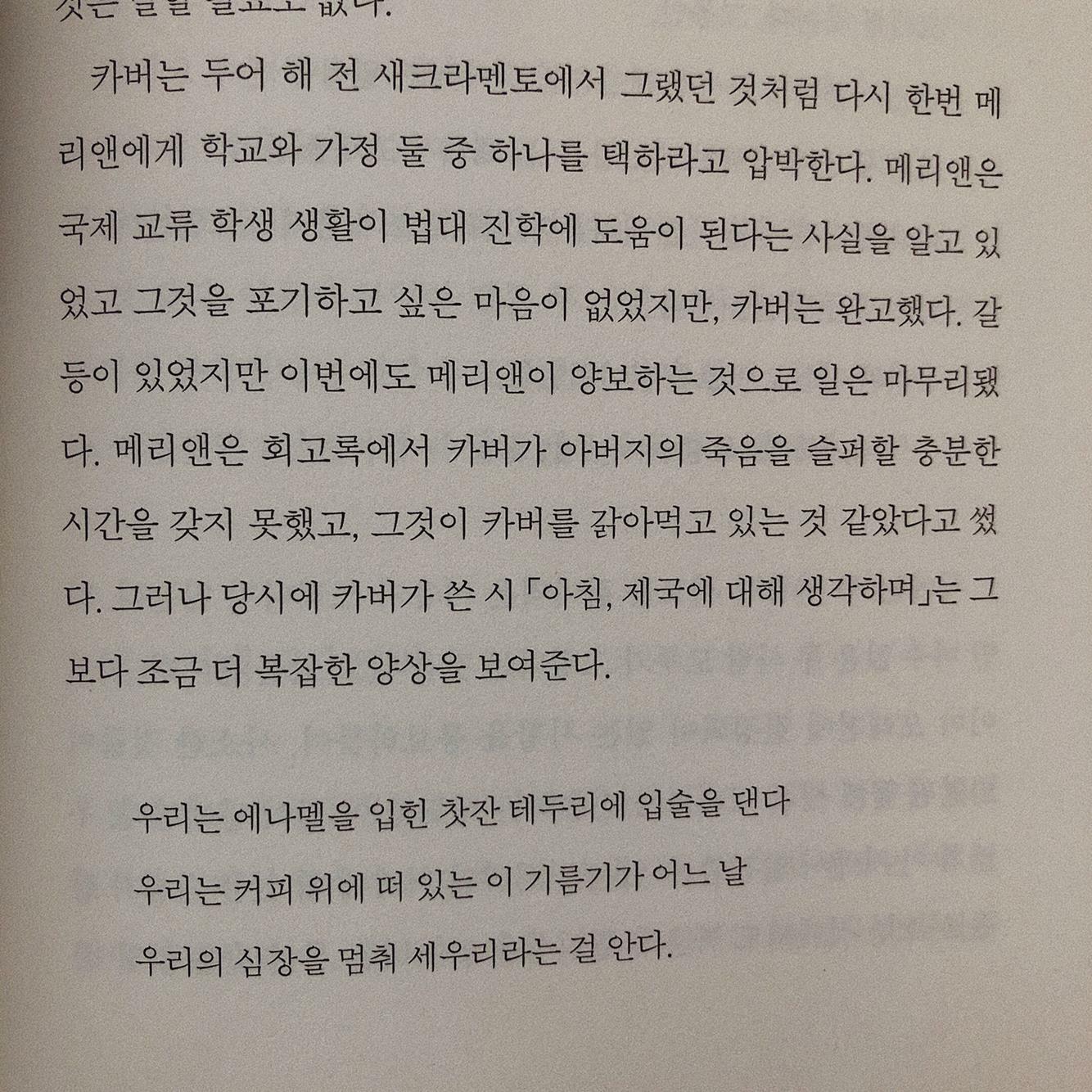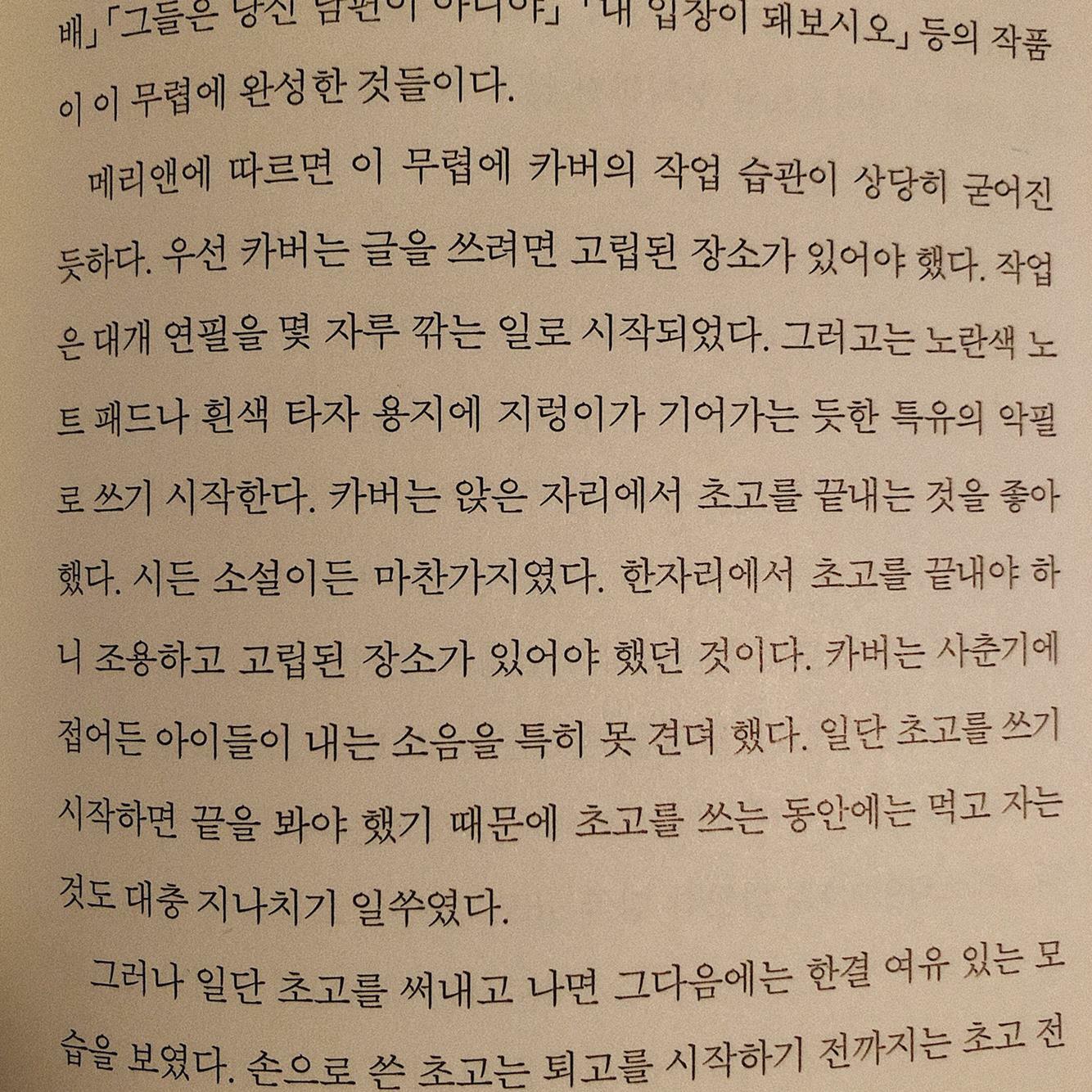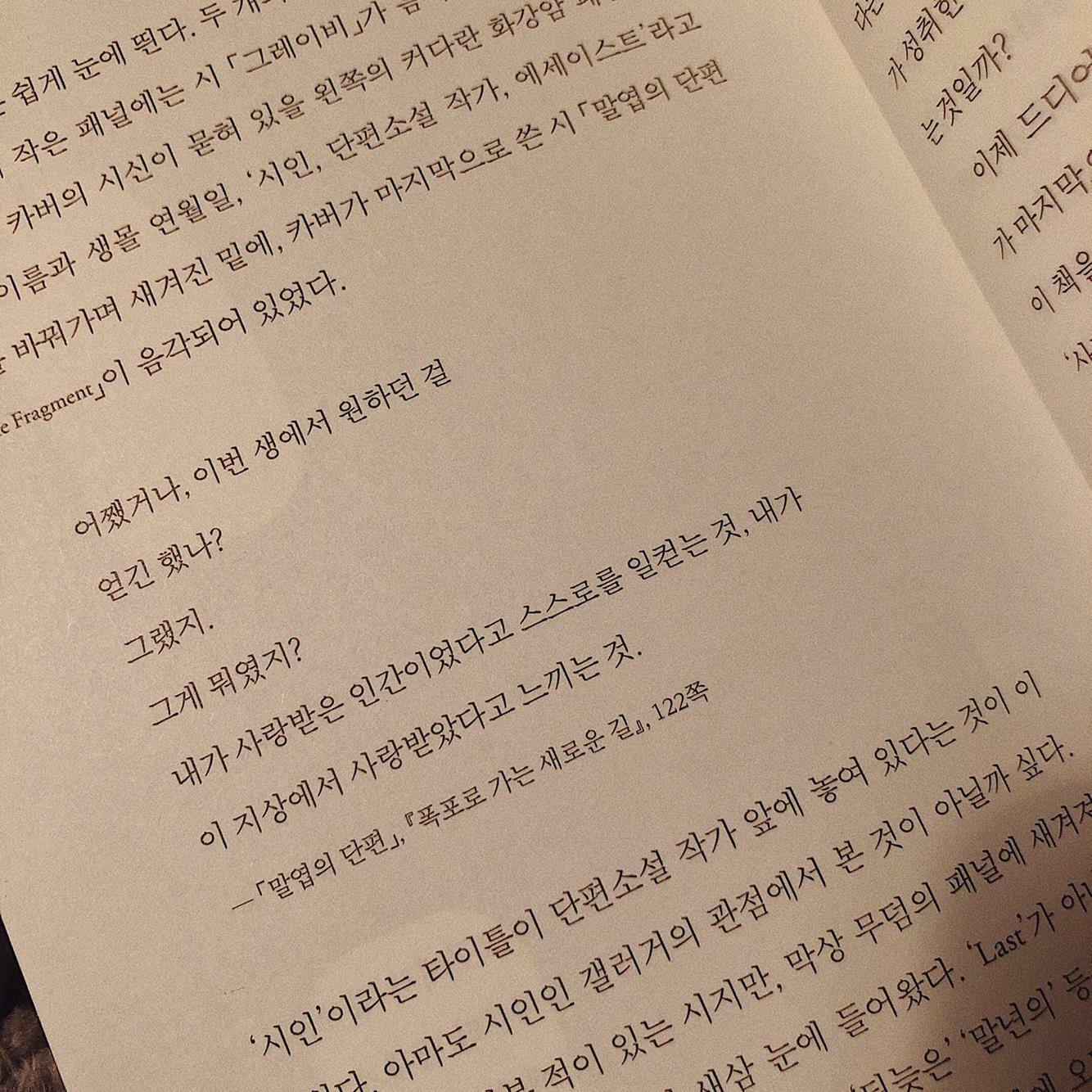-

-
레이먼드 카버 - 삶의 세밀화를 그린 아메리칸 체호프 ㅣ 클래식 클라우드 13
고영범 지음 /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평점 : 


레이먼드 카버는 <대성당>으로 처음 만났다. 장편 위주의 독서를 하다 조금씩 단편을 읽어보기 시작했을 무렵의 일로, 내게 카버는 작품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를 쓴 작가였다. 불협화음 끝에 따뜻한 롤빵과 어렴풋하게 스며드는 희망. 그런 소설을 쓴 작가 말이다.
믿고 읽는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로 카버가 출간된다길래 기대하고 있었다. 작품으로만, 그것도 역작이자 생전 마지막 작품집 <대성당>으로만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뒤 드는 생각은 ‘그냥 작품으로만 그를 만났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사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것을 집필한 작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작품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는 이이기에 이런 작품을 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보통의 경우 인터뷰나 낭독회, 에세이 등에서 만나는 작가들은 ‘인간 누구‘라기보다는 ‘작가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수월한 편이다. 그런데 우리가 작가의 개인적인 삶을, 내밀한 면모를, 절망과 수치의 순간들을, 비윤리적인 모습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작가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그것도 날 것 그대로의 그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레이먼드 카버>는 다른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저자가 카버라는 인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을 여행하고 그의 삶과 작품 등에 대해 풀어놓는 에세이다. 카버의 삶은 그 자신이 ‘나쁜 레이‘와 ‘착한 레이‘의 시대로 구분할 정도로 극단적이다. 두 번의 파산, 알콜중독, 흩어진 가족, 계속되는 가난. 내게는 오래도록 진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 보였다. 물론 실제 그가 처했던 상황과 그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으니 함부로 논하기는 힘들지만, 이 책에 쓰여진 바를 통해 내가 알게 된 카버는 뭐랄까, 책임감 없는 고주망태랄까. 개인사는 개인사니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되겠지만 그에게 조금 실망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훌륭한 작가가 반드시 훌륭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그 와중에 재미있었던 부분은 <사랑을 말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편집자가 거의 개작하다시피 한 작품집이며, 결국 카버의 문체를 고스란히 살린 <풋내기들>이 그의 사후 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편집자가 개작에 가까운 편집을 휘둘렀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독자로서는 두 작품집을 비교해서 읽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또, 카버의 시! 한국에는 제대로 번역 소개된 적이 없지만 사실 카버는 소설가이기 전에 시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책을 읽는 내내 거듭해서 들었다.
새벽에 마음이 심란해서 <대성당>을 다시 펼쳐 몇 편을 읽었는데 잘 쓰긴 잘 쓴다. 좋기는 좋다. 카버의 생애를 생각할 때면 찰스 부코스키(와 그의 페르소나 헨리 치나스키)가 떠오른다. 사실- 나는 부코스키 작품들을 좋아하지만 어디가서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는편이다. 너무 적나라하거든. 뭐랄까.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숨어서 읽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비슷한 것 같다.
아무튼 카버의 <대성당>을 다시 읽고 있고, <풋내기들>도 읽어볼 생각이다. 아직은 생각만.
www.instagram.com/vivian_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