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름다움의 선
앨런 홀링허스트 지음, 전승희 옮김 / 창비 / 2018년 1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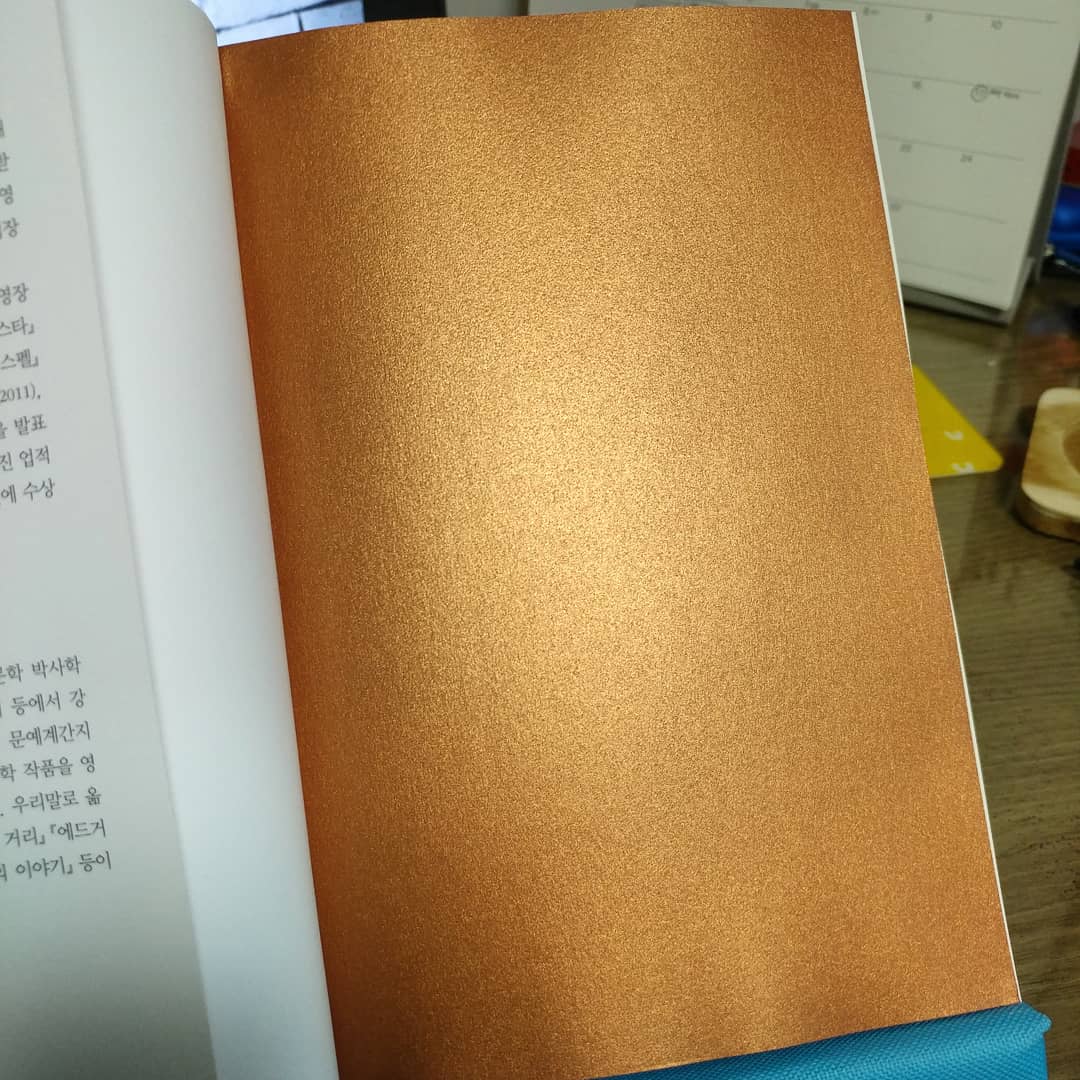
1. 바야흐로, 퀴어 문학의 시대이다. 거대공룡 출판사인 문학동네에서 2018년 내내 김봉곤과 박상영을 엮어 쌍두마차로 밀어 주었다. 2018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은 <작정기>(김지연)의 주인공 역시 퀴어이다. 문학과지성사, 민음사, 창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매우 훌륭한 현상이라고 본다. 유행한다고 따라가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사람이 만든 사회적 편견을 넘어 사랑하는 것, 그 자연스러움을 허용할 뿐 아니라 권장해주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모니카 트로이트 감독이 <젠더너츠>에서 말했듯 자연은 인간보다 창의적이다. 남의 알을 훔치는 게이 펭귄도 있고 암수 구별이 어려운 하이에나도, 자연엔 있다. 좋은 시대가, 느리고 돌을 맞고 있긴 해도, 점차 오고 있다. 희망을 본다.
2. 이 소설은 <위대한 개츠비>의 게이 판처럼 보인다. ‘저 부유한 상류층 속 한 마리 중산층인 나… 내가 관찰하는 그들의 흥망성쇠… 또르륵……’ 뭐 이런 느낌. <위대한 개츠비>를 위대하다고 여기는 독자로서 매우 즐겁게 읽었다. 앞부분보다 뒷부분의 호흡이 훨씬 빠르다. 혹 이 책을 읽다가 아이 지루해, 하고 집어던지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1부만 참고 보길 바란다. 2부와 3부는 정말 속도감 있다. 난 1부도 재미있게 읽었다.
3. 소설을 계속 쓰다보니 결국엔 글 쓰는 사람의 눈으로 책을 읽게 되는데, 이거 정말이지 내가 생각하는 ‘소설가의 윤리’와 완전히 합일하는 멋진 소설이다. 내가 쓰는 단편을 읽는 독자들은 언제나 다양한 반응을 내놓지만(똑같은 소설에 대해 ‘재미없다’와 ‘엉엉 울었다’가 교차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놀랍고 즐겁다) 그 중 딱 하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장점은 ‘생생하다. 생동감 있다’라는 것이다. 당연하다. 아는 것에 대해 쓰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을 위키피디아나 찾아본 후 에둘러 대충 말하는 것은 정말 싫다. 그러다보니 매일 내 삶, 내 생활, 아는 사람, 우리 동네, 다녔던 여행지들 같은 것들을 돌이켜본 후 적절한 재료를 골라 썰고 다지고 섞고 양념해 볶는다. 그리고 그게 공감이란 것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들 사는 건 비슷하지 않나. 예전에 교사가 졸업생 주민번호까지 적힌 자료를 기자를 사칭한 남녀에게 미심쩍어하면서도 건네는 장면이 들어간 장편소설을 읽은 적이 있었다. 소리내어 욕했다.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데. 작가가 게으르기 짝이 없다. 복싱 기술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쓴 소설도 읽은 적이 있다. 쌓아온 감상이 와르르 무너졌다. 누가 내 글을 읽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보고, 가장 좋은 길은 물론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일 테고, 어쨌든 그렇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래서 실제로 공장이나 축산농장 같은 곳에서 일한 후 책을 쓴 작가 한승태 씨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의 묘사는 정말 완벽하다. 아마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들을 모델로 썼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작가가 머릿속에서 그 저택을 지반부터 다져 기둥을 세우고 벽을 바른 후 가구를 들여놓아 완성시킨 후에야 썼을 것이다. 나는 그런 작가를 좋아한다. 그런 자세를 좋아한다. 그것이 소설가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라고 생각한다.
멋진 소설이다.
특히 속지. 정말이지 아름답다. 육성으로 헉- 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