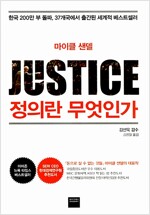
졸업 전에 교양으로 법대 수업 하나를 들었다. 법학은 레고 같았다. 촘촘한 논리가 빈틈없이 맞물려 사람을 안심시킨다. 교수는 뭔가의 제6조쯤을 읽으면서 ‘도’ 위에 점을 찍으라고 했다. 조사로 쓰이는 도였다. 너도, 나도, 우리도, 할 때 그 도. 그 조항의 ‘도’를 해석하기 위해 서너 개의 학설이 동원되었다. 현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도적인 학설을 골라 공히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단 한 글자도 허투루 쓰이지 않은 철학적 사유의 덩어리가 법전이다. 현실의 세계를 우리가 믿는 도덕성의 기준 아래 기능하게 하는 합의된 규칙, 사회라 불리는 경계 없는 집단이 무의식중에라도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견고한 것. 내 인생의 상당부분을 조율하는 그것이 아무렇게나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면서 나는 약간은 인간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자가 승계되려면 아무튼 이러한 조건에 덧붙여 수인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교수가 칠판에 콩 마커를 두드리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하자의 승계를 부정함으로써 원고가 입는 피해가 수인 가능한지가 중요한 기준이란 거예요.”
접힌 부분 펼치기 ▼
나랏일도 하다보면 하자가 있을 수 있다. 두 개의 나랏일이 있을 때, 각각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각각을 따로 다퉈야 한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나랏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먼젓번 행위에는 하자가 있지만 뒤의 행위는 멀쩡한 경우가 있다. 먼젓번 행위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서 뒤의 행위만 다툴 수 있을 때, 과연 뒤의 행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먼젓번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뒤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하자의 승계’ 이론의 핵심이다. 연이어 일어나는 행위라고 해도 서로 목적이 다르거나 해서 관련 없다고 판단되면 먼저 일어난 행위의 하자가 뒤의 행위에 대물림되지 않음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에 덧붙여) 이러한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어떤 개인에게 참아 넘기기 어려울 만큼 분한 것이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여 전혀 하자 없는 뒤의 행위를 다투면서도 앞의 행위의 하자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펼친 부분 접기 ▲
나는 수인가능성이라는 한자말에 매료되었다. ‘참을 만한가?’를 멋지게 말하면 수인가능성이로구나. 어쩐지 일제의 냄새가 짙은 이 단어는 마치 최근 ‘아가씨’나 ‘밀정’을 볼 때 느꼈던 것 같은 과거의 이질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럼 선생님, 수인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마침 맨 앞줄에 앉아있기도 했고, 수인가능성이라는 단어를 꼭 한 번 내 입으로 말해보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질문을 꺼내놓았을 때, 교수는 귀신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교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 수인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통해 판단하는데, 성문법이 아니라 판례를 가지고 참을 만한지 아닌지 구별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마치 법을 만들다 만 것 같은 찜찜함이 느껴질는지 몰라도, 내가 지금 눈앞의 이 피해를 견딜 수 있을지의 여부를 나를 알지도 못하는 입법자가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오히려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처럼 해진 데 기운 것 같은 논리야말로 정답에 가깝다.
교수는 잠시 나를 쳐다보고서 수인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던 몇 가지 판례를 알려주었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나는 실제로 조금 울었는데, 법학이 그처럼 촉촉하다는 것이 무척 안심되어서 그랬던 것 같다.
나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과학에 매몰되어 있었다. 나의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수와 체계로 정리할 수 있다. 디지털 같은 사고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다 보면 인간성을 대하는 마음이 빠싹 마른다. 그리고 가끔씩 나의 학문과 다른 성질의 것들을 만날 때나 되어야 약간의 수분이 옮아오는 것이다.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무척 어렵고, 얕은 공부로 으스대며 답을 내놓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물음이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문제들을 다룰 때 가장 인간적인 방향으로 답을 내려줄 공식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아직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아마도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누구나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회가 올지도 모르겠다.
법전에는 의외로 한글이 많다. 옛날에는 전부 한자였지만, 많이 쓰이는 법을 중심으로 점차 한글로 표시하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더 많은 사람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다.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동의를 받고자 손을 내미는 것 같은 모양새다. 법이 가는 방향은 때로 좀 삐뚤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현실에 마땅한 추세를 따른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法 이란 물이 가는 길일 것이라고, 물이 마땅히 가야할 길을 따라 가리라고,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해보고서,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칠 적마다 멀리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