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도 나는 당신이 달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달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고백하자면, 여행 에세이도... 변종모 작가의 책도 모두 처음이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이 달다>는 제목을 보고 이 책의 정체를 간파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일이란, 나에게 낯선 곳을 여행하는 일과 비슷한 일이었다. 이 책은 음식이 등장하는 여행 에세이다. '음식 여행이 아니다. 여행 음식도 아니다. 나를 오래도록 지탱해준 음식들의 이야기이며, 음식이 가져다준 먼 곳의 당신 이야기다"라는 작가의 말을 빌린다면, 음식과 여행 속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다.
책 곳곳에는 '고소한' 냄새가 풍긴다.
가난한 감자볶음을 해주던 그녀를 만났던 파키스탄과 이집트, '목욕물을 끓이듯 커다란 냄비에 물을 받아' 피곤한 마음으로 만들었던 알리오 올리오, 찰랑거리는 위로를 받았던 겐지스 강 할아버지가 끓이던 짜이 한 잔... 책 곳곳에는 여행길에서 만난 고소한 음식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변종모 작가는 그 기억을 더듬어 삶의 경건함을 기억하고, 인연을 만들어 내는 삶의 우연을 기대한다.
삶이란 문득 이렇게 경건한 것이다. 버릇처럼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기꺼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때로 외롭고 지루하거나 힘든 모든 것들은 스스로 이겨낸 뜨거운 마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내가 만난 한 가닥 한 가닥의 아름다운 마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걷는 일이 가까운 미래에 큰 포만감을 줄 것이다. (99쪽)
책을 읽다가 문득, 내가 여행길에서 만났던 음식들을 떠올려보았다. 고소하고, 달큰하고, 쌉싸름했던 음식 냄새와 동시에 그때 그 풍경, 사람, 대화들이 함께 떠올랐다. 이 책을 읽으며 여행이란, 허기진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는 풍성한 식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살아야 하는 일들, 먹어야 하는 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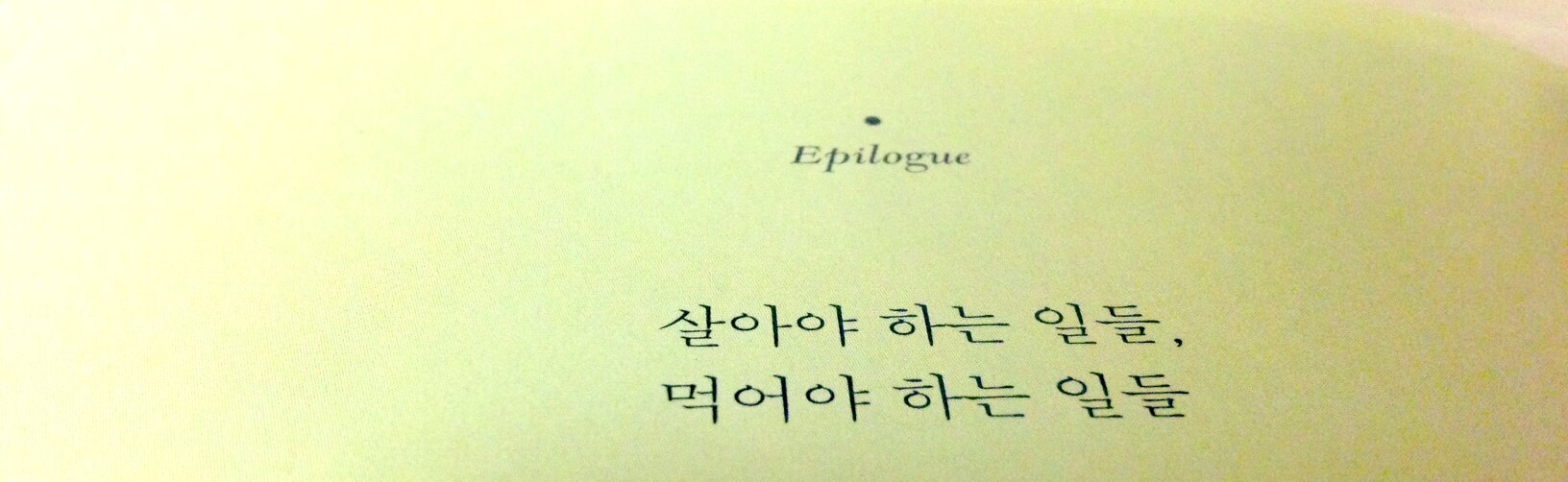
엄마가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셨다. 여행길에서 만난 쑥을 잔뜩 캐오신 엄마는 여행에서 생긴 일들을 푸짐하게 풀어놓았고, 나는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가만가만 들어주었다. 엄마는 짐을 풀어놓자마자 쑥을 삶고, 저녁 매운탕을 끓이기 위해 생선을 다듬고, 김치를 썰기 시작했다. 여행이 다시 일상이 되고, 일상은 마치 또다른 여행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빈 그릇은 다시, 풍성하게 '몸에 피가 돌 듯' 채워졌다.
돌아왔다는 것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끼의 신성한 밥과 그것의 힘으로 나는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이다. 내가 멀리서 정처 없는 마음이 되어 걷고 있는 동안 저 아래 불빛 가득한 곳의 사람들 역시 그러했으므로, 세상은 불공평할 리 없는 것이라는 진리만 가진다면, 나는 얼마든지 맛있는 날들을 기대하며 이곳을 걸어야 할 것이다. 먼 곳에서의 날들. 그 속에서 허기진 마음들이 돌아온 이 자리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으리라 믿어서가 아니라, 내 앞의 날들을 스스로 요리하며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리리라 생각했으므로. 그랬으므로 나는 또 맛있는 계획을 한다. 먹어야 할 날들을 위해. 지나온 길 위에서의 그리운 음식들을 디하며, 밥보다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숟가락 건네며 살갑게 한 상에 앉으리라. (에필로그)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