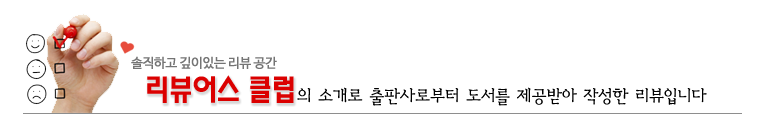-

-
복지인 - 여기는 복지과 보호계
센자키 소이치 지음, 이수영 옮김 / 출판미디어 율 / 2018년 8월
평점 :

절판



책을 펼치기 전, 책 소개에 적혀있던 '신입 공무원의 성장기'라는 문구를 보고
복지과에 일하는 순박한 청년의 성장스토리라고 생각했다.
책 제목에도 적혀있는 복지란 단어에 따스함이 머물 거라고 생각했고,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책 표지에 그림도 간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덤이다.
나는 그렇게 책의 무게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펼쳤다.
책을 펼쳐서 몇 장을 읽은 다음에 나는 오른손에 잡혀있던 읽어야 할 페이지를 왼손으로 빠르게 넘겨봤다.
읽었던 몇 장에는 따스함보다 더러움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으니 따스함이 머물 거라는 생각은 와장창 깨졌고,
혹시나 해서 왼손으로 촤르륵 소리를 내며 넘겼던 페이지에는 그림이라곤 없었다. 나의 오산이었다.
책에 나왔듯이 멀쩡한 허울을 보고 눈을 가린 꼴이 돼버린 게다.
책에서 나온 복지과 보호계의 복지란,
사회의 밑바닥에서도 탈락하려는 이들을 정상이라고 불리는 궤도에 가까스로 이끌어주는 손이었다.
그 손을 이 책에서는, 일본에서는 '생활보호'라고 부르는 듯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뜻을 같이 할지도.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면 배정된 담당자에 따라 관리되는 케이스가 되고,
생활보호를 받으려 한다면 법적으로 기재된 보호자가 없는지,
보호자가 있다면 부양의 의무를 지겠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답변에 따라 생활보호를 받는다.
이 책에서는 모든 상황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 모든 상황에 주인공은 감정이입하며 휘말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책 속의 글을 읽는 건 쉬웠다. 그래서 그런지 제3자의 눈으로 보는 이야기인데도, 주인공의 생각과 마음에 동화되버리고 말았다.
생활보호를 받는 노인의 꽁꽁 꿍쳐둔 더러움에 같이 눈과 코를 찡그리며 인상을 찌푸렸고,
며칠 전까지 얘기했던 노인의 갑작스러운 병마 그리고 보호자의 버림에 주인공과 같이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다.
나쁜 상황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생활보호의 시작과 끝은 모두 외로움이었기에 책을 덮고 자리에 누울 때면
나도 주인공과 같이 일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처럼 쓸쓸하고 허무함이 몰려왔다.
책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속에 담긴 생각은 무거웠던 일본소설 '복지인:여기는 복지과 보호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