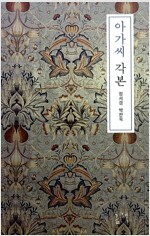
"여지껏 내 손으로 씻기고 입힌 것 중에 이만큼 이쁜 것이 있었나."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마코, 나의 숙희."
남자 없는 세계에서 끝없이 완벽하게 부드러울 수 있는 여자들의 사랑 이야기.
엄마 없는 두 소녀가 서로에게 엄마가 되어주기로 결심하는 이야기.
약속은 자주 약속으로만 남아 허망하지만
결심은 더 단단하고 든든하고... 그래서 좀 더 안심이 된달까.
두 사람이 아무 약속도 하지 않고, 그저 결심 어린 눈빛만을 보여주어서, 나는 그게 좋았다.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는 이야기들.
여동생을 낳으러 집을 떠났지만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아이가 누렇게 말라가도 돌볼 수 없는 더럽고 냄새나는 미친 어머니,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는 마술을 부리는 서커스단의 어머니, 때때로 사라져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행을 떠나는 마법사 어머니, 푸른 양철 가방을 들고 여행을 떠나 먼 나라에서 죽어 연기가 된 어머니의 어머니.....
소녀들은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 여행하고 그 어머니들처럼 사라진다.
삶과 죽음처럼 끝없이 되풀이되는 운명의 반복.
반복은 지겨움이나 절망일 수도.
혹은 재주 있는 자라면 리듬과 음악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 엄마 없는 자들이 조금 덜 슬펐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