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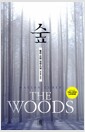
-
숲 ㅣ 모중석 스릴러 클럽 33
할런 코벤 지음, 최필원 옮김 / 비채 / 2012년 10월
평점 :



영미 추리소설은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재미없게 읽은 작품이 전부 영미쪽이었기 때문이다. 웬만해서는 책을 도중에 놓지 않는데 영미 추리소설 몇 권은 그렇게 내 애정(?)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영미쪽 추리소설은 내 리스트에서 사라져갔다.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빡빡이 작가 할런 코벤의 <숲>을 펼쳤다. 두꺼운 두께에 기분이 좀 상했지만, 초반부터 흥미를 확 잡아끌었다. '오~이 작가 독자 다룰 줄 아는데?' 536페이지의 종이값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용은 훌륭했다. 썰렁한 유머가 가끔 물음표를 자아냈지만 그래도 봐줄만 했다. 플롯과 사건 진행, 마지막까지 무엇 하나 나무랄 수 없을 정도로 재밌었다. 어떤 책이든 재미만 있으면 다 용서가 되는 것이다. (작가의 험한 빡빡이 얼굴조차.ㅎㅎㅎ)
숲속 한 캠프장.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이 여름을 맞이해 캠프장에 모였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순했다. 놀이와 연애, 그리고 뜨거운 밤을 위해서였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드넓은 캠프장은 그저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깜깜한 밤에 하나둘씩 숙소를 이탈해 숲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숲으로 들어간 청소년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몇몇은 살해된 채 발견됐고 다른 몇몇은 실종됐다. 실종된 이들은 죽어서 어딘가 뭍여 있는 건지 아니면 살아 있는 건지 모른 채 사건은 마무리됐다. 캠프장은 폐쇄됐으며 죽거나 실종된 청소년의 부모들은 캠프장에서 지급된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 비극적인 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20년이 지난 뒤 실종된 여동생을 찾던 오빠(검사)는 우연히 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 죽은 채 발견된 신원미상의 남자에게서 검사와 관계된 물건이 나온 것이다. 조사를 받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20년 전 자신의 동생과 함께 실종된 남자였던 A가 바로 그 죽은 남자이었기 때문이다. 20년 전이지만 분명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동생도 살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과연 그 여동생은 살아 있을까?
역시 넓은 땅덩이를 가진 미국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일본처럼 좁디 좁은 밀실에서 벌어지는 추리 사건이 아닌 넓고 까마득한 숲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배경이니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용의자를 비롯해 '왜'라는 의문을 끝까지 숨기고 들어간다.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꽁꽁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팍~! 하고 말해준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 차리고 읽지 않으면 감조차 잡을 수 없다. 단서는 여러 곳에 있긴 하지만 감히 때려 맞출 수 없다. 추리, 플롯, 전개, 반전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쓴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단했다.
적어도 <숲>은 읽는 내내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더군다가 무척 재밌다. 자신있게 추천하는 두꺼운 장르소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