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 - 묵묵하고 먹먹한 우리 삶의 노선도
허혁 지음 / 수오서재 / 2018년 5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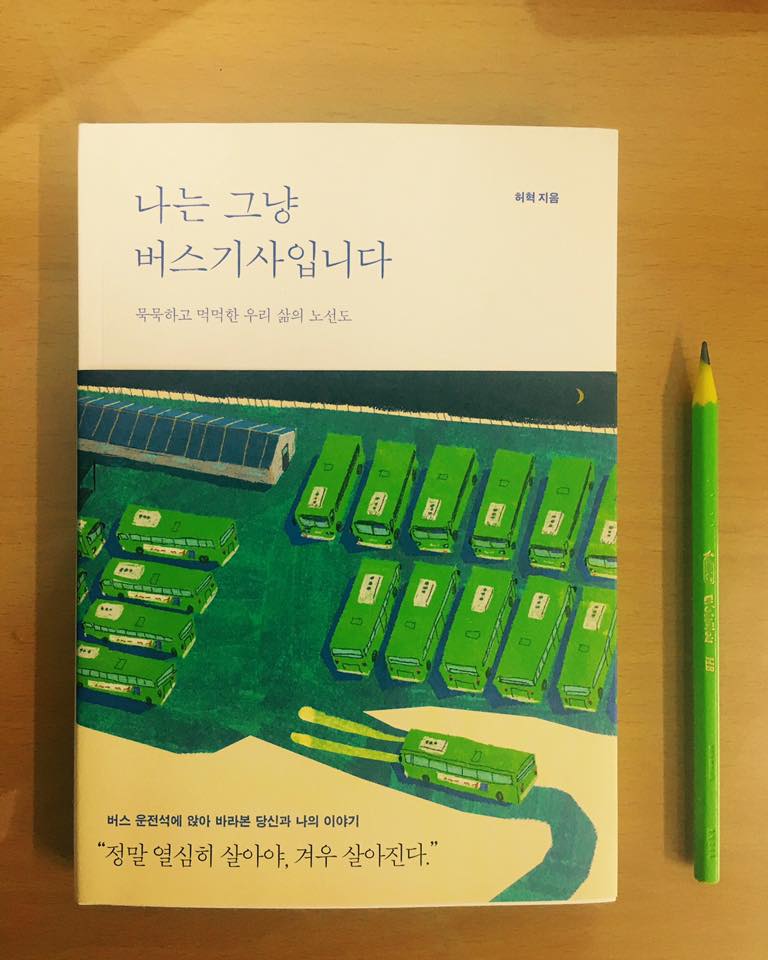
영화 <패터슨>에서는 버스 기사 패터슨이 아름다운 시를 매일 썼다. 운전이 그의 삶이였고 시였던 영화였다. 전주의 어떤 버스기사는 왜 또 이렇게 글을 잘 써서 많은 작가들을 깨갱하게 만드는 걸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지를 치켜세워서 두 말 할 것 없이 사서 단숨에 읽었다. 낄낄 웃다가 양손으로 눈물을 훔치다가 했다.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간만에 이런 책을 읽었다. 너무 냄새가 짙고 고소해서 그 음식을 안 먹어도 먹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책. 바로 그런 책이었다. 허혁의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
15년 넘게 시내버스를 애용하는 뚜벅이로서 재미있는 부분이 무척 많았다. 같은 노선 버스 기사님들이 맞은편 차선에서 서로 마주치면 손인사를 꼭 하는 걸 ...알고는 그 이후로는 꼭 그걸 챙겨봤었다. 이 책도 그 부분이 빠지지 않고 나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엄청 귀여웠던 부분이라 옮겨 적어본다.
“형님은 되도록 반듯하고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하고 동생이 지나가면 운전대에서 두 손 다 떼고 머리에 하트, 승격 눈치가 보이면 가슴에 하트, 엄청 살갑게 ‘빠이빠이’, ‘엄지척’ 등이다.”
나이 많은 어르신 승객들이랑 대화 하는 부분도 웃음을 참기 어려웠다.
“영감님, 근디 언제 봤다고 계속 반말이에요?”
“열 받으니까 그렇지!”
“열 받는 건 영감님 사정이고 시내버스기사한테는 막 반말해도 되는거요?”
“뭐여, 너는 왜 말이 짧아지는디!”
“너-어? 이 양반이 시방! 아저씨, 나도 내일모레면 환갑요!”
대형버스 안에서 신나는 트로트를 틀어놓고 한바탕 정신줄 놓고 흔드는 걸 유일한 낙으로 아는 노인들을 위해 저자는 이렇게 했다고 한다. 마지막 줄이 너무 멋져서 캬! 하고 소리칠 수 밖에 없었다.
“사실은 처음부터 신바람 이박사를 틀면 안 되었다. 형님들 말인즉 한트랙 다 돌면 노래를 바꿔줘야 한다. 이박사를 듣고 나면 다른 노래는 시시해서 흥이 죽고 이내 승객의 원망이 쏟아진다. (...) 그러나 거리도 얼마 안 되고 시골 마을 하객들에게 바랄 것은 없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자 마음먹었다. 그렇게 살겠다고 장사를 접었던 것 아닌가!”
우리나라 도로 사정을 생각하며 같이 한숨 지었던 부분도 있었다.
“산다는 건 리듬을 타는 일이다. 그 리듬으로 한 사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고 본다. 저상버스가 휠체어 탄 승객을 싣기 위해 리프트를 펴는 잠시 동안에서 ‘빵빵’ 거리며 도로가 난리가 난다. 빨리 가봐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쓰다보니 맥이 빠진다. 이 뚝배기 장맛 같은 책을 내가 토막내서 소개해 봐야 다 무슨 소용이냔 말이다. 통으로 다 읽어야 제 맛인데! 한 꼭지도 빠짐없이 다 읽었으면 좋겠단 말이다.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질투를 했다. 저렇게 온 몸으로 살지 않는 이상 온 몸으로 덤벼서 글을 쓸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글이 막힐 때, 삶이 콱 막힐 때 곁에 두고두고 한 편씩 꺼내 읽을 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