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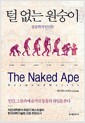
-
털없는 원숭이 - 동물학적 인간론
데즈먼드 모리스 지음, 김석희 옮김 / 문예춘추(네모북) / 2011년 7월
평점 :

품절

언젠가부터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희대의 뜬구름 잡기가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인간중심적인.. 너무나 인간중심적인. 인간의 보잘것 없는 시각에서 이데올로기를 전쟁을 평화를 권력을 그리고 종교를 '재단'한다. 또 그게 진리라며 다툰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한다. 만약 초고도 문명의 외계인이 지구 가까운 곳에 전망대를 세워놓고 인간들을 관찰하고 있다면.. 그들은 어떠한 조사보고서를 쓸까? 인간이 밀림에서 위장막을 덮어쓴채 동물을 탐색하듯. 그들의 탐사보고서는 바로 <털없는 원숭이>의 내용과 닮아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지금에서야 읽었다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또 행운이기도 하다. 너무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우리 인간이란 털없는 원숭이의 일거수 일투족이 동물적 습속의 결과물일 뿐인지 반성케 하는.
다른 동물과 확연히 다른 유아독존 인간들의 찬란한 문명? 그렇게 고상한 인간들은 여전히 서로 대규모 살육을 하고 이젠 스스로 멸족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상한 인간들이. 차라리 동물들의 전쟁이 보다 순수하다. 그들의 전쟁은 죽음이 아니라 경쟁자의 도망침, 기껏해야 복종이다.
그러나 인간의 전쟁은 상대의 전면적 죽음이다. 최신무기는 상대 경쟁자가 도망하거나, 복종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할 기회를 박탈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털없는 원숭이들의 전쟁을 그 어떤 동물들의 그것보다 위험하게 만들었다.
반대로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고상한 이념들은 또 무엇이던가? 영장류들이 최초 숲속에서 나와 들판에서 다른 육식동물들과 경쟁에 내몰렸을때 더 이상 그들은 숲속에서 처럼 일인지배하의 강력한 위계체제를 지탱할 수 없었다. 다른 육식동물과 먹이 경쟁을 하려면 상호간 협동이 필요했던 것. 위계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낮은 위계에 있는 구성원들의 일정한 밥그릇도 약속해 줘야 했던 것. 우리가 거품무는 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기원은 그러한 생물학적 이유가 아니었을까.
'좋은' 지식은 성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성찰이란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관찰자 입장에서 반성해 보는 것일게다. 현재의 너무나 인간중심적 사회과학은 결코 성찰적일 수가 없다. 거들먹 거리는 사회학 연구자들은 필히 자연과학을 수용해야 한다. 물리학에서, 생물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