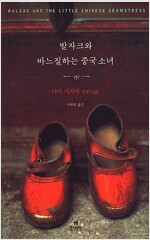
나는 발자크를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아마도 발자크는 서양사람일 것이다.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소녀, 둘 사이의 느껴지는 오묘한 이질감에 이끌려 이 책의 첫 장을 넘기게 되었다.
'오노레 드 발자크'는 프랑스의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이다. 발자크가 작중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발자크는 분명 소설의 전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때는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절. 부모가 지식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와 친구 뤄는 오지의 농촌마을로 하방(下方)하게된다. '나'와 뤄는 사실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했지만, 지식인 취급을 받으면서 농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무의미한 날들이 계속되던 중, '나'와 뤄는 마을을 돌며 재봉일을 해주던 재봉사의 딸 '바느질 소녀'와 알게되고, 무미건조한 날들은 조금씩 활기를 띄게 된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에 재미가 들린 '나'와 뤄는 우연히 옆 마을에 하방온 '안경잡이'의 자물쇠가 잠긴 비밀 가방을 발견하게 되고, '안경잡이'의 부모님이 문학인인 것으로 보아 그 가방 속에는 책이 들어있을 거라 유추하게 된다. '나'와 뤄는 '안경잡이'에게 책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안경잡이는 책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는 안경잡이의 부탁을 들어준 다음에야 겨우 책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나'와 뤄는 발자크의 소설을 읽게 되고, 발자크의 소설은 나와 뤄를 가슴띄게 만들었다. 우리는 '바느질 소녀'에게도 발자크의 소설과 문학을 알려주었고, 얼굴이 아름다웠지만 시골뜨기였던 그녀는 발자크의 소설을 통해 점점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발자크의 소설을 시작으로, 문학을 접하게 된 아이들은 점점 변하게 된다. '마오' 주석과 공산당 이외에는 모든 것이 금지되었던 그 시절, 문학이라는 매체가 가져다주는 파급력은 상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본디 인간은 금지된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법이다. 어두운 밤 남몰래 발자크의 소설을 탐독하던 '나'와 뤄에게 문학 작품이란 아담과 이브가 탐하던 에덴동산의 선악과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이다. 문학이라는 선악과는 이들의 무지를 일깨워주는 '계몽'이었던 것이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광기 속에서 발자크의 소설은 '나'와 뤄에게 농촌으로 추방된 삶을 견디는 힘이 되었고, '바느질 소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꿈 꾸게 하는 희망이 되었던 것이다.
이 책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밑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청춘들의 성장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비록 '나'와 뤄. 그리고 '바느질 소녀'의 뒷 이야기가 전해지지는 않지만, 문학의 즐거움에 눈을 뜬 그들은 광기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을 살았기를 소원해본다.
▶ 더 많은 리뷰 보기
모차르트는 언제나 마오 주석을 생각한다
"소나타가 무엇이냐?"
촌장이 의하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나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노래라는 것이냐?"
"대충 비슷한 겁니다."
나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러자 즉각 촌장의 눈빛에 충직한 공산당원다운 경계심이 나타나면서 어조가 적대적으로 변했다.
"네가 연주할 노래의 제목은 무엇이냐?"
"노래와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 소나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제목을 물었다!"
촌장이 내 눈을 쏘아보면서 고함쳤다.
또다시 그의 왼쪽 눈에 맺힌 핏멍울 세 개가 내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모차르트......"
나는 망설였다.
"모차르트 뭐라는 거냐?"
"모차르트는 언제나 마오 주석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뤄가 나를 대신해서 마무리를 해주었다.
얼마나 대담한 말인가! 하지만 그 대담함이 효력을 발휘했다. 마치 무슨 기적적인 얘기라도 들언 듯이 위협적이던 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기쁨의 미소를 짓느라 눈가에 주름까지 생겼다.
"모차르트는 언제나 마오 주석을 생각한다고?"
촌장이 되뇌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활을 쳐드는 순간 갑자기 주위에서 터져나오는 열렬한 박수소리에 나는 덜컥 겁이 났다. 곱은 손가락들로 현을 훑어가자, 모차르트의 악절들이 충실한 친구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모차르트의 명쾌한 음악에 영향을 받은 것인가, 흡사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기라도 하듯 좀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매정해 보이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시시각각 부드러워졌다. 이윽고 흔들거리는 남포 불빛 속에서 그 얼굴들의 윤곽이 차츰 흐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