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0호
움베르토 에코 지음, 이세욱 옮김 / 열린책들 / 2018년 10월
평점 :



제 0호(Numero Zero) 서평
-이 시대 최고의 지성 움베르토 에코의 마지막 소설

이 책은 이탈리아 소설로 움베르트 에코의 마지막 소설이라는 점에 더 기대가 되었던 책이다.
언론과 권력에 대한 풍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설인만큼 이 책의 내용들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 책은 1992년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으로 현재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 시기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책의 주인공은 콜론나라는 인물로 지방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살아온 중년의 남자이다. 그런 그에게 시메이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신문을 창간하는 과정을 글로 써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돈을 제시하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 책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한 기자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었다.
이 책의 흥미로운 요소는 절대 출간되지 않을 신문인 ‘제 0호’라는 신문의 존재이다. 출간되지 않을 신문을 만들려고 6명이나 되는 기자들을 고용했다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고, 뭔가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기사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려고 한다는 설정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더 재미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제 0호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제 0호라는 신문이 시작부터 이상했지만 그 내용도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간, 앞일을 상상하고, 일련의 예측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려고 한다. 대체 누가 기자이고, 누가 이 신문을 보게 되는 것인지 읽으면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진 것이다. 언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사가 조작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책이었다. 그래서 사실만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글을 받아들일 때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생각해보았다.

(6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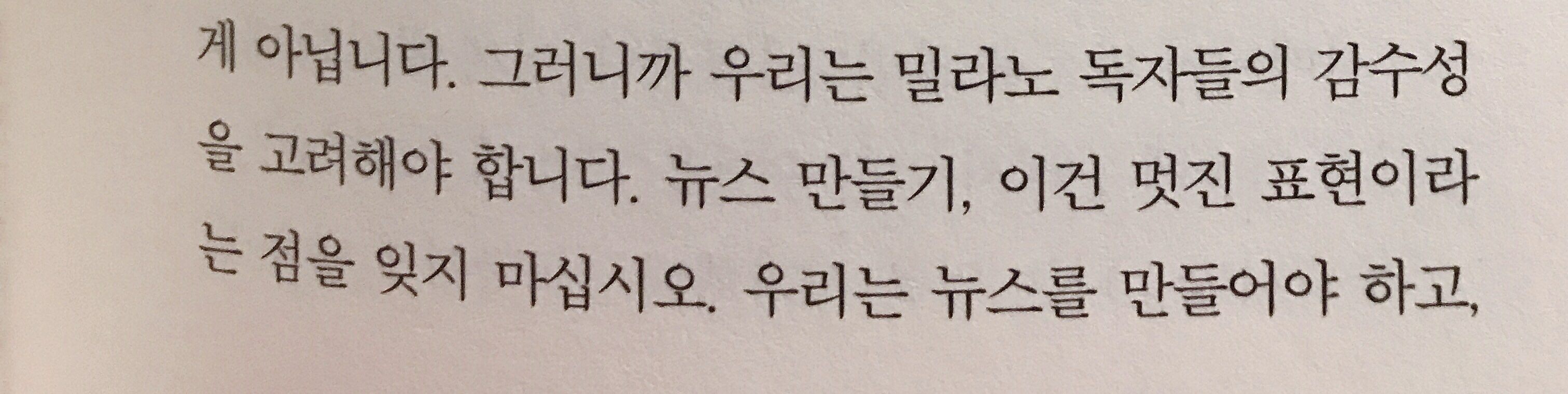
(87p)

(261p)
이렇게 내용들은 진지하게 이어지지만 가끔 이들이 서로 논쟁하는 장면들이 웃기기도 했고,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풍자라는 작가의 목표가 잘 느껴졌던 책이었다. 그리고 책의 진행 중에 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 것일까, 아니면 조작인 것일까 의심해보게 되고, 같이 추리해보게 되는 내용들이 이 책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현실적인 마무리였다. 움베르트 에코의 마지막 소설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저널리즘, 언론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책이다.